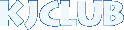мқёмғқм—җм„ң мӮ¬лһҢл“ӨмқҖ л§ҺмқҖ кҙҖкі„лҘј л§әкі , мң м§Җн•ҳкі , лҳҗ к№Ёл©ҙм„ңл“Ө мӮҙм•„к°„лӢӨ.
кҙҖкі„лқјкі н‘ңнҳ„лҗҳлҠ” мқҙ лӢЁм–ҙмқҳ мӮ°мҲ м Ғ мқҳлҜёлӮҳ н•ң лІҲ н’Җм–ҙ ліјк№ҢлӮҳ...
мқёк°„мқҖ м–ҙм°Ён”ј мӮ¬нҡҢм Ғ лҸҷл¬јмқҙлӢҲл§ҢнҒј нҳјмһҗм„ м ҲлҢҖлЎң мӮҙм•„ к°Ҳ мҲҳк°Җ м—ҶлӢӨ.
нҳјмһҗм„ңлҸ„ мӮҙм•„к°Ҳ мҲҳ мһҲлӢӨл©ҙ мқёк°„мқҖ мўҖ лҚ” мһҗмң лЎңмҡё мҲҳлҸ„ мһҲкІ м§Җл§Ң...
лӮҙк°Җ мўӢм•„н•ҳлҠ” нҢқмҶЎ мӨ‘ нӮ№ нҒ¬лҰјмҠЁмқҳ м—җн”јнғҖн”„(Epitaph)лқјлҠ” л…ёлһҳк°Җ мһҲлӢӨ.
лҹ°лӢқнғҖмһ„мқҙ н•ңм°ё кёҙ л…ёлһҳ мӨ‘ н•ңкіЎмқё мқҙл…ёлһҳлҘј лӮң мҲңм „нһҲ м”№мңјл©ҙ м”№мқ„мҲҳлЎқ л§ӣмқҙ лӮҳлҠ” к°ҖмӮ¬ л•Ңл¬ём—җ мўӢм•„ н•ңлӢӨ.
нӣ„л ҙл¶Җмқҳ Confusions will be my epitaph—-лқјлҠ” к·Җм Ҳмқҳ н•ҙм„қмқ„ мң„н•ҳм—¬ л©°м№ л°Өмқ„ м§ҖмғҲмӣ лҚҳ кё°м–өмқҙ мғҲлЎӯлӢӨ.
нҢқмҶЎмӨ‘м—” мқҳмҷёлЎң к°ҖмӮ¬лҘј мқҢлҜён•ҙ ліј к°Җм№ҳм„ұмқҙ мһҲлҠ” л…ёлһҳл“Өмқҙ л§ҺлӢӨ.
Stairways to Heaven к°ҷмқҖ л…ёлһҳлҸ„ м •л§җ лӘ…мӢң мӨ‘мқҳ лӘ…мӢңлӢӨ.
н—ү!
м–ҳкё°к°Җ м—үлҡұн•ң кіімңјлЎң к°”кө°...
лӢӨмӢң лҸҢм•„мҷҖм„ң—-
мҡ°лҰ¬к°Җ ліҙнҶө к°җм •мқҙ лЁёлҰ¬ лҒқк№Ңм§Җ мҳ¬лһҗмқ„ л•Ң н‘ңнҳ„ н•ҳлҠ” л§җ...
"л„Ҳ л°ҳ мЈҪмқ„ мӨ„ м•Ңм•„—-"
л°ҳ мЈҪмңјл©ҙ к·ёлҹј л°ҳмқҖ мӮҙм•„ мһҲлҠ” кІҢ лҗңлӢӨ.
еҚҠмқ„ мҲҳн•ҷм ҒмңјлЎң н‘ңкё°н•ҳл©ҙ 1/2
к·ёлҹј л°ҳ мЈҪмқҢ = л°ҳ мғқ(мӮ¶) мҰү 1/2 мЈҪмқҢ = 1/2 мӮ¶ мқҙ лҗңлӢӨ...
м–‘ліҖм—җ 2лҘј кіұн•ҳл©ҙ мЈҪмқҢ = мӮ¶мқҙ лҗҳ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 кіөмӢқмқҙ л°”лЎң Epitaphк°Җ м Ҳк·ңн•ҳл“Ҝ мЈјмһҘн•ҳлҠ” мқёмғқмқҳ л…јлҰ¬лӢӨ.
лӮң м–ҙлҰҙ л•Ң(кі л”© л•Ң мғқк°Ғ) лӘЁл“ кҙҖкі„м—җм„ң л°ҳ мқҙмғҒ лӮЁлҠ” мһҘмӮ¬лҘј н•ҳл Өкі мғқк°Ғ н–Ҳм—ҲлӢӨ.
м№ңкө¬мҷҖмқҳ көҗмҡ° кҙҖкі„м—җм„ңлҸ„ к·ёл Үкө¬—-
м•„лІ„лӢҳмқҙ м§Җл°©көӯм„ёмІӯ кі мң„ кіөл¬ҙмӣҗ м¶ңмӢ мқҳ м„ёл¬ҙмӮ¬мқҙм…ЁлҚҳ к№ҢлӢӯм—җ лӮң лі„лЎң м–ҙл Өмҡҙ мғқнҷңмқ„ н•ҙ ліё кё°м–өмқҙ м—ҶлӢӨ.
л¶ҖлӘЁлӢҳ лӘЁл‘җ мқјліём—җм„ң кіөл¶Җ н•ҳмӢ нғ“мқём§Җ мғҒлӢ№нһҲ к°ңл°©м Ғмқҙкі мһҗмң лЎңмҡҙ 분мң„кё° мҶҚм—җм„ң м„ұмһҘ н–ҲлҚҳ кІғ к°ҷлӢӨ.
м•„лІ„лӢҳмқҳ мҲҳлҰ¬кҙҖл…җ лҚ•л¶„м—җ м•„м§ҒлҸ„ лӮң мҲ«мһҗмҷҖ м”ЁлҰ„н•ҳл©° мӮҙкі мһҲм§Җл§Ң н•ң лІҲлҸ„ лӮҙк°Җ нғқн•ң мқҙ кёёмқ„ лҗҳлҸҢм•„ ліҙкі нӣ„нҡҢн•ң м ҒмқҖ м—ҶлӢӨ.
мҪ”нқҳлҰ¬к°ң мӢңм Ҳл¶Җн„° кіөм§ңк°Җ м—ҶлӢӨлҠ” 진мӢӨмқ„ к№Ёмҡ°міҗ мЈјмӢ м•„лІ„лӢҳмқ„ лӮң мӢӨм ңлЎң мЎҙкІҪн•ңлӢӨ...
л§җ н• мҲҳ м—ҶлҠ” н•ң к°Җм§Җ мӮ¬мӢӨмқ„ л№јкіӨ—-
к·ёлһҳм„ң лӮң м–ҙлҰҙ л•ҢлҸ„ лӘЁл“ кҙҖкі„лҘј мҲ«мһҗлЎң н’ҖкіӨ н–ҲлӢӨ.
м Җ м№ңкө¬лҠ” лӘҮ м җмқјк№Ң?
м Җ м№ңкө¬лҠ” лӘҮ % м •лҸ„мқҳ мҷ„лІҪм„ұмқ„ к°–м¶”кі мһҲмқ„к№Ң?
м Җ 집мқҖ м–јл§Ҳмқјк№Ң? л“ұ л“ұ лӘЁл“ кІҢ мҲ«мһҗмҷҖ кҙҖл Ёмқҙ мһҲм—ҲлӢӨ.
лӢӨмӢңл§җн•ҙ мӮ¬лһҢм—җкІҢ мҲ«мһҗлҘј л¶ҷмқҙлҠ” мқјл Ёмқҳ мһ‘м—…мқ„ нҶөн•ҙ лӮң мқёк°„ кҙҖкі„лҘј л§Ңл“Өм–ҙ лӮҳк°”лҚҳ кІғмқҙлӢӨ.
к·ёлҰ¬кі мӢ¬м·Ён•ҙм„ң мқҪм—ҲлҚҳ л°ұкҙ‘м¶ңнҢҗмӮ¬лһҖ нҡҢмӮ¬м—җм„ң м¶ңк°„н•ң “нғңк·№кё°”лқјлҠ” мұ…мқ„ ліҙкі лҸҷм–‘мІ н•ҷкіј м„ңм–‘мқҳ кіјн•ҷмқҙ м ‘лӘ©лҗҳлҠ” м•јлҰҮн•ң мІҙн—ҳмқ„ н•ҳмҳҖлӢӨ.
нғңк·№мқҳ кҙҳмҷҖ м»ҙн“Ён„°мқҳ мқҙ진법...
мҡ°мЈј л§Ңл¬јмқҳ кё°ліё мҲ«мһҗмқё 3
мқҙ кҙҖкі„м—җм„ң мқҙ진법мқ„ нҢ”진법мңјлЎң л°”кҫёкі лҳҗ 10진법мңјлЎң л°”лҖҗ мҲҳлҘј 16진법мңјлЎң л°”кҫёкі —-
к·ёлҹ¬л©ҙм„ң лӮң н•ңм—Ҷмқҙ к·ё мӢ 비함м—җ л№ мЎҢлҚҳ кё°м–өмқҙ лӮңлӢӨ.
л¬јлЎ м§ҖкёҲмқҖ кё°м–өмқҳ м ҖнҺёмңјлЎң л„ҳкІЁ лҶ“мқҖ мғҒнғңмқҙм§Җл§Ң—-
лӮң кұ°кё°м„ң м№ңкө¬мҷҖмқҳ кҙҖкі„лҘј ж•ёзҗҶлЎң н‘ёлҠ” мҡ”л №(?)мқ„ н„°л“қ н–ҲлҚҳ кІғмқҙлӢӨ.
кұ°кё°м—җлӢӨ кі м „мӢңк°„м—җ л°°мҡ°лҠ” кіөмһҗлӢҳ, 맹мһҗлӢҳ л§җм”ҖмқҖ мҷң к·ёлҰ¬ мўӢм•ҳлҚҳм§Җ^^
м§ҖкёҲлҸ„ к°ҖлҒ” м“°лҠ” кі мӮ¬м„ұм–ҙк°Җ к·ёл•Ң мӢӨл Ҙмқҙлқјл©ҙ мҷң лӢӨ м•Ҳ лҜҝмқ„к№Ң?
н•ҳм—¬к°„ мўӢмқҖ м№ңкө¬к°„мқҳ мӮ°мҲ м Ғ мқҳлҜёлҠ” л§ҲмқҢмқҳ мҲ«мһҗлЎң кі„мӮ°лҗңлӢӨлҠ” 진лҰ¬лҘј н„°л“қн•ҳкё° к°Җ진 лі„лЎң кёҙ мӢңк°„мқҙ н•„мҡ”н•ҳм§Җ м•Ҡм•ҳлӢӨ.
к·ё м§„м •н•ң л§ҳмқ„ м•Ңкё° мң„н•ҙм„ л•ҢлЎ нҳ„мӢӨм Ғ мҲҳм№ҳ(л¬јм§Ҳ)лҘј лҚ” мЈјм–ҙм•ј н•ҳкі лҳҗ мһғм–ҙм•ј н•Ёмқҙ л§Һмқ„ л•Ңк°Җ нӣЁм”¬ лӢӨл°ҳмӮ¬мқҙлӢӨ.
мөңм•…мқҳ мЎ°кұҙмқј л•Ң к·ё мӮ¬лҰјмқҳ 진л©ҙлӘ©мқ„ м•Ң мҲҳ мһҲлҠ” кІҢ м•„лӢҗк№Ң?
мҡ°лҰ° м№ңкө¬мқҳ к°ңл…җмқ„ кұ°мқҳ лҸҷл…„л°°лЎң мғқк°Ғ н•ҳм§Җл§Ң м„ңкө¬мқҳ мӮ¬лһҢл“ӨмқҖ мқҙм„ұкіј лӮҳмқҙлҘј мҙҲмӣ”н•ҳм—¬ м№ңкө¬лқјлҠ” н‘ңнҳ„мқ„ м“ҙлӢӨ.
лӮң м Ғм–ҙлҸ„ м№ңкө¬м—җ лҢҖн•ң м •мқҳл§ҢнҒјмқҖ м„ңкө¬мқҳ мӮ¬кі л°©мӢқмқ„ л”°лҘҙл©° мӮ¬лҠ” мӮ¬лһҢмқҙлӢӨ.
н•„мҡ”н• л•Ңмқҳ лӢӨк°Җк°Ҳ мҲҳмһҲлҠ” м№ңкө¬к°Җ м§„м •н•ң м№ңкө¬мқҙлӢӨ.
к·ёкұҙ з®—ж•ёк°Җ н•„мҡ”н•ҳм§Ҳ м•ҠмңјлӢҲ л§җмқҙлӢӨ...
н•ң(?) мІ н•ҷмқҳ лҢҖк°Җ Whistler wrote.
인생에서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맺고 , 유지하고, 또 깨면서들 살아간다.
관계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의 산술적 의미나 한 번 풀어 볼까나...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니만큼 혼자선 절대로 살아 갈 수가 없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인간은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팝송 중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Epitaph)라는 노래가 있다.
런닝타임이 한참 긴 노래 중 한곡인 이노래를 난 순전히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가사 때문에 좋아 한다.
후렴부의 Confusions will be my epitaph---라는 귀절의 해석을 위하여 며칠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새롭다.
팝송중엔 의외로 가사를 음미해 볼 가치성이 있는 노래들이 많다.
Stairways to Heaven 같은 노래도 정말 명시 중의 명시다.
헉!
얘기가 엉뚱한 곳으로 갔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보통 감정이 머리 끝까지 올랐을 때 표현 하는 말...
"너 반 죽을 줄 알아---"
반 죽으면 그럼 반은 살아 있는 게 된다.
半을 수학적으로 표기하면 1/2
그럼 반 죽음 = 반 생(삶) 즉 1/2 죽음 = 1/2 삶 이 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죽음 = 삶이 되는 것이다.
이 공식이 바로 Epitaph가 절규하듯 주장하는 인생의 논리다.
난 어릴 때(고딩 때 생각) 모든 관계에서 반 이상 남는 장사를 하려고 생각 했었다.
친구와의 교우 관계에서도 그렇구---
아버님이 지방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이셨던 까닭에 난 별로 어려운 생활을 해 본 기억이 없다.
부모님 모두 일본에서 공부 하신 탓인지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 했던 것 같다.
아버님의 수리관념 덕분에 아직도 난 숫자와 씨름하며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내가 택한 이 길을 되돌아 보고 후회한 적은 없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공짜가 없다는 진실을 깨우쳐 주신 아버님을 난 실제로 존경한다...
말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빼곤---
그래서 난 어릴 때도 모든 관계를 숫자로 풀곤 했다.
저 친구는 몇 점일까?
저 친구는 몇 % 정도의 완벽성을 갖추고 있을까?
저 집은 얼마일까? 등 등 모든 게 숫자와 관련이 있었다.
다시말해 사람에게 숫자를 붙이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난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심취해서 읽었던 백광출판사란 회사에서 출간한 "태극기"라는 책을 보고 동양철학과 서양의 과학이 접목되는 야릇한 체험을 하였다.
태극의 괘와 컴퓨터의 이진법...
우주 만물의 기본 숫자인 3
이 관계에서 이진법을 팔진법으로 바꾸고 또 10진법으로 바뀐 수를 16진법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난 한없이 그 신비함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물론 지금은 기억의 저편으로 넘겨 놓은 상태이지만---
난 거기서 친구와의 관계를 數理로 푸는 요령(?)을 터득 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고전시간에 배우는 공자님, 맹자님 말씀은 왜 그리 좋았던지^^
지금도 가끔 쓰는 고사성어가 그때 실력이라면 왜 다 안 믿을까?
하여간 좋은 친구간의 산술적 의미는 마음의 숫자로 계산된다는 진리를 터득하기 가진 별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진정한 맘을 알기 위해선 때론 현실적 수치(물질)를 더 주어야 하고 또 잃어야 함이 많을 때가 훨씬 다반사이다.
최악의 조건일 때 그 사림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린 친구의 개념을 거의 동년배로 생각 하지만 서구의 사람들은 이성과 나이를 초월하여 친구라는 표현을 쓴다.
난 적어도 친구에 대한 정의만큼은 서구의 사고 방식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의 다가갈 수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그건 算數가 필요하질 않으니 말이다...
한(?) 철학의 대가 Whistler wr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