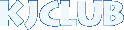「조선 왕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신빙성의 높은 사료에도 기술이 있다 일로부터, 당시 사야가로 불린 일본군으로부터의 항복자가 실재한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그러나, 일본측 사료에는 해당하는 거물의 망명 무장의 이름은 눈에 띄지 않는 것, 일본이 우세함 서전기로의 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시기에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의 투항자(조선에서는 「강원」이라고 한다)를 받아 들이지 않고 다수 사형으로 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사야가에 관한 일련의 전승은 신빙성이 얇다고 여겨지고 있다.만일, 가토 기요마사세 1만명을 만나고, 3000명의 직속의 군사를 인솔하게 되면 가토 기요마사의 영지20~25망고쿠중 6 망고쿠(100석 당 5명의 병역이 표준적인) 상당한 녹을 가지는 유력 가신이 있던 것이 되지만, 그러한 지위에 있던 인물이 상륙으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잠 돌아갔다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그리고 조선군에 총을 전언 일본군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조선군은 안이하게 총대의 앞에 나와 일제 사격을 받아 괴멸 당하거나 하고 있어, 총 방법이 전해지고 있던으로서는 총대에게의 충분한 대처가 되어 있지 않다.실제로 조선에의 투항이 속출한 것은, 1593년 4월의 명군과의 강화교섭으로 한성보다 부산에의 철퇴 후부터여, 전선 교착과 장진에 의한 염전 감정으로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야가본인이 못 쓰고 남겼다고 여겨지는 「모하당문집」이지만, 「모하당문집」의 기재에는 조선적 가치관(명에 대한 태도등)과 유교적 소양이 현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무장이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김충선의 자손이 선조 현창을 위해 쓴 것이다고 하는 설도 있다.
『朝鮮王朝実録』や『承政院日記』のような信憑性の高い史料にも記述があることから、当時沙也可と呼ばれた日本軍からの降伏者が実在したことは確実視されている。しかし、日本側史料には該当するような大物の亡命武将の名前は見あたらないこと、日本が優勢であった緒戦期での投降とされていること、その時期には朝鮮が日本からの投降者(朝鮮では「降わ」という)を受け入れずに多数死刑にしていること等から、沙也可に関する一連の伝承は信憑性が薄いとされている。仮に、加藤清正勢1万人にあって、3000人もの直属の兵を率いるとなると加藤清正の所領20~25万石のうち6万石(100石あたり5人の軍役が標準的であった)相当の禄高を有する有力家臣がいたことになるが、そのような地位に在った人物が上陸からわずか1週間後に寝返ったというのはあまりにも現実離れしている。そして朝鮮軍に鉄砲を伝え日本軍と戦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後も朝鮮軍は安易に鉄砲隊の前に出て一斉射撃を浴びて壊滅させられたりしており、鉄砲術が伝わっていたにしては鉄砲隊への十分な対処が出来ていない。実際に朝鮮への投降が続出したのは、1593年4月の明軍との講和交渉で漢城より釜山への撤退後からであり、戦線膠着と長陣による厭戦感情からと考えられる。
沙也可本人が書き残したとされる『慕夏堂文集』であるが、『慕夏堂文集』の記載には朝鮮的価値観(明に対する態度など)と儒教的素養が顕著であり、日本で生まれ育った武将が書いたとは思えない為、金忠善の子孫が先祖顕彰の為に書いたものであるとする説も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