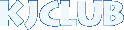2002л…„ 2мӣ”, к№ҖлҢҖлӘ©лӢҳмқҙ м°ҫм•„мҷ”лӢӨ. к№ҖлҢҖлӘ©лӢҳмқҖ мҲҳмӢӯ л…„к°„ нҒ¬кі мһ‘мқҖ л¶ҒмҙҢмқҳ н•ңмҳҘл“Өмқ„ кі міҗмҷ”лҚҳ 분мқҙлӢӨ. кі м№ м§‘мқҙ н•ҳлӮҳ мғқкІјлҠ”лҚ° м„Өкі„лҘј л¶ҖнғҒн•ң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к·ёлҹ¬л©ҙм„ң 집мқҙ мһ‘лӢӨкі н–ҲлӢӨ. мЈјмқёмқҙ л§җн•ҳкё°лҘј, л•…лҸ„ мӣҢлӮҷ мһ‘кі н•ңмҳҘлҸ„ мһ‘мңјлӢҲ лҗ мҲҳ мһҲмңјл©ҙ л§ҲлӢ№мқ„ м—Ҷм• кі н•ңмҳҘ н•ң мұ„лҘј лҢҖм§ҖлҘј к°Җл“қ мұ„мҡё мҲҳ мһҲлҸ„лЎқ кі„нҡҚн•ҙ лӢ¬лқјлҠ” кІғмқҙлӢӨ. лҢҖм§ҖлҠ” 42гҺЎ, лҢҖлһө 13нҸүмңјлЎң, л¶ҖнғҒлҢҖлЎң л•…мқ„ лӘЁл‘җ 집мңјлЎң л§Ңл“ лӢӨ н•ҙлҸ„ к·ёлҰ¬ нҒ° 집мқҙ м•„лӢҲм—ҲлӢӨ. 집мқ„ нҷ•мқён•ҳкё° мң„н•ҙ нҳ„мһҘм—җ лӮҳк°”лӢӨ. мўҒмқҖ лҢҖл¬ёмқ„ м§ҖлӮҳлӢҲ, кёёмӯүн•ҳкІҢ мғқкёҙ мһ‘мқҖ л§ҲлӢ№мқҙ лӮҳмҷ”лӢӨ. н•ңмј м—” мһҘлҸ…лҢҖк°Җ мһҲм—Ҳкі , м°Ҫл¬ёл§ҲлӢӨ 비лӢҗмқҙ мІҳм ё мһҲм—ҲлӢӨ. н•ңмҳҘл“ӨмқҖ кІЁмҡёмқ„ мқҙл ҮкІҢ лӮҳлҠ”кө¬лӮҳ мӢ¶м—ҲлӢӨ. м•ҲмқҖ мЎ°кёҲ м–ҙл‘Ўкі лӢөлӢөн–Ҳм§Җл§Ң мһ‘мқҖ л§ҲлӢ№мңјлЎң л“Өм–ҙмҳӨлҠ” н–ҮмӮҙмқҙ м°ё мўӢм•ҳлӢӨ. лҸҢм•„мҳӨл©ҙм„ң мһ‘мқҖ 집мқјмҲҳлЎқ л§ҲлӢ№мқҙ мӨ‘мҡ”н•ҳлӢӨлҠ” мғқк°Ғмқ„ н–ҲлӢӨ. кі„лҸҷ кіЁлӘ©м—җ мһҗлҰ¬н•ң лҜёлӢҲн•ңмҳҘкіјмқҳ л§ҢлӮЁмқҖ мқҙл ҮкІҢ мӢңмһ‘лҗҳм—ҲлӢӨ.

м •кІЁмҡҙ н•ңмҳҘлҸҷл„Ө кі„лҸҷ
м•Ҳкөӯм—ӯ 3лІҲ м¶ңкө¬лҘј лӮҳмҷҖ л¶ҒмҙҢ л¬ёнҷ”м„јн„°лҘј м§ҖлӮҳ кёёмқ„ кұҙл„Ҳл©ҙ кі„лҸҷмқҙлӢӨ. м§ҖлҸ„лЎң ліҙл©ҙ кі§м•„ ліҙмқҙм§Җл§Ң, мӢӨм ңлЎң кі„лҸҷкёё мң„м—җ м„ңл©ҙ лҒқмқҙ ліҙмқј л“Ҝ л§җ л“Ҝ көҙкіЎмқ„ мқҙлЈЁкі мһҲлӢӨ. мҷң к·ёлҹҙк№Ң? мқҙмң лҠ” к°„лӢЁн•ҳлӢӨ. мҳҲл¶Җн„° н•ҳмІңмқҙ нқҗлҘҙкі к·ёкІғмқ„ л”°лқј вҖҳмІңкёёвҖҷмқҙ лӮ¬кё° л•Ңл¬ёмқҙлӢӨ. лҸҷл„ӨлҘј лӢӨлҘё л§җлЎң вҖҳкі мқ„вҖҷмқҙлқј н•ҳлҠ”лҚ°, к·ё м–ҙмӣҗмқҖ кіЁм§ңкё°мқҳ вҖҳкіЁвҖҷм—җм„ң мҷ”лӢӨ н•ңлӢӨ. кіЁмқҙ мЎҢмңјлҜҖлЎң мӮ¬лһҢл“ӨмқҖ кіЁм§ңкё° мЈјліҖмқ„ н•ҳлӮҳмқҳ кіөк°„мңјлЎң мғқк°Ғн•ҳкі лҸҷл„ӨлҘј мқҙлЈЁм—Ҳ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л¶ҒмҙҢм—җм„ң ліҙл©ҙ кі„лҸҷкіј к°ҖнҡҢлҸҷмқҙ к·ёлҹ¬н•ң вҖҳн•ң кіЁм§ңкё° н•ң лҸҷл„ӨвҖҷлҘј мқҙлЈЁлҠ” м…ҲмқҙлӢӨ.

кі„лҸҷмқҖ л¶ҒмҙҢмқҳ м—¬лҹ¬ лҸҷл„Ө мӨ‘м—җм„ңлҸ„ к°ҖмһҘ вҖҳм •кІЁмҡҙ лҸҷл„ӨвҖҷмқҳ лӘЁмҠөмқ„ н•ҳкі мһҲлӢӨ. лҸҷл„ӨлӢӨмӣҖмқҖ мЎ°мҡ©н•ң 집л“Өл§ҢмңјлЎң лӮҳнғҖлӮҳм§Җ м•ҠлҠ”лӢӨ. 집л“Ө мӮ¬мқҙмӮ¬мқҙ кёёмқ„ л”°лқј лӘЁм—¬ мһҲлҠ” вҖҳлҸҷл„ӨмҠӨлҹ¬мҡҙ к°ҖкІҢл“ӨвҖҷмқҙ мһҲм–ҙм•ј н•ңлӢӨ. кі„лҸҷ н•ңк°ҖмҡҙлҚ°лҠ” вҖҳлҸҷл„ӨвҖҷмқҳ мғҒ징мқё лӘ©мҡ•нғ•мқҙ мһҗлҰ¬н•ңлӢӨ. к·ё мқҙлҰ„лҸ„ мһ¬лҜёмһҲлҠ” вҖҳмӨ‘м•ҷнғ•вҖҷмқҙлӢӨ. к·ё мҷём—җлҸ„ н•ңмҳҘл¬ёк°„мұ„м—җ мһҗлҰ¬н•ң лҜёмҡ©мӢӨ, мһҗк·ёл§Ҳн•ң ліөлҚ•л°©, м°ёкё°лҰ„집 к°„нҢҗмқ„ лӢЁ л°©м•—к°„, кұҙл¬ј м•һ, мҳҶмңјлЎң л¬јкұҙл“Өмқҙ к°Җл“қн•ң мІ л¬јм җ, м„ёнғҒмҶҢ к·ёлҰ¬кі көҗнҡҢк°Җ мһҲлӢӨ. лҳҗ мң„мӘҪм—җлҠ” мӨ‘м•ҷкі л“ұн•ҷкөҗ, мӨ‘к°„м—җлҠ” лҢҖлҸҷм„ёл¬ҙкі л“ұн•ҷкөҗк°Җ мһҲм–ҙ л¬ёл°©кө¬мҷҖ 분мӢқм җмқҙ мҳӨк°ҖлҠ” н•ҷмғқл“Өмқ„ кё°лӢӨлҰ¬л©° мһҗлҰ¬лҘј мһЎкі мһҲлӢӨ. мғҲлЎң л“Өм–ҙм„ м№ҙнҺҳлӮҳ мҠӨнҢҢкІҢнӢ°м§‘лҸ„ лҸҷл„Өм—җ м–ҙмҡёлҰ¬лҠ” мҶҢл°•н•ң м°ЁлҰјмқ„ н•ҳлҠ” кі„лҸҷм—җлҠ” лӢӨлҘё кіікіјлҠ” лӢӨлҘё л”°мҠӨн•Ёкіј нҺём•Ҳн•Ёмқҙ мһҲлӢӨ.
н•ңнҺё, м •кІЁмҡҙ н’ҚкІҪмқҳ л°°кІҪм—җлҠ” вҖҳкі„лҸҷкёёмқҳ кі мң н•ң мҠӨмјҖмқјвҖҷмқҙ мһҲлӢӨ. мҠӨмјҖмқјмқҖ нҒ¬кё°к°җмқ„ лң»н•ҳлҠ”лҚ°, кёёк°Җм—җ кұҙл¬јл“ӨмқҖ н•ңмҳҘмқҙ м•„лӢҢ кІғмқҙ л§Һм§Җл§Ң, кёёмқҳ нҸӯмқҙлӮҳ көҪмқҙм№ҳлҠ” лӘЁм–‘мқҖ мҳӣ кёё к·ёлҢҖлЎңмқҙлӢӨ. кёёнҸӯмқ„ л„“нҳҖ нҒ¬кІҢ м—ҙлҰ° к°ҖнҡҢлҸҷкёёкіј 비көҗн•ҳл©ҙ кі„лҸҷкёёмқҳ м•„лӢҙн•ң нҒ¬кё°к°җ, мҰү мҠӨмјҖмқјмқҖ л¬ҙмІҷмқҙлӮҳ нҠ№лі„н•ҳкі мҶҢмӨ‘н•ң кІғмқҙлӢӨ. м—¬кё°м—җ лҚ”л¶Ҳм–ҙ кёём—җм„ң мЎ°кёҲл§Ң м•ҲмңјлЎң л“Өм–ҙк°Җл©ҙ л°ңкІ¬лҗҳлҠ” мҳ¬л§қмЎёл§қн•ң н•ңмҳҘл“Өмқҳ 집합мқҖ кі„лҸҷкёё лӢөмӮ¬мқҳ лҳҗ лӢӨлҘё л°ұлҜёлқј н•ҳкІ лӢӨ.

м„Өкі„ліҙлӢӨ м•һм„ н•ңмҳҘмқҳ кҙҖм„ұ
мқјмқ„ мӢңмһ‘н•ҳл©ҙм„ң л§ҲлӢ№мқ„ м—Ҷм• кі н•ңмҳҘмқ„ л„“нһҲлҠ” кІғмқҖ м–ҙл өлӢӨкі нҢҗлӢЁн•ҳмҳҖлӢӨ. л¬ҙм—ҮліҙлӢӨ л¶ҒмҙҢм—җлҠ” н•ңмҳҘмқ„ кі м№ҳлҠ” вҖҳмҲҳм„ кё°мӨҖвҖҷмқҙ мһҲм–ҙ, мӢӨм ңлЎң н• мҲҳ м—ҶлҠ” мқјмқҙкё°лҸ„ н–ҲлӢӨ. мҳӨнһҲл Ө л§ҲлӢ№мқ„ мһҳ мӮҙлҰ¬л©ҙм„ң вҖҳмһ‘м§Җл§Ң к№Ҡмқҙ мһҲлҠ” кіөк°„к°җвҖҷмқ„ мЈјлҸ„лЎқ кі„нҡҚн–ҲлӢӨ. кіЁлӘ©м—җм„ң лҢҖл¬ёмқ„ нҶөн•ҙ л§ҲлӢ№м—җ л“Өм–ҙмҳӨл©ҙ, лЁјм Җ м ңмқј к°Җк№Ңмҡҙ нҒ°л°©мңјлЎң л“Өм–ҙк°Ҳ мҲҳ мһҲкІҢ н•ҳмҳҖкі , к·ё м•ҲмӘҪмңјлЎң л¶Җм—Ңмқ„ л‘җм—ҲлӢӨ. к·ёлҰ¬кі мқҙ л¶Җм—Ңмқ„ м§ҖлӮҳ мһ мһҗлҠ” м№ЁмӢӨлЎң л“Өм–ҙк°Ҳ мҲҳ мһҲлҸ„лЎқ н–ҲлӢӨ. мқҙкІғмқ„ лӢӨлҘҙкІҢ л§җн•ҳл©ҙ, лЁјм Җ л“Өм–ҙк°ҖлҠ” нҒ°л°©мқҖ мҶҗлӢҳл“Өмқҙ л“Өм–ҙмҳӨлҠ” кұ°мӢӨ к°ҷмқҖ вҖҳкіөм Ғмқё кіөк°„”мқҙкі , кұ°кё°м„ң л¶Җм—Ң к·ёлҰ¬кі м№ЁмӢӨлЎң, вҖҳм җм җ лҚ” мқҖл°Җн•ң мӮ¬м Ғмқё кіөк°„вҖҷмқҙ лҗҳлҸ„лЎқ кө¬мғҒн•ң кІғмқҙлӢӨ. лӮҳлҰ„мңјлЎңлҠ” н•©лҰ¬м Ғмқё м„Өкі„лҘј н–ҲлӢӨкі нқҗлӯҮн•ҙн–ҲлӢӨ.

к·ёлҹ¬лӮҳ мӢӨм ңлЎң м§Җм–ҙ진 н•ңмҳҘмқҖ м„Өкі„мҷҖ лӢ¬лһҗлӢӨ. мҳҲм „м—җ м“°лҚҳ кІғмІҳлҹј к°ҖмҡҙлҚ° лҢҖмІӯмқ„ л‘җкі , к·ёкіім—җ мӢұнҒ¬лҢҖлҘј л‘җм—ҲлӢӨ. лҢҖмІӯмқҙ л¶Җм—Ңкіј кІ°н•©н•ҙ вҖҳл¶Җм—ҢлҢҖмІӯвҖҷмқҙ лҗң м…ҲмқҙлӢӨ. к·ёлҰ¬кі к·ёкіім—җм„ң кёёмӘҪкіј м•ҲмӘҪм—җ мһҲлҠ” л‘җ л°©мңјлЎң к°Ғк°Ғ л“Өм–ҙк°Ҳ мҲҳ мһҲлҸ„лЎқ л§Ңл“Өм–ҙ лҶ“м•ҳлӢӨ. мӣҗлһҳмқҳ кі„нҡҚмқ„ л”°лҘҙм§Җ м•ҠмқҖ кІғм—җ 기분мқҙ мғҒн–Ҳм§Җл§Ң, мҷң к·ёл ҮкІҢ н–Ҳмқ„к№Ң мӢңк°„мқ„ л‘җкі кі°кі°мқҙ мғқк°Ғн•ҙ ліҙм•ҳлӢӨ. к·ёлҰ¬кі лӮҙлҰ° кІ°лЎ мқҖ лҢҖл¬ём—җм„ң л§ҲлӢ№, л§ҲлӢ№м—җм„ң лҢҖмІӯ к·ёлҰ¬кі лҢҖмІӯм—җм„ң к°Ғ л°©мңјлЎң мқҙм–ҙм§ҖлҠ”, м–ҙл–»кІҢ ліҙл©ҙ мҲҳл°ұ л…„мқ„ лӮҙл Өмҷ”мқ„ вҖҳн•ңмҳҘмқҳ кіөк°„мқ„ кө¬м„ұн•ҳлҠ” к·ё кҙҖм„ұвҖҷмқҙ вҖҳн•©лҰ¬м„ұмқ„ 추кө¬н•ҳлҠ” м„Өкі„вҖҷлҘј м ңм••н•ң кІғмқҙлқј к№ЁлӢ«кІҢ лҗҳм—ҲлӢӨ.
мҳҲлҘј л“Өл©ҙ, мӣҗлһҳмқҳ м„Өкі„м—җм„ң л°©мқҖ лҠҳ кіөм Ғмқё кІғкіј мӮ¬м Ғмқё кІғмқҙ кі м •лҗҳм–ҙ м •н•ҙм§ҖлҠ” л°ҳл©ҙ, мӢӨм ңлЎң м§Җм–ҙ진 лҢҖмІӯ м–‘мӘҪмқҳ л‘җ л°©мқҖ м“°мһ„м—җ л”°лқј мһҗмң лЎӯкІҢ лӢ¬лқјм§Ҳ мҲҳ мһҲм—ҲлӢӨ. л§ҲлӢ№лҸ„ кі„нҡҚм—җм„ңлҠ” мӢ мқ„ лІ—кі л“Өм–ҙмҳӨлҠ” кіікіј л°© м•һм—җ мӘҪл§ҲлЈЁлҘј л‘җкі л°”лқјліҙлҠ” кіімңјлЎң м •н•ҙмЎҢм§Җл§Ң, мӢӨм ң л§Ңл“Өм–ҙ진 л§ҲлӢ№мқҖ 집 к°ҖмҡҙлҚ° лҶ“мқё лҢҖмІӯкіј мқҙм–ҙм§Җл©ҙм„ң, вҖҳ집 м „мІҙмқҳ мӨ‘мӢ¬вҖҷмқҙ лҗҳкі лӢӨм–‘н•ң нҷңлҸҷмқ„ н• мҲҳ мһҲлҠ” кіөк°„мңјлЎң кі міҗмЎҢлӢӨ. м—¬лҹ¬л¶„л“Өмқ„ лӘЁмӢңкі л¶ҒмҙҢмқ„ лӢөмӮ¬н• л•Ң, 그분л“Өмқҙ к°ҖмһҘ мўӢм•„н•ҳкі кҙҖмӢ¬мқ„ ліҙмқё к№ҢлӢӯлҸ„ мқҙ мһ‘мқҖ 집 мҶҚм—җ к·ёлҹ¬н•ң н•ңмҳҘмқҳ ліҙнҺём Ғмқё мҶҚм„ұмқҙ мһҳ мӮҙм•„мһҲкё° л•Ңл¬ёмқҙлқј мғқк°Ғн•ңлӢӨ. 2005л…„ 10мӣ”, кұҙ축к°Җ мңӨлі‘нӣҲм”ЁмҷҖ мЎ°к°Ғк°Җ л¬ём„ мҳҒм”Ё л¶Җл¶Җк°Җ мӮҙкІҢ лҗҳл©ҙм„ң, лҢҖм§Җ 42гҺЎ(13нҸү), н•ңмҳҘ 27гҺЎ(8нҸү)мқҳ мһ‘мқҖ кіөк°„мқҖ лҚ” нҷңл Ҙ мһҲкі л§Өл Ҙм Ғмқё кіөк°„мңјлЎң л°”лҖҢкІҢ лҗҳм—ҲлӢӨ.

л‘җ лІҲм§ё лҜёлӢҲн•ңмҳҘ, мһҲлҠ” кІғмқ„ мЎҙмӨ‘н•ҳл©° кі м№ҳлӢӨ.
2008л…„ м–ҙлҠҗ лӮ мңӨлі‘нӣҲм”ЁлЎңл¶Җн„° м•һ집мңјлЎң мқҙмӮ¬лҘј н•ҳкІҢ лҗҳм—ҲлӢӨкі м—°лқҪмқҙ мҷ”лӢӨ. мІҳмқҢ кі„лҸҷ 139-1 н•ңмҳҘмқ„ кі м№ л•Ң, м•һ집 139-2лҸ„ к·ёл§ҢнҒјмқҙлӮҳ мһ‘мқҖ н•ңмҳҘмһ„мқ„ м•Ңкі мһҲлҚҳ н•„мһҗлҠ” к·ёл“Өмқҙ м§Ғм ‘ 집мқ„ кі м№ҳкі л“Өм–ҙк°„лӢӨлҠ” л§җм—җ, вҖҳмқҙлІҲм—җлҠ” м–ҙл–Ө лӘЁмҠөмқјк№Ң?вҖҷн•ҳлҠ” нҳёкё°мӢ¬мқҙ лҒ“м–ҙмҳ¬лһҗлӢӨ. м§ҖлӮң м—°л§җ, лҢҒмқ„ л°©л¬ён–ҲлӢӨ. лҢҖм§Җ 60гҺЎ (18нҸү)м—җ л“Өм–ҙм„ 34гҺЎ(10нҸү) м •лҸ„мқҳ 집мқҙм—ҲлӢӨ. м „мЈјмқёмқҙ л¬ёк°„л°©мқ„ л”°лЎң м„ёлҘј мЈјм–ҙм„ң м¶ңмһ…л¬ёлҸ„ нҷ”мһҘмӢӨлҸ„ л”°лЎң мһҲлҠ” кІғмқ„ к·ёлҢҖлЎң мһ‘м—…мӢӨлЎң л§Ңл“Өм—ҲлӢӨ. м§Җ붕мқ„ лҚ®м–ҙ мӢӨлӮҙлЎң м“°лҚҳ л§ҲлӢ№мқҖ лӢӨмӢң н•ҳлҠҳмқ„ л°”лқјліј мҲҳ мһҲлҸ„лЎқ м—ҙм–ҙ л‘җм—ҲлӢӨ. к·ёл ҮкІҢ н•ҳл©ҙм„ң мһ‘아진 л¶Җм—ҢмқҖ мӨ„мқҙкі , мҡ•мӢӨмқҖ м „ліҙлӢӨ мЎ°кёҲ лҚ” м—¬мң лҘј л‘җм—ҲлӢӨ.

нҠ№лі„н•ң м җмқҖ н•ңмҳҘмқҳ нҠ№м§•мқ„ мӮҙлҰ¬л©ҙм„ң мӣҗлһҳ 집мқҳ мҡ”мҶҢл“Өмқ„ мһҲлҠ” к·ёлҢҖлЎң мЎҙмӨ‘н•ҳл Ө м• мҚј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2002л…„м—җ н•„мһҗк°Җ кі„нҡҚн–ҲлҚҳ кұҙл¬јмқҳ мһ…л©ҙ, лҢҖмІӯм—җ кұёлҰ° к°ҖлҠҳкі л•Ңк°Җ 묻мқҖ м„ңк№Ңлһҳ, лӮҳм•„к°Җм„ңлҠ” л°©мқ„ лҠҳлҰ¬кё° мң„н•ҙ лҚ§лҢҖм—ҲлҚҳ мІ м ңл№”лҸ„ к·ёлҢҖлЎң л‘җм—ҲлӢӨ. мңӨлі‘нӣҲ мҶҢмһҘмқҖ ліҙмҲҳн•ң нқ”м Ғл“ӨлҸ„ мқҙ 집мқҳ м—ӯмӮ¬лқј мғқк°Ғн•ҳкі мҶҢмӨ‘нһҲ н–ҲлӢӨкі н•ңлӢӨ к·ёлҹ¬л©ҙм„ңлҸ„ н•ң нҺёмңјлЎ , н•ҳмҲҳл°°кҙҖкіј м •нҷ”мЎ° л“ұ ліҙмқҙм§Җ м•Ҡм§Җл§Ң кұ°мЈјнҷҳкІҪм—җ мӨ‘мҡ”н•ң кІғл“Өмқ„ кі м№ҳлҠ” лҚ° л§ҺмқҖ л…ёл Ҙмқ„ н–ҲлӢӨкі н–ҲлӢӨ.

л‘җ лІҲм§ё лҜёлӢҲн•ңмҳҘмқҖ мІ« лІҲм§ёліҙлӢӨ мһҗмң лЎңмҡҙ лҠҗлӮҢмқҙ л“Өм—ҲлӢӨ. к·ё мқҙмң лҠ” кјӯ м „нҶөм Ғмқё л¬ёмқҙлӮҳ м°Ҫл§Ңмқ„ кі м§‘н•ҳм§Җ м•Ҡкі , кө°лҚ°кө°лҚ°м—җ мҡ”мҰҳ м“°лҠ” нҳ„лҢҖмӢқ м°ҪнҳёлӮҳ мҠ¬лқјмқҙл”© лҸ„м–ҙ л“ұмқ„ мҚјкё° л•Ңл¬ёмқҙлӢӨ. вҖңлӮҳмӨ‘м—җ мқҙ 집мқ„ ліё мӮ¬лһҢл“Өмқҙ лӢ№мӢңм—җлҠ” мқҙлҹ° м°Ҫл“Өмқ„ мҚјкө¬лӮҳ м•„лҠ” кІғлҸ„ мқҳлҜё мһҲмқ„ кІғвҖқмқҙлқј л‘җ л¶Җл¶ҖлҠ” л§җн–ҲлӢӨ. кіөмӮ¬л№„лҘј мӨ„мқҙл Өкі , м•„кё°к°Җ мһҗлҠ” мӢңк°„м—җ л‘ҳмқҙм„ң л§ҲлЈЁлҘј к№”кі лҸ„л°°м—җ мһҘнҢҗк№Ңм§Җ м§Ғм ‘ н–ҲлӢӨкі н•ңлӢӨ. л§ҲлӢ№мқ„ нҢҢл©ҙм„ң лҢ“лҸҢмқҙ лӮҳмҳӨкі к°Җл ӨмЎҢлҚҳ кё°л‘Ҙмқҳ мЈјл Ёмқҙ л“ңлҹ¬лӮҳ л„Ҳл¬ҙ кё°л»ӨлӢӨлҠ” л‘җ мӮ¬лһҢмқ„ ліҙл©ҙм„ң, мқҙ мһ‘мқҖ 집 м—ӯмӢң мўӢмқҖ мЈјмқёмқ„ л§ҢлӮҳ м°ёмңјлЎң н–үліөн• кІғмқҙлһҖ мғқк°Ғмқ„ н•ҳмҳҖлӢӨ.

мһ‘мқҖ 집м—җм„ң мӮ¶мқҳ мҶҢмӨ‘н•Ёмқ„ мғқк°Ғн•ҳлӢӨ
кі„лҸҷмқҳ мһ‘мқҖ н•ңмҳҘл“Өмқҙ мҡ°лҰ¬м—җкІҢ мЈјлҠ” к°җлҸҷмқҙлһҖ, мһ‘м§Җл§Ң мһҲмқ„ кІғмқҖ лӢӨ к°–м¶”кі мһҲлӢӨлҠ” нҺёлҰ¬н•Ёмқҙ м•„лӢҲлӢӨ. л№ҲнӢҲм—Ҷмқҙ м§ңм—¬ мһҲм–ҙ м•„лҰ„лӢөкі м„ёл Ёлҗҳм–ҙ ліҙмқҙлҠ” нҠёл Ңл””н•ң лҠҗлӮҢмқҖ лҚ”лҚ”мҡұ м•„лӢҲлӢӨ. мһ‘м§Җл§Ң мҳӨнһҲл Ө м»Ө ліҙмқҙкі мҶҢл°•н•ҳм§Җл§Ң н’Қм„ұн•ң лҠҗлӮҢ, к·ёлһҳм„ң к·ё м•Ҳмқҳ мӮ¶мқҳ лҚ”мҡұ мҶҢмӨ‘н•ҳкІҢ лҠҗк»ҙм§ҖлҠ” к·ёлҹ¬н•ң кІғмқҙ м•„лӢҲм—Ҳмқ„к№Ң? мңӨлі‘нӣҲВ·л¬ём„ мҳҒ л¶Җл¶Җмқҳ н•ңмҳҘмқ„ нҶөн•ҙ, мһ‘мқҖ 집м—җ м—¬мң лҘј мЈјлҠ” л§ҲлӢ№мқҳ мҶҢмӨ‘н•Ёкіј к°Җкҫёкі ліҙмӮҙн”јлҠ” мЈјмқёмқҳ л°°л Өк°Җ м–јл§ҲлӮҳ мӨ‘мҡ”н•ңк°ҖлҘј мғқк°Ғн•ҳкІҢ лҗҳм—ҲлӢӨ.
http://navercast.naver.com/geographic/seoulscape/1845
2002е№ҙ 2жңҲ, йҮ‘жӣёгҒҚе…ҘгӮҢжҷӮж§ҳгҒҢе°ӢгҒӯгҒҰжқҘгҒҹ. йҮ‘жӣёгҒҚе…ҘгӮҢжҷӮж§ҳгҒҜж•°еҚҒе№ҙй–“еӨҡж§ҳгҒӘеҢ—жқ‘гҒ®йҹ“еұӢгҒҹгҒЎгӮ’зӣҙгҒ—гҒҰжқҘгҒҹж–№гҒ . зӣҙгҒҷ家гҒҢдёҖгҒӨз”ҹгҒҳгҒҹгҒҢиЁӯиЁҲгӮ’й јгӮҖгҒЁгҒ„гҒҶгҒ®гҒ . гҒқгӮҢгҒЁгҒЁгӮӮгҒ«е®¶гҒҢе°ҸгҒ•гҒ„гҒЁиЁҖгҒЈгҒҹ. дё»дәәгҒҢиЁҖгҒҶгҒ®гӮ’, ең°гӮӮгҒӮгӮ“гҒҫгӮҠе°ҸгҒ•гҒҸгҒҰйҹ“еұӢгӮӮе°ҸгҒ•гҒ„гҒӢгӮүгҒ§гҒҚгӮӢгҒ гҒ‘еәӯе…ҲгӮ’з„ЎгҒҸгҒ—гҒҰйҹ“еұӢдёҖи»’гӮ’еӨ§ең°гӮ’гҒ„гҒЈгҒұгҒ„жәҖгҒҹгҒҷгӮҲгҒҶгҒ«иЁҲз”»гҒ—гҒҰгҒҸгӮҢгҒЁгҒ„гҒҶгҒ®гҒ . гҒӨгҒ‘гӮӢгҒ®гҒҜ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