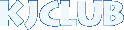ж—Ҙжң¬дәәгҒҹгҒЎгҒ®дёӯгҒ§дёҖйғЁгҒҢ ”ж ёзҲҶејҫгғ„гғјгҒҷгӮӢд»•ж–№гҒӘгҒӢгҒЈгҒҹ” гҒЁжҖқгҒҶиғҢжҷҜгҒ«гҒҜжӯҙеҸІзҡ„гғ»ж”ҝжІ»зҡ„гғ»еҝғзҗҶзҡ„иҰҒеӣ гҒҢиӨҮеҗҲзҡ„гҒ«дҪңз”ЁгҒҷгӮӢ. гҒ“гӮҢгҒҜеҚҳзҙ”гҒӘж•—еҢ—дё»зҫ©гҒЁгҒ„гҒҶгӮҲгӮҠ, еүҚеҫҢж—Ҙжң¬гҒҢеҮҰгҒ—гҒҹзҸҫе®ҹгҒЁгӮўгғЎгғӘгӮ«гҒЁгҒ®й–ўдҝӮгҒ®дёӯгҒ§еҪўжҲҗгҒ•гӮҢгҒҹиҖғгҒҲж–№гҒ .
1. ж•—жҲҰеӣҪж—Ҙжң¬гҒ®жӯҙеҸІиӘҚиӯҳеӨүеҢ–
(1) еүҚеҫҢ(жҲҰеҫҢ) ж—Ҙжң¬гҒ®гӮўгғЎгғӘгӮ«дҫқеӯҳ
- ж—Ҙжң¬гҒҜ 第2ж¬Ўдё–з•ҢеӨ§жҲҰгҒ§ж•—гӮҢгҒҹеҫҢгӮўгғЎгғӘгӮ«гҒ®еҚ й ҳ(1945вҖҫ1952) гӮ’зөҢйЁ“гҒ—гҒҹ.
- гӮўгғЎгғӘгӮ«гҒҜж—Ҙжң¬гӮ’еҶҚе»әгҒ—гҒӘгҒҢгӮүгғҮгғўгӮҜгғ©гӮ·гғј, е№іе’Ңдё»зҫ©(е№іе’ҢжҶІжі•, иҮӘиЎӣйҡҠеүөиЁӯ) гҒӘгҒ©гӮ’е…ҘгӮҢиҫјгӮ“гҒ гҒ—, ж—Ҙжң¬гҒҜгӮўгғЎгғӘгӮ«гҒЁгҒ®й–ўдҝӮгӮ’еј·еҢ–гҒҷгӮӢгҒ®гҒҢеӣҪ家з”ҹеӯҳгҒ«еҝ…й ҲгҒ гҒЁиӘҚиӯҳгҒҷгӮӢгӮҲгҒҶгҒ«гҒӘгҒЈгҒҹ.
- ж ёзҲҶејҫжҠ•дёӢгӮ’еҗҰе®ҡзҡ„гҒ«зңәгӮҒгӮҢгҒ°, еүҚеҫҢж—Ҙжң¬гҒҢеҜ„гӮҠжҺӣгҒӢгҒЈгҒҰжқҘгҒҹгӮўгғЎгғӘгӮ«гӮ’жӯЈйқўгҒӢгӮүжү№еҲӨгҒҷгӮӢзөҗжһңгҒ«гҒӘгӮӢ. гҒ—гҒҹгҒҢгҒЈгҒҰж—Ҙжң¬ж”ҝеәңгҒЁиЈңдҝ®иЁҖи«–гҒҜж ёзҲҶејҫе•ҸйЎҢгӮ’з©ҚжҘөзҡ„гҒ«еҸ–гӮҠдёҠгҒ’гҒӘгҒӢгҒЈгҒҹ.
(2) ж—Ҙжң¬еҶ…йғЁгҒ®иҮӘеҲҶеҗҲзҗҶеҢ–
- ж•—жҲҰеҫҢж—Ҙжң¬зӨҫдјҡгҒҜ ”з§ҒгҒҹгҒЎгҒҜиў«е®іиҖ…” гҒЁгҒ„гҒҶиӘҚиӯҳгӮ’жҢҒгҒЎгҒӘгҒҢгӮүгӮӮ, жҲҰдәүгҒ®иІ¬д»»гӮ’еӣһйҒҝгҒ—гӮҲгҒҶгҒЁгҒҷгӮӢеӮҫеҗ‘гҒҢгҒӮгҒЈгҒҹ.
- ж ёзҲҶејҫжҠ•дёӢгҒ«еҜҫгҒҷгӮӢжҖ’гӮҠгӮҲгӮҠгҒҜ ”ж—Ҙжң¬гҒҢжҲҰдәүгӮ’иө·гҒ“гҒ—гҒҹгҒӢгӮүзөҗеұҖиө·гҒЈгҒҹдәӢ” гҒЁгҒ„гҒҶгҒөгҒҶгҒ®иҮӘеҲҶеҗҲзҗҶеҢ–гҒҢжҲҗгӮҠз«ӢгҒЈгҒҹ.
2. ж ёзҲҶејҫжҠ•дёӢгӮ’жӯЈеҪ“еҢ–гҒҷгӮӢи«–зҗҶ
(1) жҲҰдәүгӮ’ж—©гҒҸзөӮгӮҸгӮүгҒӣгӮӢгҒҹгӮҒгҒ®д»•ж–№гҒӘгҒ„йҒёжҠһ
- гӮўгғЎгғӘгӮ«гҒЁж—Ҙжң¬ж”ҝеәңгҒ®з«Ӣе ҙ: “ж ёзҲҶејҫгҒҢгҒӘгҒӢгҒЈгҒҹгӮүж—Ҙжң¬гҒҜжңҖеҫҢгҒҫгҒ§жҠөжҠ—гҒ—гҒҹгҒ—, гӮӮгҒЈгҒЁеӨҡгҒ„зҠ зүІгҒҢзҷәз”ҹгҒ—гҒҹгҒҜгҒҡгҒ .”
- зү№гҒ«гӮўгғЎгғӘгӮ«гҒҜж ёзҲҶејҫгӮ’дҪҝгҒЈгҒҹзҗҶз”ұгӮ’ ”еӨӘе№іжҙӢжҲҰдәүгӮ’ж—©гҒҸзөӮгӮҸгӮүгҒӣгҒҰ, зұіи»ҚгҒЁж—Ҙжң¬ж°‘й–“дәәгҒ®зҠ зүІгӮ’жёӣгӮүгҒҷгҒҹгӮҒгҒ®йҒёжҠһ” гҒЁиӘ¬жҳҺгҒ—гҒҰ, гҒ“гӮҢгҒҜж—Ҙжң¬гҒ§гӮӮдёҖйғЁеҸҺе®№гҒ•гӮҢгҒҹ.
(2) еӨ©зҡҮеҲ¶з¶ӯжҢҒгҒ®гҒҹгӮҒгҒ®йҒёжҠһ
- ж—Ҙжң¬жҢҮе°ҺйғЁгҒҜжҲҰдәүиҝҪгҒ„гҒ“гҒҝгҒҫгҒ§ ”жң¬еңҹжұәжҲҰ” гӮ’дё»ејөгҒ—гҒҹгҒҢ, ж ёзҲҶејҫжҠ•дёӢд»ҘеҫҢгҒ«гҒҜжҖҘгҒ«йҷҚдјҸгҒ—гҒҹ.
- еәғеі¶гғ»й•·еҙҺгҒ§гҒҜгҒӘгҒҸгӮҪйҖЈгҒ®еҸӮжҲҰ(8жңҲ 9ж—Ҙ)гҒҢжұәе®ҡзҡ„гҒ гҒЈгҒҹгҒЁгҒ„гҒҶдё»ејөгӮӮгҒӮгҒЈгҒҹгӮү
- жҲҰдәүгҒҢгӮӮгҒЈгҒЁй•·гҒҸгҒӘгҒЈгҒҹгӮү, еӨ©зҡҮеҲ¶е»ғжӯўгҒЁж—Ҙжң¬гҒ®еҲҶеүІеҚ й ҳеҸҜиғҪжҖ§гҒҢй«ҳгҒҸгҒӘгҒЈгҒҹгҒӢгӮү, ”ж ёзҲҶејҫгҒҢж—Ҙжң¬гӮ’е®Ңе…ЁгҒ«еҙ©гҒҷеүҚгҒ«йҷҚеҸӮгӮ’жұәгӮҒгӮӢгҒ“гҒЁгҒҢгҒ§гҒҚгӮӢж©ҹдјҡгӮ’дёҺгҒҲгҒҹ” гҒЁиЁҖгҒҶи«–зҗҶгӮӮеӯҳеңЁгҒҷгӮӢ.
(3) ж—Ҙжң¬дәәгҒ®йӣҶеӣЈдё»зҫ©зҡ„иҖғгҒҲж–№
- ж—Ҙжң¬зӨҫдјҡгҒҜ еҖӢдәәгҒ®зҠ зүІгҒҢе…ұеҗҢдҪ“гҒ®гҒҹгӮҒгҒ®дёҚеҸҜйҒҝгҒӘйҒёжҠһ гҒЁгҒ„гҒҶиҖғгҒҲж–№гҒҢеј·гҒ„.
- гҒ—гҒҹгҒҢгҒЈгҒҰж ёзҲҶејҫйҒҝгҒ‘гҒҰгӮӮ ”жҲҰдәүгӮ’ж—©гҒҸзөӮгӮҸгӮүгҒӣгҒҰгӮӮгҒЈгҒЁеӨ§гҒҚгҒ„иў«е®ігӮ’йҳ»гӮҖгҒҹгӮҒгҒ®зҠ зүІ” гҒ§жӯЈеҪ“еҢ–гҒҷгӮӢгҒҚгӮүгҒ„гҒҢгҒӮгӮӢ.
3. ж—Ҙжң¬еҶ…гҒ§гӮӮж„ҸиҰӢе·®еӯҳеңЁ
(1) еҸҚж ёгғ»еҸҚи»ўйҒӢеӢ•
- ж—Ҙжң¬еҶ…е№іе’Ңдё»зҫ©иҖ…гҒҹгҒЎгҒЁеҺҹзҲҶиў«е®іиҖ…еӣЈдҪ“(гғ’гғҗгӮҜгӮ·гғЈ, иў«зҲҶиҖ…)гҒҜж ёзҲҶејҫжҠ•дёӢгӮ’еј·еҠӣгҒ«жү№еҲӨгҒҷгӮӢ.
- гҒ—гҒӢгҒ—ж—Ҙжң¬ж”ҝеәңгҒҜжҲҰдәүиІ¬д»»е•ҸйЎҢгӮ’йҒҝгҒ‘гӮҲгҒҶгҒЁе…¬ејҸзҡ„гҒ«ж ёзҲҶејҫиў«е®ігӮ’еј·иӘҝгҒҷгӮӢгҒ“гҒЁгӮ’жҶҡгҒЈгҒҰжқҘгҒҹ.
(2) дҝқе®ҲеұӨгҒЁеҸізҝјгҒ®з«Ӣе ҙ(е…Ҙе ҙ)
- ж—Ҙжң¬гҒ®иЈңдҝ®гғ»еҸізҝјгҒҜж ёзҲҶејҫе•ҸйЎҢгӮ’зӣҙжҺҘзҡ„гҒ«еҸ–гӮҠдёҠгҒ’гҒӘгҒ„д»ЈгӮҸгӮҠ, ”жҲҰдәүгӮ’иө·гҒ“гҒ—гҒҹгҒ“гҒЁгҒҜд»•ж–№гҒӘгҒӢгҒЈгҒҹ” гҒЁгҒ„гҒҶгҒөгҒҶгҒ«жӯҙеҸІжӯӘжӣІгӮ’и©ҰгҒҝгӮӢе ҙеҗҲгҒҢеӨҡгҒ„.
- дёҖж–№дёҖйғЁжҘөеҸідәәеЈ«гҒҜж ёзҲҶејҫжҠ•дёӢгӮ’еҗҰе®ҡзҡ„гҒ«иҰӢгҒӘгҒҢгӮүгӮӮ, ”гӮўгғЎгғӘгӮ«гҒҢж—Ҙжң¬гӮ’еҙ©гҒҷгҒҹгӮҒгҒ«ж„Ҹеӣізҡ„гҒ«ж ёгӮ’дҪҝгҒЈгҒҹ” гҒЁеҸҚзұіж„ҹжғ…гӮ’зҸҫгӮҸгҒ—гҒҹгӮҠгҒҷгӮӢ.
4. зөҗи«–: ж—Ҙжң¬дәәгҒ® “д»•ж–№гҒӘгҒӢгҒЈгҒҹ”гҒЁгҒ„гҒҶиҖғгҒҲж–№гҒ®жң¬иіӘ
- гӮўгғЎгғӘгӮ«гҒЁгҒ®й–ўдҝӮз¶ӯжҢҒ: гӮўгғЎгғӘгӮ«гӮ’жӯЈйқўгҒӢгӮүжү№еҲӨгҒ—гҒҰгҒҜгҒ„гҒ‘гҒӘгҒ„гҒЁгҒ„гҒҶиӘҚиӯҳ.
- иҮӘеҲҶеҗҲзҗҶеҢ–: ж—Ҙжң¬гӮӮжҲҰдәүгӮ’иө·гҒ“гҒ—гҒҹгҒӢгӮү, ж ёзҲҶејҫгҒҜдёҚеҸҜж¬ гҒ гҒЈгҒҹгҒЁгҒ„гҒҶж…ӢеәҰ.
- йӣҶеӣЈдё»зҫ©зҡ„жҖқиҖғ: еҖӢдәәгҒ®зҠ зүІгӮ’еӣҪ家зҡ„йҒӢе‘ҪгҒ§еҸ—гҒ‘е…ҘгӮҢгӮӢж–ҮеҢ–.
- ж”ҝеәңгҒ®жӯҙеҸІж•ҷиӮІз§‘иЁҖи«–ж“ҚдҪң: ж ёзҲҶејҫгҒ«еҜҫгҒҷгӮӢжҳҺзўәгҒӘз«Ӣе ҙ(е…Ҙе ҙ)ж•ҙзҗҶгӮ’еӣһйҒҝ.
гҒҷгҒӘгӮҸгҒЎ, ”ж ёзҲҶејҫгғ„гғјгҒҷгӮӢд»•ж–№гҒӘгҒӢгҒЈгҒҹ” гҒЁиЁҖгҒҶиҖғгҒҲж–№гҒҜж—Ҙжң¬гҒҢеүҚеҫҢгӮўгғЎгғӘгӮ«гҒЁгҒ®й–ўдҝӮгҒ®дёӯгҒ§еҪўжҲҗгҒ•гӮҢгҒҹиҮӘеҲҶеҗҲзҗҶеҢ–гҒЁеҗҢжҷӮгҒ«, жҲҰдәүиІ¬д»»гӮ’еӣһйҒҝгҒ—гӮҲгҒҶгҒЁгҒҷгӮӢйӣҶеӣЈзҡ„гҒӘйҳІеҫЎе№ҙзҘӯгҒЁиҰӢгӮүгӮҢгӮӢ.
мқјліёмқёл“Ө мӨ‘ мқјл¶Җк°Җ "н•өнҸӯнғ„ нҲ¬н•ҳлҠ” м–ҙм©” мҲҳ м—Ҷм—ҲлӢӨ" лқјкі мғқк°Ғн•ҳлҠ” л°°кІҪм—җлҠ” м—ӯмӮ¬м ҒВ·м •м№ҳм ҒВ·мӢ¬лҰ¬м Ғ мҡ”мқёмқҙ ліөн•©м ҒмңјлЎң мһ‘мҡ©н•ңлӢӨ. мқҙлҠ” лӢЁмҲңн•ң нҢЁл°°мЈјмқҳлқјкё°ліҙлӢӨ, м „нӣ„ мқјліёмқҙ мІҳн•ң нҳ„мӢӨкіј лҜёкөӯкіјмқҳ кҙҖкі„ мҶҚм—җм„ң нҳ•м„ұлҗң мӮ¬кі л°©мӢқмқҙлӢӨ.
1. нҢЁм „көӯ мқјліёмқҳ м—ӯмӮ¬ мқёмӢқ ліҖнҷ”
(1) м „нӣ„(жҲ°еҫҢ) мқјліёмқҳ лҜёкөӯ мқҳмЎҙ
- мқјліёмқҖ м ң2м°Ё м„ёкі„лҢҖм „м—җм„ң нҢЁл°°н•ң нӣ„ лҜёкөӯмқҳ м җл №(1945~1952) мқ„ кІҪн—ҳн–ҲлӢӨ.
- лҜёкөӯмқҖ мқјліёмқ„ мһ¬кұҙн•ҳл©ҙм„ң лҜјмЈјмЈјмқҳ, нҸүнҷ”мЈјмқҳ(нҸүнҷ”н—ҢлІ•, мһҗмң„лҢҖ м°Ҫм„Ө) л“ұмқ„ мЈјмһ…н–Ҳкі , мқјліёмқҖ лҜёкөӯкіјмқҳ кҙҖкі„лҘј к°•нҷ”н•ҳлҠ” кІғмқҙ көӯк°Җ мғқмЎҙм—җ н•„мҲҳм Ғмқҙлқјкі мқёмӢқн•ҳкІҢ лҗҗлӢӨ.
- н•өнҸӯнғ„ нҲ¬н•ҳлҘј л¶Җм •м ҒмңјлЎң л°”лқјліҙл©ҙ, м „нӣ„ мқјліёмқҙ мқҳмЎҙн•ҙмҳЁ лҜёкөӯмқ„ м •л©ҙмңјлЎң 비нҢҗн•ҳлҠ” кІ°кіјк°Җ лҗңлӢӨ. л”°лқјм„ң мқјліё м •л¶ҖмҷҖ ліҙмҲҳ м–ёлЎ мқҖ н•өнҸӯнғ„ л¬ём ңлҘј м Ғк·№м ҒмңјлЎң кұ°лЎ н•ҳм§Җ м•Ҡм•ҳлӢӨ.
(2) мқјліё лӮҙл¶Җмқҳ мһҗкё°н•©лҰ¬нҷ”
- нҢЁм „ нӣ„ мқјліё мӮ¬нҡҢлҠ” "мҡ°лҰ¬лҠ” н”јн•ҙмһҗ" лқјлҠ” мқёмӢқмқ„ к°Җм§Җл©ҙм„ңлҸ„, м „мҹҒмқҳ мұ…мһ„мқ„ нҡҢн”јн•ҳл ӨлҠ” кІҪн–Ҙмқҙ мһҲм—ҲлӢӨ.
- н•өнҸӯнғ„ нҲ¬н•ҳм—җ лҢҖн•ң 분노ліҙлӢӨлҠ” "мқјліёмқҙ м „мҹҒмқ„ мқјмңјмј°кё° л•Ңл¬ём—җ кІ°көӯ лІҢм–ҙ진 мқј" мқҙлқјлҠ” мӢқмқҳ мһҗкё°н•©лҰ¬нҷ”к°Җ мқҙлЈЁм–ҙмЎҢлӢӨ.
2. н•өнҸӯнғ„ нҲ¬н•ҳлҘј м •лӢ№нҷ”н•ҳлҠ” л…јлҰ¬
(1) м „мҹҒмқ„ л№ЁлҰ¬ лҒқлӮҙкё° мң„н•ң м–ҙм©” мҲҳ м—ҶлҠ” м„ нғқ
- лҜёкөӯкіј мқјліё м •л¶Җмқҳ мһ…мһҘ: "н•өнҸӯнғ„мқҙ м—Ҷм—ҲлӢӨл©ҙ мқјліёмқҖ лҒқк№Ңм§Җ м Җн•ӯн–Ҳкі , лҚ” л§ҺмқҖ нқ¬мғқмқҙ л°ңмғқн–Ҳмқ„ кІғмқҙлӢӨ."
- нҠ№нһҲ лҜёкөӯмқҖ н•өнҸӯнғ„мқ„ мӮ¬мҡ©н•ң мқҙмң лҘј "нғңнҸүм–‘ м „мҹҒмқ„ л№ЁлҰ¬ лҒқлӮҙкі , лҜёкө°кіј мқјліё лҜјк°„мқёмқҳ нқ¬мғқмқ„ мӨ„мқҙкё° мң„н•ң м„ нғқ" мқҙлқјкі м„ӨлӘ…н•ҳл©°, мқҙлҠ” мқјліём—җм„ңлҸ„ мқјл¶Җ мҲҳмҡ©лҗҳм—ҲлӢӨ.
(2) мІңнҷ©м ң мң м§ҖлҘј мң„н•ң м„ нғқ
- мқјліё м§ҖлҸ„л¶ҖлҠ” м „мҹҒ л§үл°”м§Җк№Ңм§Җ "ліёнҶ кІ°м „" мқ„ мЈјмһҘн–Ҳм§Җл§Ң, н•өнҸӯнғ„ нҲ¬н•ҳ мқҙнӣ„м—җлҠ” к°‘мһ‘мҠӨлҹҪкІҢ н•ӯліөн–ҲлӢӨ.
- нһҲлЎңмӢңл§ҲВ·лӮҳк°ҖмӮ¬нӮӨк°Җ м•„лӢҲлқј мҶҢл Ёмқҳ м°ём „(8мӣ” 9мқј)мқҙ кІ°м •м Ғмқҙм—ҲлӢӨлҠ” мЈјмһҘлҸ„ мһҲмқҢ
- м „мҹҒмқҙ лҚ” кёём–ҙмЎҢлӢӨл©ҙ, мІңнҷ©м ң нҸҗм§ҖмҷҖ мқјліёмқҳ л¶„н• м җл № к°ҖлҠҘм„ұмқҙ лҶ’м•„мЎҢкё° л•Ңл¬ём—җ, "н•өнҸӯнғ„мқҙ мқјліёмқ„ мҷ„м „нһҲ л¬ҙл„ҲлңЁлҰ¬кё° м „м—җ н•ӯліөмқ„ кІ°м •н• мҲҳ мһҲлҠ” кё°нҡҢлҘј мӨ¬лӢӨ" лҠ” л…јлҰ¬лҸ„ мЎҙмһ¬н•ңлӢӨ.
(3) мқјліёмқёмқҳ 집лӢЁмЈјмқҳм Ғ мӮ¬кі л°©мӢқ
- мқјліё мӮ¬нҡҢлҠ” к°ңмқёмқҳ нқ¬мғқмқҙ кіөлҸҷмІҙлҘј мң„н•ң л¶Ҳк°Җн”јн•ң м„ нғқ мқҙлқјлҠ” мӮ¬кі л°©мӢқмқҙ к°•н•ҳлӢӨ.
- л”°лқјм„ң н•өнҸӯнғ„ н”јн•ҙлҸ„ "м „мҹҒмқ„ л№ЁлҰ¬ лҒқлӮҙкі лҚ” нҒ° н”јн•ҙлҘј л§үкё° мң„н•ң нқ¬мғқ" мңјлЎң м •лӢ№нҷ”н•ҳлҠ” кІҪн–Ҙмқҙ мһҲлӢӨ.
3. мқјліё лӮҙм—җм„ңлҸ„ мқҳкІ¬ м°Ёмқҙ мЎҙмһ¬
(1) л°ҳн•өВ·л°ҳм „ мҡҙлҸҷ
- мқјліё лӮҙ нҸүнҷ”мЈјмқҳмһҗл“Өкіј мӣҗнҸӯ н”јн•ҙмһҗ лӢЁмІҙ(нһҲл°”мҝ мғӨ, иў«зҲҶиҖ…)лҠ” н•өнҸӯнғ„ нҲ¬н•ҳлҘј к°•л ҘнһҲ 비нҢҗн•ңлӢӨ.
- н•ҳм§Җл§Ң мқјліё м •л¶ҖлҠ” м „мҹҒ мұ…мһ„ л¬ём ңлҘј н”јн•ҳл Өкі кіөмӢқм ҒмңјлЎң н•өнҸӯнғ„ н”јн•ҙлҘј к°•мЎ°н•ҳлҠ” кІғмқ„ кәјл Өмҷ”лӢӨ.
(2) ліҙмҲҳмёөкіј мҡ°мқөмқҳ мһ…мһҘ
- мқјліёмқҳ ліҙмҲҳВ·мҡ°мқөмқҖ н•өнҸӯнғ„ л¬ём ңлҘј м§Ғм ‘м ҒмңјлЎң кұ°лЎ н•ҳм§Җ м•ҠлҠ” лҢҖмӢ , "м „мҹҒмқ„ мқјмңјнӮЁ кІғмқҖ м–ҙм©” мҲҳ м—Ҷм—ҲлӢӨ" лқјлҠ” мӢқмңјлЎң м—ӯмӮ¬ мҷңкіЎмқ„ мӢңлҸ„н•ҳлҠ” кІҪмҡ°к°Җ л§ҺлӢӨ.
- л°ҳл©ҙ мқјл¶Җ к·№мҡ° мқёмӮ¬л“ӨмқҖ н•өнҸӯнғ„ нҲ¬н•ҳлҘј л¶Җм •м ҒмңјлЎң ліҙл©ҙм„ңлҸ„, "лҜёкөӯмқҙ мқјліёмқ„ л¬ҙл„ҲлңЁлҰ¬кё° мң„н•ҙ мқҳлҸ„м ҒмңјлЎң н•өмқ„ мӮ¬мҡ©н–ҲлӢӨ" л©° л°ҳлҜё к°җм •мқ„ л“ңлҹ¬лӮҙкё°лҸ„ н•ңлӢӨ.
4. кІ°лЎ : мқјліёмқёмқҳ "м–ҙм©” мҲҳ м—Ҷм—ҲлӢӨ"лқјлҠ” мӮ¬кі л°©мӢқмқҳ ліём§Ҳ
- лҜёкөӯкіјмқҳ кҙҖкі„ мң м§Җ: лҜёкөӯмқ„ м •л©ҙмңјлЎң 비нҢҗн•ҳл©ҙ м•Ҳ лҗңлӢӨлҠ” мқёмӢқ.
- мһҗкё°н•©лҰ¬нҷ”: мқјліёлҸ„ м „мҹҒмқ„ мқјмңјмј°мңјлӢҲ, н•өнҸӯнғ„мқҖ н•„м—°м Ғмқҙм—ҲлӢӨлҠ” нғңлҸ„.
- 집лӢЁмЈјмқҳм Ғ мӮ¬кі : к°ңмқёмқҳ нқ¬мғқмқ„ көӯк°Җм Ғ мҡҙлӘ…мңјлЎң л°ӣм•„л“ӨмқҙлҠ” л¬ёнҷ”.
- м •л¶Җмқҳ м—ӯмӮ¬көҗмңЎкіј м–ёлЎ мЎ°мһ‘: н•өнҸӯнғ„м—җ лҢҖн•ң лӘ…нҷ•н•ң мһ…мһҘ м •лҰ¬лҘј нҡҢн”ј.
мҰү, "н•өнҸӯнғ„ нҲ¬н•ҳлҠ” м–ҙм©” мҲҳ м—Ҷм—ҲлӢӨ" лҠ” мӮ¬кі л°©мӢқмқҖ мқјліёмқҙ м „нӣ„ лҜёкөӯкіјмқҳ кҙҖкі„ мҶҚм—җм„ң нҳ•м„ұлҗң мһҗкё°н•©лҰ¬нҷ”мқҙмһҗ, м „мҹҒ мұ…мһ„мқ„ нҡҢн”јн•ҳл ӨлҠ” 집лӢЁм Ғмқё л°©м–ҙкё°м ңлқјкі ліј мҲҳ мһҲ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