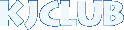「もう認めるしかない」韓国野球が“平凡レベル”まで転落したと言えるワケ【アジア大会】

初戦からそうすべきだった。客観的戦力で劣勢の台湾を越えるには、初戦の雰囲気が重要だったからだ。
スーパーラウンドを経て、決勝まで進む道のりが険しいことは知らなかったはずだ。緊張感を言い訳とするには“プロ”という修飾語がもったいない。
アジア大会4連覇に挑む野球韓国代表が、紆余曲折の末にグループB2位でスーパーラウンドに進出した。
グループA1位の中国、2位の日本をいずれも撃破してこそ、決勝に進むことができる。中国は常に「伏兵」とされ、日本は「宿敵」と分類されてきた。
ただ、グループステージで明らかになった戦力では、両試合とも確実に制することができるとは言い切れない。
初めて対戦する投手への“人見知り”もそうだが、試合が上手くいかないときに自分で解決する方法がわからないことが痛い。
グループ初戦の香港や最終戦のタイは、いわゆる「参加することに意味を置くチーム」と捉えられる。国内の社会人野球2部のチームと対戦して勝利したとしても、楽観視することが難しいのと同じレベルだ。
本来であれば、初戦からウォーミングアップをするようにプレーをすべきだったが、慌てる様子が試合中盤まで続いた。
球速120km台のストレートを投げる投手にはタイミングを合わせ辛い。選手たちは150km台の速球の攻略が身についているからだ。
人為的にスイングスピードを落とすことが難しければ、打席を活用することも突破口になり得る。
韓国の選手たちは習慣のように、バッターボックスの捕手側のライン際に立つことにこだわった。バットがホームプレートを過ぎた後にボールが飛んでくる場合も多く。無理に始動を遅くして手首を使うなど、悪い習慣も露呈した。
不振と不運が重なって気苦労が続いていたカン・ベクホ(24)は、10月3日のタイ戦の2打席目でようやく一歩ほど投手の方に移動し、糸口をつかんだ。
パク・ギョンス(39)など所属するKTウィズの先輩選手たちが、投手のタイプによって打席を活用する様子は見守っていたはずだが、いざ必要な場面で自分も応用できなかったのは残念な点だ。ほかの選手も似ている。
台湾戦も同じだ。相手の先発投手・林碰萊に対し3打席目まで解決策を見出せず、右往左往した。
2番手の古林睿煬は投球フォームだけで6種類もあった。右足を上げ、踏み返した弾力で投球動作を始めるときはストレート、自由な足を2回上げるとカーブ、クイックピッチでタイミングを奪う際はストレートなどが基本だったが、これさえも一定のパターンではなかった。
特殊な投球フォームを持つ投手に対しては、コースを絞ってヒットを狙う決断力が必要だ。あれこれと手を出していれば答えは出てこない。短期決戦であり、負ければ明日がないアジア大会だからだ。
ただ、韓国はまるでプロ野球のレギュラーシーズンのように「今日できなくても次打てば良い」という印象が強かった。
もはや身についてしまった習慣であり、短期決戦に必要な“選択と集中”に関して、コーチ陣が特に注文したことも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ほどだ。

アジア大会の野球は常に韓国、台湾、日本の三つ巴だった。なかでもプロの精鋭で構成された韓国は、いわゆる“ドリームチーム”と呼ばれた1998年バンコク大会から相手を圧倒し始めた。
しかしそこから2010年代中盤を過ぎて以降では、日本の最精鋭と対等なレベルから下がり始めた。それはオリンピックやWBCでもすでに証明されている。
相次ぐ惨敗劇に表向きは「国際競争力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するが、韓国プロ野球の競争力も担保できないのが現実だ。
監督はもちろん、“先輩”たちで構成される解説委員たちも、選手に苦言を呈することができない文化が定着した。
ずば抜けた外国人投手やエース投手が登板する日には正常だった手首や腰などの痛みを訴えるベテランも多く、1~2カ月程度レギュラーになれば、まるで自分が本当の1軍選手になったかのように錯覚する若手も多い。
不思議な文化が深く根付いてしまったことで、韓国野球は国際舞台でも“平凡なチーム”に転落した。現在のアジア大会でも、まさにその程度のレベルであることを強く証明している。
野球人自ら改善の意思がないのだから、平凡な水準であっても維持できれば幸いなのだろうか。
「더이상 인정할 수 밖에 없다」한국 야구가“평범 레벨”까지 전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아시아 대회】

초전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했다.객관적 전력으로 열세의 대만을 넘으려면 , 초전의 분위기가 중요했기 때문에다.
【사진】「일본의 구장 명물!」한국 절찬의 미녀 맥주 판매원
슈퍼 라운드를 거치고, 결승까지 진출하는 도정이 험한 것은 몰랐을 것이다.긴장감을 변명으로 하려면 “프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아깝다.
아시아 대회 4 연패에 도전하는 야구 한국 대표가, 우여곡절의 끝에 그룹 B2위로 슈퍼 라운드에 진출했다.
그룹 A1위의 중국, 2위의 일본을 모두 격파해야만,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중국은 항상 「복병」이라고 여겨져 일본은 「숙적」이라고 분류되어 왔다.
단지, 그룹 스테이지에서 밝혀진 전력으로는, 양시합 모두 확실히 억제할 수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처음으로 대전하는 투수에의“낯가림”도 그렇지만, 시합이 능숙하게 가지 않을 때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프다.
그룹 초전의 홍콩이나 최종전의 타이는, 이른바 「참가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팀」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국내의 사회인 야구 2부의 팀과 대전해 승리했다고 해도, 낙관시 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레벨이다.
구속 120 km대의 스트레이트를 던지는 투수에게는 타이밍을 맞추어 괴롭다.선수들은 150 km대의 속구의 공략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스윙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것이 어려우면, 타석을 활용하는 일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선수들은 습관과 같이, 타석의 포수측의 라인때에 서는 것에 구애되었다.버트가 홈 플레이트를 지난 후에 볼이 날아 오는 경우도 많이.무리하게 시동을 늦게 하고 손목을 사용하는 등, 나쁜 습관도 드러냈다.
부진과 불운이 겹치고 걱정이 계속 되고 있던 캔·베크호(24)는, 10월 3일의 타이전의 2 타석눈으로 간신히 한 걸음(정도)만큼 투수(분)편에 이동해, 실마리를 잡았다.
박·골스(39)등 소속하는 KT위즈의 선배 선수들이, 투수의 타입에 의해서 타석을 활용하는 님 아이는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 막상 필요한 장면에서 자신도 응용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인 점이다.다른 선수도 비슷하다.
2번째의 코바야시예양은 투구 폼만으로 6 종류도 있었다.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밟아 돌려준 탄력으로 투구 동작을 시작할 때는 스트레이트, 자유로운 다리를 2회 올리면 커브, 퀵 피치로 타이밍을 빼앗을 때는 스트레이트등이 기본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일정한 패턴은 아니었다.
특수한 투구 폼을 가지는 투수에 대해서는, 코스를 짜고 히트를 노리는 결단력이 필요하다.이것 저것 손을 대고 있으면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단기 결전이며, 지면 내일이 없는 아시아 대회이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은 마치 프로야구의 레귤러 시즌과 같이 「오늘로 나무 없어도 다음 치면 좋다」라고 하는 인상이 강했다.
이미 몸에 대해 버린 습관이며, 단기 결전에 필요한“선택과 집중”에 관해서, 코치진이 특히 주문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는 없을까 의심될 정도다.

아시아 대회의 야구는 항상 한국, 대만, 일본의 삼파였다.그 중에서도 프로의 정예로 구성된 한국은, 이른바 “드림 팀”으로 불린 1998년 방콕 대회로부터 상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2010년대 중반을 지난 이후에서는, 일본의 최정예와 대등한 레벨로부터 내리기 시작했다.그것은 올림픽이나 WBC에서도 벌써 증명되고 있다.
잇따르는 참패극에 공식상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프로 야구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감독은 물론, “선배”들로 구성되는 해설 위원들도, 선수에게 고언을 나타낼 수 없는 문화가 정착했다.
뛰어나게 우수한 외국인 투수나 에이스 투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정상적이었던 손목이나 허리등의 아픔을 호소하는 베테랑도 많아, 12개월 정도 레귤러가 되면, 마치 자신이 진짜 1군선수가 되었는지와 같이 착각하는 젊은이도 많다.
야구인 스스로 개선의 의사가 없으니까, 평범한 수준이어도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히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