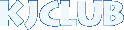30е№ҙгғҮгғ•гғ¬гҒ« вҖҳдёҠжҳҮж¬ІжұӮвҖҷ ж¶ҲгҒҲгҒҹж—Ҙжң¬дәәгҒҹгҒЎ[гӮ°гғӯгғјгғҗгғ«зҸҫе ҙ]
дё–з•ҢгҒ§дёҖз•ӘеҠӣз„ЎгҒ„ж—Ҙжң¬дјҡзӨҫе“ЎгҒҹгҒЎвҖҰвҖңеҸ—еӢ•зҡ„иӘ е®ҹгҒӮгӮӢгҒҢиҮӘзҷәзҡ„з©ҚжҘөжҖ§ж¬ гҒ‘гҒҰвҖқ
[гӮ°гғӯгғјгғҗгғ«зҸҫе ҙ]

вҖңж—Ҙжң¬дјҒжҘӯгӮүгҒҜгӮҒгҒЈгҒҹгҒ«еӢ•гҒ“гҒҶгҒЁжҖқгӮҸгҒӘгҒ„гғӘгӮ№гӮҜгҒҢгҒӮгӮҠгҒҫгҒҷ.вҖқ
2013е№ҙ 9жңҲдё–з•Ң 4еҸ°жҖқж…•гғ•гӮЎгғігғү(PEF) йҒӢз”ЁзӨҫгӮігғ«гғңгӮ°гӮҜгғ¬гғ“гӮ№гғӯгғңгғ„(KKR)гҒ®иЁӯз«ӢиҖ…гҒ§гҒӮгӮӢгғҳгғігғӘгӮҜгғ¬гғ“гӮ№гҒҜгӮўгғЎгғӘгӮ«гғӢгғҘгғјгғЁгғјгӮҜгӮ’иЁӘе•ҸгҒ—гҒҹAbeдҝЎжўқеҪ“жҷӮж—Ҙжң¬з·ҸзҗҶгҒ«гҒ“гӮ“гҒӘгҒ«иЁҖгҒЈгҒҹ.
AbeеүҚз·ҸзҗҶгҒҢгғӢгғҘвҲ’гғҰгғғгӮҜгӮәгғігӮ°гӮ°гӮ©гғігӮҙгғ¬гӮҪгҒ§ж„Ҹж°—жҸҡжҸҡгҒҷгӮӢгӮҲгҒҶгҒ« вҖңгғҗгӮӨгғһгӮӨгӮўгғҷгғҺвҲ’гғҹгғғгӮҜгӮ№(Buy my Abenomics)вҖқгҒЁиЁҖгҒ„гҒӘгҒҢгӮүж—Ҙжң¬жҠ•иіҮгӮ’еӢ§гӮҒгҒҹжҷӮж°ҙгӮ’е·®гҒ—гҒҹгӮҸгҒ‘гҒ . ж—Ҙжң¬гҒ®зөҢе–¶дәәгҒҹгҒЎгҒҢеӨұж•—гӮ’жҒҗгӮҢгҒҹгҒӮгҒ’гҒҸж§ӢйҖ ж”№йқ©гӮ’гғҹгғ«гҒ§гҒӮгӮӢгҒЁгҒ„гҒҶгҒ®гҒҢгӮҜгғ¬гғ“гӮ№иЁӯз«ӢиҖ…гҒҢиЁҖгҒЈгҒҹ вҖҳеӢ•гҒӢгҒӘгҒ„гғӘгӮ№гӮҜвҖҷгҒ гҒЈгҒҹ.
еӨўгӮӮгҒӘгҒҸгҒҰ, иҮӘеҲҶдё»ејөгӮӮгҒӘгҒҸгҒҰ
еҗҢжңҲж—Ҙжң¬гӮ’иЁӘе•ҸгҒ—гҒҰгӮӮгӮҜгғ¬гғ“гӮ№иЁӯз«ӢиҖ…гҒ®иӢҰиЁҖгҒҜгҒӨгҒӘгҒҢгҒЈгҒҹ. дёҖгӮӨгғігӮҝгғ“гғҘгғјгҒ§еҪјгҒҜ вҖңж—Ҙжң¬дәәгҒҹгҒЎгӮ’еҜҫиұЎгҒ§дё–и«–иӘҝжҹ»гӮ’гҒ—гҒҰиҰӢгҒҰгҒ»гҒ—гҒ„. е…ҲгҒ« вҖҳеӨўгҒҢгҒӮгӮҠгҒҫгҒҷгҒӢвҖҷ, ж¬ЎгҒҜ вҖҳеӨўгӮ’е®ҹзҸҫгҒҷгӮӢгҒҹгӮҒгҒ«иЎҢеӢ•гҒ—гҒҫгҒҷгҒӢвҖҷгҒЁе•ҸгҒЈгҒҰиҰӢгҒӘгҒ•гҒ„вҖқгҒЁиЁҖгҒЈгҒҹ.
гӮҜгғ¬гғ“гӮ№иЁӯз«ӢиҖ…гҒҜгӮӮгҒҶ 10е№ҙеүҚжҙ»еҠӣгӮ’еӨұгҒЈгҒҰиЎҢгҒҸж—Ҙжң¬гҒЁж—Ҙжң¬дәәгӮ’зӘҒгҒҚйҖҡгҒ—гҒҰиҰӢгҒҰгҒ„гҒҹгҒ®гҒ . еҺ»гӮӢ 5жңҲж—Ҙжң¬зөҢжёҲз”ЈжҘӯжҖ§гҒҢзҷәиЎЁгҒ—гҒҹжңӘжқҘдәәжүҚгғ“гӮёгғ§гғізҷҪжӣёгҒ«гӮҲгӮӢгҒЁ вҖҳе°ҶжқҘгҒ®еӨўгӮ’жҢҒгҒЈгҒҰгҒ„гӮӢвҖҷгҒЁиЁҖгҒҶж—Ҙжң¬гҒ® 18жӯій«ҳж Ўз”ҹгҒ®еүІеҗҲгҒҜ 60%гҒ§дё»иҰҒеӣҪгҒ®дёӯдёҖз•ӘдҪҺгҒӢгҒЈгҒҹ. дёӯеӣҪгҒЁгӮўгғЎгғӘгӮ«й«ҳж Ўз”ҹгҒ® 96%гҒЁ 94%дҪңгӮӢгҒ“гҒЁгӮ’жҢҒгҒЈгҒҰгҒ„гӮӢгҒЁгҒ„гҒҶгҒ“гҒЁгҒЁеҜҫз…§зҡ„гҒ гҒЈгҒҹ. йҹ“еӣҪгҒ® 18жӯійқ’е°‘е№ҙгӮӮ 82%дҪңгӮӢгҒ“гҒЁгӮ’жҢҒгҒЈгҒҰгҒ„гҒҹ.
вҖҳиҮӘеҲҶгҒҢеӣҪ家гҒЁзӨҫдјҡгӮ’еӨүгҒҲгӮӢгҒ“гҒЁгҒҢгҒ§гҒҚгӮӢвҖҷгҒЁиҝ”дәӢгҒ—гҒҹж—Ҙжң¬гҒ® 18жӯійқ’е°‘е№ҙгҒҜ 18%гҒ«йҒҺгҒҺгҒӘгҒӢгҒЈгҒҹ. гӮўгғЎгғӘгӮ«гҒЁдёӯеӣҪгҒҜ 66%, йҹ“еӣҪгҒҢ 40%гҒ гҒЈгҒҹ. дёӯй«ҳж ЎжҷӮд»ЈжңӘжқҘгҒ®йҖІи·ҜгӮ’жұәгӮҒгҒҹж—Ҙжң¬еӯҰз”ҹгҒҜ 3.8%гҒ«йҒҺгҒҺгҒӘгҒӢгҒЈгҒҹ. 66%гҒҢеӨ§еӯҰеҚ’жҘӯдәҲеӮҷз”ҹй ғгҒ§гҒҜе°ҶжқҘеёҢжңӣгӮ’жұәгӮҒгҒҹ. гӮўгғЎгғӘгӮ«гҒЁйҹ“еӣҪеӯҰз”ҹгҒ® 25.2%гҒЁ 17.8%гҒҢдёӯй«ҳж ЎжҷӮд»ЈгҒӢгӮүйҖІи·ҜгӮ’жұәгӮҒгҒҹгҒ“гҒЁгҒЁеҜҫз…§зҡ„гҒ гҒЈгҒҹ.
еҺ»гӮӢ 5жңҲжңқж—Ҙж–°иҒһгҒҢиӘӯиҖ…гҒҹгҒЎгӮ’еҜҫиұЎгҒ§е®ҹж–ҪгҒ—гҒҹгӮўгғігӮұгғјгғҲгҒ®иӘҝжҹ»зөҗжһңгӮӮдјјгҒҰгҒ„гӮӢ. вҖҳ(йқ’е°‘е№ҙжңҹе°ҶжқҘгҒ«) йЎ”гҒҢеЈІгӮҢгҒҹгҒӢгҒЈгҒҹгӮ“гҒ§гҒҷгҒӢвҖҷгҒЁиіӘе•ҸгҒ«еҝңзӯ”иҖ…гҒ® 73%гҒҢ вҖҳйЎ”гҒҢеЈІгӮҢгҒҹгҒҸгҒӘгҒӢгҒЈгҒҹвҖҷгҒЁиҝ”дәӢгҒ—гҒҹ. вҖҳзӣ®з«ӢгҒЎгҒҹгҒҸгҒӘгҒ„(820дәә)вҖҷ, вҖҳиҮӘеҲҶгҒ«гҒҜгҒқгӮ“гҒӘеҠӣгҒҢгҒӘгҒ„гҒЁжҖқгҒЈгҒҹ(564дәә)вҖҷ, вҖҳйЎ”гҒҢеЈІгӮҢгӮҢгҒ°иЎҢеӢ•гҒ«еҲ¶зҙ„гҒҢгҒІгҒ©гҒҸгҒӘгӮӢгӮҲгҒҶгҒ (541дәә)вҖҷ, вҖҳжіЁзӣ®гҒ•гӮҢгӮӢгҒ®гҒҢе«ҢгҒ„гҒ (535дәә)вҖҷ гҒӘгҒ©гҒ®зҗҶз”ұгҒ гҒЈгҒҹ.
вҖҳйЎ”гҒҢеЈІгӮҢгӮӢгҒ®гҒҜеҲ©зӣҠгҒ§гҒ—гӮҮгҒҶгҒӢвҖҷгҒЁгҒ„гҒҶе•ҸгҒ„гҒ« 70%гҒҢ вҖҳеҲ©зӣҠгҒЁгӮӮ, жҗҚе®ігҒЁгӮӮиҰӢгҒ«гҒҸгҒ„вҖҷ, 16%гҒҢ вҖҳжҗҚе®ігҒ вҖҷгҒЁиҝ”дәӢгҒ—гҒҹгҒЁгҒ“гӮҚгҒ«гӮӮз©ҚжҘөжҖ§гӮ’еӨұгҒЈгҒҰиЎҢгҒҸж—Ҙжң¬дәәгҒ®жҖ§еҗ‘гӮ’зўәиӘҚгҒҷгӮӢгҒ“гҒЁгҒҢгҒ§гҒҚгӮӢ.
ж—Ҙжң¬дәәгҒҹгҒЎгҒҜиҮӘеҲҶгҒ®ж„ҸиҰӢгӮ’еәғгҒ’гӮӢгҒ«гӮӮжҘөгӮҒгҒҰж¶ҲжҘөзҡ„гҒ . ж—Ҙжң¬жңҖеӨ§еәғе‘ҠдјҒз”»зӨҫгғҮгғігӮ№зі»еҲ—гҒ®гғҮгғігӮ№гӮҫгғігӮ°гғҸгғ–гғЁгғігӮ°гӮҪгҒЁIkedaзҢ®дёҖгғүгӮ·гӮ·гғЈгғҮж•ҷжҺҲгҒҢе…ұеҗҢгҒ§е®ҹж–ҪгҒ—гҒҹ вҖҳдё–з•ҢдҫЎеҖӨиҰігҒ®иӘҝжҹ»вҖҷгҒ§ вҖҳдёҚеЈІйҒӢеӢ•гҒ«еҸӮеҠ гҒ—гҒҹгҒ“гҒЁгҒҢгҒӮгӮӢвҖҷгҒЁиЁҖгҒҶж—Ҙжң¬дәәгҒҜ 1.9%гҒ гҒЈгҒҹ. 77еҖӢгҒ®иӘҝжҹ»еҜҫиұЎеӣҪгҒ®дёӯ 70дҪҚгҒ гҒЈгҒҹ.
1дҪҚгҒ®гӮўгӮӨгӮ№гғ©гғігғүдәәгҒҜ 35.2%, 2дҪҚгӮ№гӮҰгӮ§гғјгғҮгғідәәгҒҜ 23.5%гҒҢдёҚеЈІйҒӢеӢ•гҒ«еҸӮеҠ гҒ—гҒҹгҒ“гҒЁгҒҢгҒӮгҒЈгҒҹ. гӮўгғЎгғӘгӮ«дәәгӮӮ 5дәәгҒ®дёӯ 1еҗҚд»ҘдёҠ(21.5%)гҒҢдёҚеЈІйҒӢеӢ•гҒ«еҸӮеҠ гҒ—гҒҹ. вҖҳе№іе’Ңзҡ„гҒӘгғҮгғўгҒ«еҸӮеҠ гҒ—гҒҹгҒ“гҒЁгҒҢгҒӮгӮӢвҖҷгҒЁиЁҖгҒҶеӣһзӯ”гӮӮ 5.8%гҒ§ 69дҪҚгҒ«жӯўгӮҒгҒҹ. 15вҖҫ29жӯіж—Ҙжң¬иӢҘгҒ„дё–д»Ј 1500дәәгӮ’еҜҫиұЎгҒ§е®ҹж–ҪгҒ—гҒҹиӘҝжҹ»гҒ§гӮӮ 63.2%гҒҢ вҖҳзӨҫдјҡйҒӢеӢ•гҒ«еҸӮеҠ гҒ—гҒҹгҒ“гҒЁгҒҢгҒӘгҒ„вҖҷгҒЁиҝ”дәӢгҒ—гҒҹ. вҖҳйЎ”гӮ„еҗҚеүҚгҒҢзҸҫгӮҸгӮҢгӮӢгҒ®гҒ«жҠөжҠ—ж„ҹгҒҢгҒӮгӮӢ(22.2%)вҖҷгҒҢзӨҫдјҡйҒӢеӢ•гҒ«еҸӮеҠ гҒ—гҒӘгҒ„жңҖеӨ§гҒ®зҗҶз”ұгҒ гҒЈгҒҹ. вҖҳеҸӮеҠ гҒҷгӮӢзҹҘиӯҳгҒҢдёҚи¶ігҒ (21.6%)вҖҷгҒҜиҮӘдҝЎж„ҹдёҚи¶іеһӢгҒҢеҫҢгӮ’еј•гҒҚз¶ҷгҒ„гҒ .
20вҖҫ30еҸ°иӢҘиҖ…гҒҜ вҖҳгғҮгғўгҒҜзӨҫдјҡе…ЁдҪ“гҒ«иҝ·жғ‘гӮ’гҒӢгҒ‘гӮӢгҒ“гҒЁвҖҷгҒ гҒЁгҒӢ вҖҳгғҮгғўгҒҜиҮӘе·ұжәҖи¶ігӮ„еҖӢдәәзҡ„гҒӘжҒЁгҒҝгҒ§еҸӮеҠ гҒҷгӮӢгҒ“гҒЁвҖҷгҒЁгҒ„гҒҶеӣһзӯ”гҒҢ 50вҖҫ60%гҒ«йҒ”гҒ—гҒҹ.дјҡзӨҫе“ЎгӮӮз„Ўж°—еҠӣгҒ . дәәжүҚжғ…е ұдјҡзӨҫгҒ§гҒӮгӮӢгғ‘гӮҪгғ«гӮҫгғігӮ°гғҸгғ–гғЁгғігӮ°гӮҪгҒҢгӮўгӮёгӮўгғ»еӨӘе№іжҙӢ 14гғ¶еӣҪгҒ®дјҡзӨҫе“ЎгӮ’еҜҫиұЎгҒ§е®ҹж–ҪгҒ—гҒҹиӘҝжҹ»гҒ§ж—Ҙжң¬дәәгҒҹгҒЎгҒҜ вҖҳзҸҫеңЁгҒ®иҒ·е ҙгҒ§гҒҡгҒЈгҒЁеғҚгҒҚгҒҹгҒ„(52%)вҖҷгҒЁ вҖҳйӣўиҒ·(25%)гӮ„еүөжҘӯ(16%)гҒЁгҒҹгҒ„вҖҷгҒЁиЁҖгҒҶеҝңзӯ”иҖ…гҒ®еүІеҗҲгҒҢзҡҶжңҖдҪҺгҒ гҒЈгҒҹ.
ж—Ҙжң¬дјҡзӨҫе“ЎгҒҹгҒЎгҒҜд»ҠгҒҷгӮӢд»•дәӢгҒ«ж„ӣзқҖгӮӮгҒӘгҒ„гҒҢгҒқгӮҢгҒ§гӮӮдјҡзӨҫгӮ’и№ҙйЈӣгҒ°гҒ—гҒҰеҮәгҒҰж–°гҒ—гҒ„жҢ‘жҲҰгӮ’гҒ—гҒҰиҰӢгҒҹгҒ„гҒЁгҒ„гҒҶгӮЁгғҚгғ«гӮ®гғјгӮӮгҒӘгҒ„гҒЁиЁҖгҒҲгӮӢ.
еј•е°ҺгҒҜ вҖҳзҸҫеңЁгҒ®еӢӨеӢҷең°гҒ§гҒҡгҒЈгҒЁеғҚгҒҚгҒҹгҒ„вҖҷгҒЁиЁҖгҒҶеӣһзӯ”гҒҢ 86%гҒ«йҒ”гҒ—гҒҹ. дёӯеӣҪгҒЁгғҷгғҲгғҠгғ гҒҜ 80%гӮ’и¶ҠгҒҲгҒҹ. йҹ“еӣҪгғ»гӮ·гғігӮ¬гғқгғјгғ«гғ»еҸ°ж№ҫдјҡзӨҫе“ЎгҒ®зҙ„ 70%гӮӮ вҖҳзҸҫеңЁгҒ®иҒ·е ҙгӮ’зҷәгҒӨгҒӨгӮӮгӮҠгҒҢгҒӘгҒ„вҖҷгҒЁиҝ”дәӢгҒ—гҒҹ. дёҖж–№йҹ“еӣҪгҒ®дјҡзӨҫе“ЎгҒ®дёӯйӣўиҒ·гӮ„еүөжҘӯгӮ’еёҢжңӣгҒҷгӮӢеҝңзӯ”иҖ…гҒҜгҒқгӮҢгҒһгӮҢ 40%гҒЁ 30% ж°ҙжә–гҒ§ж—Ҙжң¬дјҡзӨҫе“ЎгҒ® 2еҖҚгҒ гҒЈгҒҹ.
гӮўгғЎгғӘгӮ«гӮ®гғЈгғӯгғғгғ—гҒ®еҫ“жҘӯе“ЎеӢӨеҠҙж„Ҹж¬І(гӮӨгғігӮІгӮӨгӮёгғўгғігғҲ) жҢҮж•°гҒ§гӮӮж—Ҙжң¬гҒҜ 5%гҒ§дё–з•Ң 139гғ¶еӣҪгҒ®дёӯ 132дҪҚгҒ гҒЈгҒҹ. дё–з•Ңе№іеқҮгҒҜ 20%, гӮўгғЎгғӘгӮ«гҒЁгӮ«гғҠгғҖгҒӘгҒ©еҢ—зұіең°еҹҹгҒҜ 34%гҒ гҒЈгҒҹ. гӮўгӮёгӮўеңҸгҒ§гҒҜгғўгғігӮҙгғ«гҒҢ 35%гҒ§дёҖз•Әй«ҳгҒӢгҒЈгҒҹ. дёӯеӣҪ(17%)гҒЁйҹ“еӣҪ(12%)гӮӮж—Ҙжң¬гҒ®дјҡзӨҫе“ЎгӮҲгӮҠеӢӨеҠҙж„Ҹж¬ІгҒҢ 2вҖҫ3еҖҚй«ҳгҒӢгҒЈгҒҹ.
ж—Ҙжң¬жңҖеӨ§дәәжүҚжғ…е ұдјҡзӨҫгҒ§гҒӮгӮӢгғӘгӮҜгғ«гғјгғҲгҒҜ вҖҳж—Ҙжң¬дәәгҒ«еҸ—еӢ•зҡ„гҒӘиӘ е®ҹгҒҜгҒӮгҒЈгҒҰгӮӮиҮӘзҷәзҡ„гҒӘз©ҚжҘөжҖ§гҒҜж¬ гҒ‘гҒҰгҒ„гӮӢвҖҷгҒЁеҲҶжһҗгҒ—гҒҹ.
дё»иҰҒеӣҪгҒ®дёӯдёҖз•ӘйҒ…гҒ„жҳҮйҖІгҒҢеӢӨеҠҙж„Ҹж¬ІгӮ’иҗҪгҒЁгҒҷиҰҒеӣ гҒ®дёӯдёҖгҒӨгҒ«жҢҮж‘ҳгҒ•гӮҢгӮӢ. ж—Ҙжң¬дјҡзӨҫе“ЎгҒҹгҒЎгҒ®иӘІй•·йҖІзҙҡе№ҙйҪўгҒҜе№іеқҮ 38.6жӯі, йғЁй•·гҒҜ 44жӯігҒ гҒЈгҒҹ. дёӯеӣҪгҒҜ 28.5жӯігҒ«иӘІй•·, 29.8жӯігҒ«йғЁй•·гҒ«жҳҮйҖІгҒ—гҒҹ. гӮўгғЎгғӘгӮ«гӮӮ 34.6жӯігҒӘгӮүиӘІй•·гҒ«гҒӘгҒЈгҒҰ 37.2жӯігҒ«йғЁй•·еёӯгӮ’еҚ гӮҒгҒҹ.
гҒӘгҒҠгҒ•гӮүеғҚгҒҸж„Ҹж¬ІгҒҢгҒӘгҒ„гҒ®гҒ«жҳҮйҖІгҒҫгҒ§йҒ…гҒ„гҒӢгӮүиҮӘеҲҶгҒ®е•“зҷәгҒ«з©ҚжҘөзҡ„гҒӘзҗҶз”ұгӮӮгҒӘгҒӢгҒЈгҒҹ. вҖҳдҪ•гҒ®иҮӘеҲҶгҒ®е•“зҷәгӮ’гҒ—гҒҰгҒ„гҒӘгҒ„вҖҷгҒЁиЁҖгҒҶж—Ҙжң¬гҒ®дјҡзӨҫе“ЎгҒ®еүІеҗҲгҒҜ 46%гҒ§дё»иҰҒеӣҪгҒ®дёӯдёҖз•Әй«ҳгҒӢгҒЈгҒҹ. йҹ“еӣҪгҒҜзҙ„ 15%, гғҷгғҲгғҠгғ гҒҜ 2%гҒ«йҒҺгҒҺгҒӘгҒӢгҒЈгҒҹ. гҒ»гҒЁгӮ“гҒ©гҒҷгҒ№гҒҰгҒ®гғҷгғҲгғҠгғ гҒЁйҹ“еӣҪгҒ®дјҡзӨҫе“ЎгҒҹгҒЎгҒҢйҖҖеӢӨеҫҢгҒ«гӮӮиҮӘеҲҶгҒ®иғҪеҠӣй–ӢзҷәгҒ®гҒҹгӮҒгҒ«еӯҰйҷўгӮ’йҖҡгҒҶгҒЁгҒӢдҪ•гҒӢгӮ’еӯҰгҒ¶гҒЁгҒ„гҒҶж„Ҹе‘ігҒ .
иҒ·е“ЎжҠ•иіҮгҒ«гҒ‘гҒЎиҮӯгҒ„ж—Ҙжң¬дјҒжҘӯгӮү
иҒ·е“ЎгҒҹгҒЎгҒ«еҜҫгҒҷгӮӢжҠ•иіҮгҒ«жҘөеәҰгҒ«гҒ‘гҒЎиҮӯгҒ„ж—Ҙжң¬дјҒжҘӯгҒ®йўЁеңҹгҒҜж—Ҙжң¬дәәгӮ’гӮӮгҒЈгҒЁз„Ўж°—еҠӣгҒ«гҒ•гҒӣгҒҰгҒ„гӮӢгҒЁгҒ„гҒҶжҢҮж‘ҳгҒ . еӣҪеҶ…з·Ҹз”ҹз”Ј(GDP) еӮҷгҒҲдјҒжҘӯгҒ®дәәжүҚжҠ•иіҮиҰҸжЁЎгҒҜгӮўгғЎгғӘгӮ«гҒҢ 1995вҖҫ1999е№ҙ 1.94%гҒӢгӮү 2010вҖҫ2014е№ҙ 2.08%гҒ§еў—гҒҲгҒҹ. гғ•гғ©гғігӮ№(1.78%)гҒЁгғүгӮӨгғ„(1.20%), гӮӨгӮҝгғӘгӮў(1.09%) гҒӘгҒ©гӮӮ 15е№ҙеүҚгҒЁдјјгҒҰгҒ„гӮӢж°ҙжә–гӮ’з¶ӯжҢҒгҒ—гҒҹ. дёҖж–№ж—Ҙжң¬дјҒжҘӯгӮүгҒҜ 1995вҖҫ1999е№ҙ GDPгҒ® 0.41%гҒ«йҒҺгҒҺгҒӘгҒӢгҒЈгҒҹдәәжүҚжҠ•иіҮиҰҸжЁЎгӮ’ 2010вҖҫ2014е№ҙ 0.1%гҒ§гӮӮгҒЈгҒЁжёӣгӮүгҒ—гҒҹ.
ж—Ҙжң¬гҒ®зөҢе–¶дәәгҒҹгҒЎгҒҢз„Ўж°—еҠӣгҒӘиҒ·е“ЎгҒҹгҒЎгӮ’зқЈеҠұгҒҷгӮӢгҒ“гҒЁгҒ§гӮӮгҒӘгҒ„. 競дәүгҒ§жҠјгҒ•гӮҢгҒҹзө„з№”е“ЎгӮ„дёҚжҢҜгҒӘдәӢжҘӯйғЁгӮ’жһңж•ўгҒ«ж•ҙзҗҶгҒҷгӮӢгҒ“гҒЁгҒҢгҒ§гҒҚгҒӘгҒ„жё©жғ…дё»зҫ©гҒҢеј·гҒ„гҒӢгӮүгҒ . гҒқгӮҢгҒ§гӮӮдёҚжҢҜгҒӘдәәжүҚгҒЁдәӢжҘӯгӮ’жң¬ж°—гӮ’гҒӨгҒҸгҒ—гҒҰиӮІгҒҰгӮӢгҒ“гҒЁгӮӮгҒ§гҒҚгҒӘгҒ„гҒӢгӮүзөҢе–¶иіҮжәҗгҒ®еҲҶй…ҚгҒҢжҲҗгӮҠз«ӢгҒҹгҒӘгҒ„гҒЁгҒ„гҒҶжҢҮж‘ҳгҒ .
ItoгӮ°гғӢгӮӘгғ’гғҲгӮ№гғҗгӮ·гғҮ CFOж•ҷиӮІз ”究гӮ»гғігӮҝгғје ҙгҒҜ вҖңж—Ҙжң¬гҒ®зөҢе–¶дәәгҒҹгҒЎгҒҢ вҖҳдәәиүҜгҒ„вҖҷгҒЁиЁҖгҒҶиЁҖи‘үгҒ®ж„Ҹе‘ігӮ’йҒҺгҒЎзҗҶи§ЈгҒҷгӮӢгҒӢгӮүвҖқгҒЁиЁҖгҒЈгҒҹ. дәӢжҘӯгҒҜгҒҫгҒҷгҒҫгҒҷиЎ°йҖҖгҒҷгӮӢгҒ®гҒ«зӨҫе“ЎгҒҜ вҖҳгӮ¬гӮӨй«ҳзӮүгҒ®жҷӮ(зӣҠдҪ“гӮӮгҒӘгҒ„дәәгӮ’и§ЈйӣҮгҒ—гҒӘгҒ„гҒ§дёҖз”ҹйӣҮгҒ„)вҖҷ зҠ¶ж…ӢгҒ«гҒӘгҒЈгҒҰдјҡзӨҫгҒЁиҒ·е“ЎзҡҶгҒ«еҲ©еҫ—гҒ«гҒӘгӮүгҒӘгҒ„зҠ¶жіҒгҒЁгҒ„гҒҶиӘ¬жҳҺгҒ .
вҖңеӨ§йғЁеҲҶгҒ®ж—Ҙжң¬дјҒжҘӯгҒ§гҒ“гӮ“гҒӘгҒ«з„Ўж°—еҠӣгҒӘзҠ¶ж…ӢгҒҢгӮӘгғ¬гғғй–“з¶ҡгҒ„гҒҹзөҗжһңд»Ҡж—Ҙж—Ҙжң¬гҒҢжӯЈдҪ“зҠ¶ж…ӢгҒ«йҷ·гҒЈгҒҹгҒ“гҒЁвҖқгҒЁItoгӮ»гғігӮҝгғје ҙгҒҜеҲҶжһҗгҒ—гҒҹ.
第2ж¬Ўдё–з•ҢеӨ§жҲҰж•—жҲҰзӣҙеҫҢзҒ°зҮјгҒӢгӮүгӮҸгҒҡгҒӢ 30дҪҷе№ҙгҒ¶гӮҠгҒ«дё–з•Ң 2дҪҚзөҢжёҲеҜҫеұҖгҒ§з«ӢгҒЎдёҠгҒҢгҒЈгҒҹж—Ҙжң¬дәәгҒҹгҒЎгҒҜгҒ©гҒҶгҒ—гҒҰгҒ“гӮ“гҒӘгҒ«з„Ўж°—еҠӣгҒ«гҒӘгҒЈгҒҹгҒ гӮҚгҒҶгҒӢ. еӨҡгҒҸгҒ®е°Ӯй–Җ家гҒҹгҒЎгҒҜгғҮгғ•гғ¬гғјгӮ·гғ§гғігӮ’дё»гҒӘеҺҹеӣ гҒ®дёӯдёҖгҒӨгҒ§жҢҮж‘ҳгҒҷгӮӢ. 20е№ҙд»ҘдёҠжүҖеҫ—гӮӮ, зү©дҫЎгӮӮдёҠгҒҢгӮүгҒӘгҒ„гғҮгғ•гғ¬гғјгӮ·гғ§гғігҒ®зӨҫдјҡгҒҢгҒІгҒЁгҒЁгҒҚж—Ҙжң¬дәәгҒ®еҶ…йқўгҒ§зҮғгҒҲгҒҹдёҠжҳҮж„Ҹж¬ІгӮ’еҺ»еӢўгҒ•гҒӣгҒҹгҒЁгҒ„гҒҶгҒ®гҒ .
FukagawaYukikoж—©зЁІз”°еӨ§зөҢжёҲеӯҰ科ж•ҷжҺҲгҒҜ вҖңжңҲзөҰгҒҢгӮҲгҒҸдёҠгҒҢгӮӢгӮҲгӮҠзөӮиә«йӣҮз”ЁгҒҢдҝқйҡңгҒ•гӮҢгӮӢиҒ·е ҙгӮ’зө¶еҜҫзҡ„гҒ«еҘҪгӮҖзӮ№гҒҜжҳ”гӮӮд»ҠгӮӮеӨүгӮҸгӮҠгҒҢгҒӘгҒ„вҖқгҒЁ вҖңж§ӢжҲҗе“ЎгҒ®дёҠжҳҮж„Ҹж¬ІгӮ’ж¶ҲгҒҲгӮӢгӮҲгҒҶгҒ«гҒҷгӮӢгҒ“гҒЁгҒ“гҒқгғҮгғ•гғ¬гҒ®жҒҗгӮҚгҒ—гҒ•вҖқгҒЁиЁҖгҒЈгҒҹ.
30л…„ л””н”Ңл Ҳм—җ вҖҳмғҒмҠ№ мҡ•кө¬вҖҷ мӮ¬лқјм§„ мқјліёмқёл“Ө[кёҖлЎңлІҢ нҳ„мһҘ]
м„ёкі„м—җм„ң к°ҖмһҘ л¬ҙл Ҙн•ң мқјліё м§ҒмһҘмқёл“ӨвҖҰвҖңмҲҳлҸҷм Ғ м„ұмӢӨн•Ё мһҲм§Җл§Ң мһҗл°ңм Ғ м Ғк·№м„ұ кІ°м—¬лҸјвҖқ
[кёҖлЎңлІҢ нҳ„мһҘ]

вҖңмқјліё кё°м—…л“ӨмқҖ мўҖмІҳлҹј мӣҖм§Ғмқҙл Өкі н•ҳм§Җ м•ҠлҠ” лҰ¬мҠӨнҒ¬к°Җ мһҲмҠөлӢҲлӢӨ.вҖқ
2013л…„ 9мӣ” м„ёкі„ 4лҢҖ мӮ¬лӘЁнҺҖл“ң(PEF) мҡҙмҡ©мӮ¬ мҪңлІ„к·ёнҒ¬лһҳ비мҠӨлЎңлІ„мё (KKR)мқҳ м„ӨлҰҪмһҗмқё н—ЁлҰ¬ нҒ¬лһҳ비мҠӨлҠ” лҜёкөӯ лүҙмҡ•мқ„ л°©л¬ён•ң м•„лІ мӢ мЎ° лӢ№мӢң мқјліё мҙқлҰ¬м—җкІҢ мқҙл ҮкІҢ л§җн–ҲлӢӨ.
м•„лІ м „ мҙқлҰ¬к°Җ лүҙмңЎмҰқк¶Ңкұ°лһҳмҶҢм—җм„ң мқҳкё°м–‘м–‘н•ҳкІҢ вҖңл°”мқҙ л§Ҳмқҙ м•„лІ л…ёлҜ№мҠӨ(Buy my Abenomics)вҖқлқјл©° мқјліё нҲ¬мһҗлҘј к¶Ңн•ҳлҚҳ л•Ң м°¬л¬јмқ„ лҒјм–№мқҖ м…ҲмқҙлӢӨ. мқјліёмқҳ кІҪмҳҒмқёл“Өмқҙ мӢӨнҢЁлҘј л‘җл ӨмӣҢн•ң лӮҳлЁём§Җ кө¬мЎ° к°ңнҳҒмқ„ лҜёлЈЁкі мһҲлӢӨлҠ” кІҢ нҒ¬лһҳ비мҠӨ м„ӨлҰҪмһҗк°Җ л§җн•ң вҖҳмӣҖм§Ғмқҙм§Җ м•ҠлҠ” лҰ¬мҠӨнҒ¬вҖҷмҳҖлӢӨ.
кҝҲлҸ„ м—Ҷкі , мһҗкё°мЈјмһҘлҸ„ м—Ҷкі
к°ҷмқҖ лӢ¬ мқјліёмқ„ л°©л¬ён•ҙм„ңлҸ„ нҒ¬лһҳ비мҠӨ м„ӨлҰҪмһҗмқҳ м“ҙмҶҢлҰ¬лҠ” мқҙм–ҙмЎҢлӢӨ. н•ң мқён„°л·°м—җм„ң к·ёлҠ” вҖңмқјліёмқёл“Ө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м—¬лЎ мЎ°мӮ¬лҘј н•ҙ ліҙкёё л°”лһҖлӢӨ. лЁјм Җ вҖҳкҝҲмқҙ мһҲмҠөлӢҲк№ҢвҖҷ, лӢӨмқҢмқҖ вҖҳкҝҲмқ„ мӢӨнҳ„н•ҳкё° мң„н•ҙ н–үлҸҷн•©лӢҲк№ҢвҖҷлқјкі л¬јм–ҙліҙлқјвҖқкі н–ҲлӢӨ.
нҒ¬лһҳ비мҠӨ м„ӨлҰҪмһҗлҠ” мқҙлҜё 10л…„ м „ нҷңл Ҙмқ„ мһғм–ҙ к°ҖлҠ” мқјліёкіј мқјліёмқёмқ„ кҝ°лҡ«м–ҙ ліҙкі мһҲм—ҲлҚҳ кІғмқҙлӢӨ. м§ҖлӮң 5мӣ” мқјліё кІҪм ңмӮ°м—…м„ұмқҙ л°ңн‘ңн•ң лҜёлһҳ мқёмһ¬ л№„м „ л°ұм„ңм—җ л”°лҘҙл©ҙ вҖҳмһҘлһҳмқҳ кҝҲмқ„ к°–кі мһҲлӢӨвҖҷлҠ” мқјліёмқҳ 18м„ё кі көҗмғқмқҳ 비мңЁмқҖ 60%лЎң мЈјмҡ”көӯ к°ҖмҡҙлҚ° к°ҖмһҘ лӮ®м•ҳлӢӨ. мӨ‘көӯкіј лҜёкөӯ кі көҗмғқмқҳ 96%мҷҖ 94%к°Җ кҝҲмқ„ к°–кі мһҲлӢӨлҠ” кІғкіј лҢҖмЎ°м Ғмқҙм—ҲлӢӨ. н•ңкөӯмқҳ 18м„ё мІӯмҶҢл…„лҸ„ 82%к°Җ кҝҲмқ„ к°–кі мһҲм—ҲлӢӨ.
вҖҳмһҗмӢ мқҙ көӯк°ҖмҷҖ мӮ¬нҡҢлҘј л°”кҝҖмҲҳ мһҲлӢӨвҖҷкі лӢөн•ң мқјліёмқҳ 18м„ё мІӯмҶҢл…„мқҖ 18%м—җ л¶Ҳкіјн–ҲлӢӨ. лҜёкөӯкіј мӨ‘көӯмқҖ 66%, н•ңкөӯмқҙ 40%мҳҖлӢӨ. мӨ‘кі көҗ мӢңм Ҳ лҜёлһҳмқҳ 진лЎңлҘј кІ°м •н•ң мқјліё н•ҷмғқмқҖ 3.8%м—җ л¶Ҳкіјн–ҲлӢӨ. 66%к°Җ лҢҖн•ҷ мЎём—…л°ҳ мҰҲмқҢм—җм„ңм•ј мһҘлһҳ нқ¬л§қмқ„ м •н–ҲлӢӨ. лҜёкөӯкіј н•ңкөӯ н•ҷмғқмқҳ 25.2%мҷҖ 17.8%к°Җ мӨ‘кі көҗ мӢңм Ҳл¶Җн„° 진лЎңлҘј м •н•ң кІғкіј лҢҖмЎ°м Ғмқҙм—ҲлӢӨ.
м§ҖлӮң 5мӣ” м•„мӮ¬нһҲмӢ л¬ёмқҙ лҸ…мһҗл“Ө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мӢӨмӢңн•ң м„Өл¬ё мЎ°мӮ¬ кІ°кіјлҸ„ 비мҠ·н•ҳлӢӨ. вҖҳ(мІӯмҶҢл…„кё° мһҘлһҳм—җ) мң лӘ…н•ҙм§Җкі мӢ¶м—ҲмҠөлӢҲк№ҢвҖҷлқјкі м§Ҳл¬ём—җ мқ‘лӢөмһҗмқҳ 73%к°Җ вҖҳмң лӘ…н•ҙм§Җкі мӢ¶м§Җ м•Ҡм•ҳлӢӨвҖҷкі лӢөн–ҲлӢӨ. вҖҳлҲҲм—җ лқ„кі мӢ¶м§Җ м•ҠлӢӨ(820лӘ…)вҖҷ, вҖҳмһҗмӢ м—җкІҗ к·ёлҹҙ нһҳмқҙ м—ҶлӢӨкі мғқк°Ғн–ҲлӢӨ(564лӘ…)вҖҷ, вҖҳмң лӘ…н•ҙм§Җл©ҙ н–үлҸҷм—җ м ңм•Ҫмқҙ мӢ¬н•ҙм§Ҳ кІғ к°ҷлӢӨ(541лӘ…)вҖҷ, вҖҳмЈјлӘ©л°ӣлҠ” кІғмқҙ мӢ«лӢӨ(535лӘ…)вҖҷ л“ұмқҳ мқҙмң мҳҖлӢӨ.
вҖҳмң лӘ…н•ҙм§ҖлҠ” кұҙ мқҙмқөмқјк№Ңмҡ”вҖҷлқјлҠ” л¬јмқҢм—җ 70%к°Җ вҖҳмқҙмқөмқҙлқјкі лҸ„, мҶҗн•ҙлқјкі лҸ„ ліҙкё° м–ҙл өлӢӨвҖҷ, 16%к°Җ вҖҳмҶҗн•ҙлӢӨвҖҷлқјкі лӢөн•ң лҚ°м„ңлҸ„ м Ғк·№м„ұмқ„ мһғм–ҙ к°ҖлҠ” мқјліёмқёмқҳ м„ұн–Ҙмқ„ нҷ•мқён• мҲҳ мһҲлӢӨ.
мқјліёмқёл“ӨмқҖ мһҗмӢ мқҳ мқҳкІ¬мқ„ нҺјм№ҳлҠ” лҚ°лҸ„ м§Җк·№нһҲ мҶҢк·№м ҒмқҙлӢӨ. мқјліё мөңлҢҖ кҙ‘кі кё°нҡҚмӮ¬ лҚҙм“° кі„м—ҙмқҳ лҚҙм“°мў…н•©м—°кө¬мҶҢмҷҖ мқҙмјҖлӢӨ кІҗмқҙм№ҳ лҸ„мӢңмғӨлҢҖ көҗмҲҳк°Җ кіөлҸҷмңјлЎң мӢӨмӢңн•ң вҖҳм„ёкі„ к°Җм№ҳкҙҖ мЎ°мӮ¬вҖҷм—җм„ң вҖҳл¶Ҳл§Ө мҡҙлҸҷм—җ м°ёк°Җн•ң м Ғмқҙ мһҲлӢӨвҖҷлҠ” мқјліёмқёмқҖ 1.9%мҳҖлӢӨ. 77к°ң мЎ°мӮ¬ лҢҖмғҒкөӯ к°ҖмҡҙлҚ° 70мң„мҳҖлӢӨ.
1мң„мқё м•„мқҙмҠ¬лһңл“ңмқёмқҖ 35.2%, 2мң„ мҠӨмӣЁлҚҙмқёмқҖ 23.5%к°Җ л¶Ҳл§Ө мҡҙлҸҷм—җ м°ёк°Җн•ң м Ғмқҙ мһҲм—ҲлӢӨ. лҜёкөӯмқёлҸ„ 5лӘ… к°ҖмҡҙлҚ° 1лӘ… мқҙмғҒ(21.5%)мқҙ л¶Ҳл§Ө мҡҙлҸҷм—җ м°ём—¬н–ҲлӢӨ. вҖҳнҸүнҷ”м Ғмқё лҚ°лӘЁм—җ м°ёк°Җн•ң м Ғмқҙ мһҲлӢӨвҖҷлҠ” мқ‘лӢөлҸ„ 5.8%лЎң 69мң„м—җ к·ёміӨлӢӨ. 15~29м„ё мқјліё м ҠмқҖ м„ёлҢҖ 1500лӘ…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мӢӨмӢңн•ң мЎ°мӮ¬м—җм„ңлҸ„ 63.2%к°Җ вҖҳмӮ¬нҡҢ мҡҙлҸҷм—җ м°ём—¬н•ң м Ғмқҙ м—ҶлӢӨвҖҷкі лӢөн–ҲлӢӨ. вҖҳм–јкөҙмқҙлӮҳ мқҙлҰ„мқҙ л“ңлҹ¬лӮҳлҠ”лҚ° м Җн•ӯк°җмқҙ мһҲлӢӨ(22.2%)вҖҷк°Җ мӮ¬нҡҢ мҡҙлҸҷм—җ м°ём—¬н•ҳм§Җ м•ҠлҠ” к°ҖмһҘ нҒ° мқҙмң мҳҖлӢӨ. вҖҳм°ёк°Җн• м§ҖмӢқмқҙ л¶ҖмЎұн•ҳлӢӨ(21.6%)вҖҷлҠ” мһҗмӢ к°җ л¶ҖмЎұнҳ•мқҙ л’ӨлҘј мқҙм—ҲлӢӨ.
20~30лҢҖ м ҠмқҖмёөмқҖ вҖҳлҚ°лӘЁлҠ” мӮ¬нҡҢ м „мІҙм—җ нҸҗлҘј лҒјм№ҳлҠ” кІғвҖҷмқҙлқјкұ°лӮҳ вҖҳлҚ°лӘЁлҠ” мһҗкё°л§ҢмЎұмқҙлӮҳ к°ңмқём Ғмқё мӣҗн•ңмңјлЎң м°ёк°Җн•ҳлҠ” кІғвҖҷмқҙлқјлҠ” мқ‘лӢөмқҙ 50~60%м—җ лӢ¬н–ҲлӢӨ.м§ҒмһҘмқёлҸ„ л¬ҙкё°л Ҙн•ҳлӢӨ. мқёмһ¬ м •ліҙ нҡҢмӮ¬мқё нҢҢмҶ”мў…н•©м—°кө¬мҶҢк°Җ м•„мӢңм•„В·нғңнҸүм–‘ 14к°ңкөӯмқҳ м§ҒмһҘмқё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мӢӨмӢңн•ң мЎ°мӮ¬м—җм„ң мқјліёмқёл“ӨмқҖ вҖҳнҳ„мһ¬мқҳ м§ҒмһҘм—җм„ң кі„мҶҚ мқјн•ҳкі мӢ¶лӢӨ(52%)вҖҷмҷҖ вҖҳмқҙм§Ғ(25%)мқҙлӮҳ м°Ҫм—…(16%)н•ҳкі мӢ¶лӢӨвҖҷлҠ” мқ‘лӢөмһҗмқҳ 비мңЁмқҙ лӘЁл‘җ мөңм ҖмҳҖлӢӨ.
мқјліё м§ҒмһҘмқёл“ӨмқҖ м§ҖкёҲ н•ҳлҠ” мқјм—җ м• м°©лҸ„ м—Ҷм§Җл§Ң к·ёл ҮлӢӨкі нҡҢмӮ¬лҘј л°•м°Ёкі лӮҳк°Җ мғҲлЎңмҡҙ лҸ„м „мқ„ н•ҙліҙкі мӢ¶лӢӨлҠ” м—җл„Ҳм§ҖлҸ„ м—ҶлҠ” м…ҲмқҙлӢӨ.
мқёлҸ„лҠ” вҖҳнҳ„мһ¬мқҳ к·јл¬ҙм§Җм—җм„ң кі„мҶҚ мқјн•ҳкі мӢ¶лӢӨвҖҷлҠ” мқ‘лӢөмқҙ 86%м—җ лӢ¬н–ҲлӢӨ. мӨ‘көӯкіј лІ нҠёлӮЁмқҖ 80%лҘј л„ҳм—ҲлӢӨ. н•ңкөӯВ·мӢұк°ҖнҸ¬лҘҙВ·лҢҖл§Ң м§ҒмһҘмқёмқҳ м•Ҫ 70%лҸ„ вҖҳнҳ„мһ¬мқҳ м§ҒмһҘмқ„ л– лӮ мғқк°Ғмқҙ м—ҶлӢӨвҖҷкі лӢөн–ҲлӢӨ. н•ңнҺё н•ңкөӯмқҳ м§ҒмһҘмқё к°ҖмҡҙлҚ° мқҙм§ҒмқҙлӮҳ м°Ҫм—…мқ„ нқ¬л§қн•ҳлҠ” мқ‘лӢөмһҗлҠ” к°Ғк°Ғ 40%мҷҖ 30% мҲҳмӨҖмңјлЎң мқјліё м§ҒмһҘмқёмқҳ 2л°°мҳҖлӢӨ.
лҜёкөӯ к°ӨлҹҪмқҳ мў…м—…мӣҗ к·јлЎңмқҳмҡ•(мқёкІҢмқҙм§ҖлЁјнҠё) м§ҖмҲҳм—җм„ңлҸ„ мқјліёмқҖ 5%лЎң м„ёкі„ 139к°ңкөӯ к°ҖмҡҙлҚ° 132мң„мҳҖлӢӨ. м„ёкі„ нҸүк· мқҖ 20%, лҜёкөӯкіј мәҗлӮҳлӢӨ л“ұ л¶ҒлҜё м§Җм—ӯмқҖ 34%мҳҖлӢӨ. м•„мӢңм•„к¶Ңм—җм„ңлҠ” лӘҪкіЁмқҙ 35%лЎң к°ҖмһҘ лҶ’м•ҳлӢӨ. мӨ‘көӯ(17%)кіј н•ңкөӯ(12%)лҸ„ мқјліёмқҳ м§ҒмһҘмқёліҙлӢӨ к·јлЎң мқҳмҡ•мқҙ 2~3л°° лҶ’м•ҳлӢӨ.
мқјліё мөңлҢҖ мқёмһ¬ м •ліҙ нҡҢмӮ¬мқё лҰ¬нҒ¬лЈЁнҠёлҠ” вҖҳмқјліёмқём—җкІҢ мҲҳлҸҷм Ғмқё м„ұмӢӨн•ЁмқҖ мһҲм–ҙлҸ„ мһҗл°ңм Ғмқё м Ғк·№м„ұмқҖ кІ°м—¬лҸј мһҲлӢӨвҖҷкі л¶„м„қн–ҲлӢӨ.
мЈјмҡ”көӯ к°ҖмҡҙлҚ° к°ҖмһҘ лҠҗлҰ° мҠ№м§„мқҙ к·јлЎң мқҳмҡ•мқ„ л–Ём–ҙлңЁлҰ¬лҠ” мҡ”мқё к°ҖмҡҙлҚ° н•ҳлӮҳлЎң м§Җм ҒлҗңлӢӨ. мқјліё м§ҒмһҘмқёл“Өмқҳ кіјмһҘ 진кёү м—°л №мқҖ нҸүк· 38.6м„ё, л¶ҖмһҘмқҖ 44м„ёмҳҖлӢӨ. мӨ‘көӯмқҖ 28.5м„ём—җ кіјмһҘ, 29.8м„ём—җ л¶ҖмһҘмңјлЎң мҠ№м§„н–ҲлӢӨ. лҜёкөӯлҸ„ 34.6м„ёл©ҙ кіјмһҘмқҙ лҗҳкі 37.2м„ём—җ л¶ҖмһҘ мһҗлҰ¬лҘј кҝ°м°јлӢӨ.
к°Җлң©мқҙлӮҳ мқјн• мқҳмҡ•мқҙ м—ҶлҠ”лҚ° мҠ№м§„к№Ңм§Җ лҠҗлҰ¬лӢҲ мһҗкё° кі„л°ңм—җ м Ғк·№м Ғмқј мқҙмң лҸ„ м—Ҷм—ҲлӢӨ. вҖҳлі„лӢӨлҘё мһҗкё° кі„л°ңмқ„ н•ҳкі мһҲм§Җ м•ҠлӢӨвҖҷлҠ” мқјліёмқҳ м§ҒмһҘмқё 비мңЁмқҖ 46%лЎң мЈјмҡ”көӯ к°ҖмҡҙлҚ° к°ҖмһҘ лҶ’м•ҳлӢӨ. н•ңкөӯмқҖ м•Ҫ 15%, лІ нҠёлӮЁмқҖ 2%м—җ л¶Ҳкіјн–ҲлӢӨ. кұ°мқҳ лӘЁл“ лІ нҠёлӮЁкіј н•ңкөӯмқҳ м§ҒмһҘмқёл“Өмқҙ нҮҙк·ј нӣ„м—җлҸ„ мһҗмӢ мқҳ лҠҘл Ҙ к°ңл°ңмқ„ мң„н•ҙ н•ҷмӣҗмқ„ лӢӨлӢҲкұ°лӮҳ лӯ”к°ҖлҘј л°°мҡҙлӢӨлҠ” лң»мқҙлӢӨ.
м§Ғмӣҗ нҲ¬мһҗм—җ мқёмғүн•ң мқјліё кё°м—…л“Ө
м§Ғмӣҗл“Өм—җ лҢҖн•ң нҲ¬мһҗм—җ к·№лҸ„лЎң мқёмғүн•ң мқјліё кё°м—…мқҳ н’ҚнҶ лҠ” мқјліёмқёмқ„ лҚ”мҡұ л¬ҙкё°л Ҙн•ҳкІҢ л§Ңл“Өкі мһҲлӢӨлҠ” м§Җм ҒмқҙлӢӨ. көӯлӮҙмҙқмғқмӮ°(GDP) лҢҖ비 кё°м—…мқҳ мқёмһ¬ нҲ¬мһҗ к·ңлӘЁлҠ” лҜёкөӯмқҙ 1995~1999л…„ 1.94%м—җм„ң 2010~2014л…„ 2.08%лЎң лҠҳм—ҲлӢӨ. н”„лһ‘мҠӨ(1.78%)мҷҖ лҸ…мқј(1.20%), мқҙнғҲлҰ¬м•„(1.09%) л“ұлҸ„ 15л…„ м „кіј 비мҠ·н•ң мҲҳмӨҖмқ„ мң м§Җн–ҲлӢӨ. л°ҳл©ҙ мқјліё кё°м—…л“ӨмқҖ 1995~1999л…„ GDPмқҳ 0.41%м—җ л¶Ҳкіјн–ҲлҚҳ мқёмһ¬ нҲ¬мһҗ к·ңлӘЁлҘј 2010~2014л…„ 0.1%лЎң лҚ”мҡұ мӨ„мҳҖлӢӨ.
мқјліёмқҳ кІҪмҳҒмқёл“Өмқҙ л¬ҙкё°л Ҙн•ң м§Ғмӣҗл“Өмқ„ лҸ…л Өн•ҳлҠ” кІғлҸ„ м•„лӢҲлӢӨ. кІҪмҹҒм—җм„ң л°ҖлҰ° мЎ°м§ҒмӣҗмқҙлӮҳ л¶Җ진н•ң мӮ¬м—…л¶ҖлҘј кіјк°җн•ҳкІҢ м •лҰ¬н•ҳм§Җ лӘ»н•ҳлҠ” мҳЁм •мЈјмқҳк°Җ к°•н•ҳ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л ҮлӢӨкі л¶Җ진н•ң мқёмһ¬мҷҖ мӮ¬м—…мқ„ 진мӢ¬мқ„ лӢӨн•ҙ нӮӨмҡ°м§ҖлҸ„ лӘ»н•ҳкё° л•Ңл¬ём—җ кІҪмҳҒ мһҗмӣҗмқҳ 분배к°Җ мқҙлӨ„м§Җм§Җ м•ҠлҠ”лӢӨлҠ” м§Җм ҒмқҙлӢӨ.
мқҙнҶ кө¬лӢҲмҳӨ нһҲнҶ м“°л°”мӢңлҢҖ CFOкөҗмңЎм—°кө¬м„јн„°мһҘмқҖ вҖңмқјліёмқҳ кІҪмҳҒмқёл“Өмқҙ вҖҳмӮ¬лһҢ мўӢлӢӨвҖҷлҠ” л§җмқҳ мқҳлҜёлҘј мһҳлӘ» мқҙн•ҙн•ҳкё° л•Ңл¬ёвҖқмқҙлқјкі л§җн–ҲлӢӨ. мӮ¬м—…мқҖ м җм җ мҮ нҮҙн•ҳлҠ”лҚ° мӮ¬мӣҗмқҖ вҖҳк°Җмқҙкі лЎңмӢң(м“ёлӘЁм—ҶлҠ” мӮ¬лһҢмқ„ н•ҙкі н•ҳм§Җ м•Ҡкі нҸүмғқ кі мҡ©н•Ё)вҖҷ мғҒнғңк°Җ лҸј нҡҢмӮ¬мҷҖ м§Ғмӣҗ лӘЁл‘җм—җкІҢ мқҙл“қмқҙ лҗҳм§Җ м•ҠлҠ” мғҒнҷ©мқҙлқјлҠ” м„ӨлӘ…мқҙлӢӨ.
вҖңлҢҖл¶Җ분мқҳ мқјліё кё°м—…м—җм„ң мқҙл ҮкІҢ л¬ҙкё°л Ҙн•ң мғҒнғңк°Җ мҳӨлһ« лҸҷм•Ҳ кі„мҶҚлҗң кІ°кіј мҳӨлҠҳлӮ мқјліёмқҙ м •мІҙ мғҒнғңм—җ л№ м§„ кІғвҖқмқҙлқјкі мқҙнҶ м„јн„°мһҘмқҖ 분м„қн–ҲлӢӨ.
м ң2м°Ё м„ёкі„лҢҖм „ нҢЁм „ м§Ғнӣ„ мһҝлҚ”лҜёлЎңл¶Җн„° л¶Ҳкіј 30м—¬ л…„ л§Ңм—җ м„ёкі„ 2мң„ кІҪм ң лҢҖкөӯмңјлЎң мҳ¬лқјм„ мқјліёмқёл“ӨмқҖ мҷң мқҙл ҮкІҢ л¬ҙкё°л Ҙн•ҙмЎҢмқ„к№Ң. л§ҺмқҖ м „л¬ёк°Җл“ӨмқҖ л””н”Ңл Ҳмқҙм…ҳмқ„ мЈјлҗң мӣҗмқё к°ҖмҡҙлҚ° н•ҳлӮҳлЎң м§Җм Ғн•ңлӢӨ. 20л…„ л„ҳкІҢ мҶҢл“қлҸ„, л¬јк°ҖлҸ„ мҳӨлҘҙм§Җ м•ҠлҠ” л””н”Ңл Ҳмқҙм…ҳмқҳ мӮ¬нҡҢк°Җ н•ңл•Ң мқјліёмқёмқҳ лӮҙл©ҙм—җм„ң л¶ҲнғҖлҚҳ мғҒмҠ№ мқҳмҡ•мқ„ кұ°м„ёмӢңмј°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нӣ„м№ҙк°ҖмҷҖ мң нӮӨмҪ” мҷҖм„ёлӢӨлҢҖ кІҪм ңн•ҷкіј көҗмҲҳлҠ” вҖңмӣ”кёүмқҙ мһҳ мҳӨлҘҙкё°ліҙлӢӨ мў…мӢ кі мҡ©мқҙ ліҙмһҘлҗҳлҠ” м§ҒмһҘмқ„ м ҲлҢҖм ҒмңјлЎң м„ нҳён•ҳлҠ” м җмқҖ мҳҲлӮҳ м§ҖкёҲмқҙлӮҳ ліҖн•Ёмқҙ м—ҶлӢӨвҖқл©° вҖңкө¬м„ұмӣҗмқҳ мғҒмҠ№ мқҳмҡ•мқ„ мӮ¬лқјм§ҖкІҢ л§Ңл“ңлҠ” кІғмқҙм•јл§җлЎң л””н”Ңл Ҳмқҳ л¬ҙм„ңмӣҖвҖқмқҙлқјкі л§җн–Ҳ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