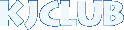긖[긲깋귽긛 :뻢뮝멞먐뽿뻹몺쀊뱦귺긙귺띍묈?
(둴궔궸뻢뮝멞궼럱뙶궕뫝궋궳궥. 궓궓귝궩먐뭑뻹몺쀊궕듰뜎궻 63~64긹귽긦깛긇깛궳궥)
긚긞긏`긅깛깇]깛궔귞뼻귡궘궶귡먐뽿븑뜎궻t뼻
긪깛긼먊뱷덇둾뎼땶룋뮮
룈붥
1. 뱦귺긙귺띍묈궻뙱뽿뺎뫔럮
2. 럀뽿뜎궻뼯귩렳뙸궢궫긚긞긏`긅깛깇]깛
3. 묿궕댿`둎뵯럷떾귩띏궋궬궻궔?
4. 댿`둎뵯뙥뜛귒궕귏궬븉벁뼻궶귦궚
5. 뱷덇궠귢궫뜎궼먐뽿븑뜎궬
1. 뱦귺긙귺띍묈궻뙱뽿뺎뫔럮
1998봏 10뙉 27볷붋뽩밲볦뫀뭤덃궳긫깛긐긳긞긏긎깑궸뤵궕궯궫밃뢂뎘뙸묆긐깑[긵뼹_됵뮮궴딯롌궫궭궻듩궸궞귪궶뙻뾲궕뛱궖뚴궯궲궋궫.
딯롌 - “뗠맫볷몟룕딯귩궋궰됵궯궲돺궻쁞귩궥귡믦궔?”
밃됵뮮 - “됵궎궻귩딖뫲궥귡. 볦뻢똮띙떐쀍궸뽴궸뿧궰궠귏궡귏귩땉_궥귡궰귖귟궬. 벫궸뻢뮝멞뎵듶궳먐뽿궕뢯귡궼궦궬궴궋궎쁞귩빓궋궫궕궞궻먐뽿귩볦뻢궕떐쀍궢궲둎뵯궢궲둊뻃궔궳뾗븶궶렄묆궸}궑궲귌궢궋.”
뱰렄뵬랳띘궬궯궫쁖럔{궻벆궻뭷궳궼뽿밹둎뵯궻뼯궕궘귡궘귡됷귦궯궲궋궫. 밃뢂뎘궕벆궻뭷궸`궋궫뽿밹둎뵯궼뗴몒궳궼궶궘뙸렳궬궯궫. 붯궕뻢뫀궻댿`귩둎뵯궥귡럷떾궸먑뗂밒궶뫴뱗귩롦궯궫귦궚궼, 뙽궯궲멟궻 1997봏 10뎭뻢(뮝멞)궕볷{뱦떈궳둎띊궢궫 “뮝멞댿`뚺렜먣뼻됵”귩믅궣궲떶궖귊궖궶륃뺪귩벦궫궔귞궬. 궩궻먣뼻됵궸궼뙸묆긐깑[긵궼귖궭귣귪듰뜎먐뽿둎뵯뚺롊궴긄깑긛귻(LG)긐깑[긵귖듫똚롌귩봦뙪궢궫럷궕궇궯궫.
뻢뫀궕궩궻먣뼻됵궳뚺둎궢궫궞궴궼 1996봏됂궸띿맟궢궫뽿밹둎뵯궸듫궥귡뎟빒뺪뜍룕궬. 궩궻뺪뜍룕궸귝귡궴, 1997봏뙸띪 1뼔3먪빟뺴km궸럧귡릱뮰멏궬궚~뭤궸뙱뽿럫릫뛇 13뙿귩궘궙궯궫궢, 2먪빟뺴km궸럧귡궓궰귏귒~뭤궸궼뙱뽿럫릫뛇랳궰귩궘궙궯궫궢, 3먪500 빟뺴km궸럧귡벏뮧멏궬궚~뭤궸궼뙱뽿럫릫뛇볫궰귩궘궙궯궫궴궋궎궻궬.
귖궯궴떶궘귊궖궶럷렳궼, 뻢뫀궕뙱뽿뻹몺쀊귩띍룷 588돪2먪400뼔긫깒깑궳띍묈 735돪3먪뼔긫깒깑궳릢맫궢궫궴궋궎궻궬. (듰뜎볷뺪 1997봏 1뙉 2볷) 1997봏 9뙉긇긥_긑깛긡긞긏(Kantech)롊궼릱뮰멏궬궚~뭤궸 400돪-500돪긫깒깑궻뙱뽿돽둰궰궚궲궋귡궴뵯궢궫럷궕궇귡. 궴궞귣궳뻢(뮝멞)궸궰궋궲빿롨뿇궭뺪벞궸뒿귢궫볦뫀뙻_궫궭궼뻢뫀궻뙱뽿뻹몺쀊귩 12돪긫깒깑궬궔귞 50돪긫깒깑궬궔귞궢궶궕귞뱑뺴귖궶궘뢫룷궢궲뺪벞궢궫럷궕궇귡.
뱦볦귺긙귺띍묈럀뽿뜎궳궇귡귽깛긤긨긘귺궻뙱뽿뻹몺쀊궕 50돪긫깒깑궳, 뭷뜎궕뚓귡읺둇쁯댿`궻뻹몺쀊궕 150돪긫깒깑궶궻궸, 뻢뫀궻뙱뽿뻹몺쀊궕띍룷 500돪긫깒깑댥뤵궬궴궋궎궞궴궼떶궖귊궖궸댾궋궶궋. 멣맊둉먐뽿떉땵뽘귩럙궋궻귏귏궸|쁌궥귡긻깑긘귺궬궚뎵듶궸궋귡 6뙿럀뽿뜎궼긖긂긙귺깋긮귺, 귺깋긳긄~깏긞깉깛긪긳, 긏긂긃[긣, 긇^[깑, 긫[깒[깛, 섪뼕궶궻궸, 궩궻뜎갲궻뙱뽿뻹몺쀊귩뙥귢궽궞궻귝궎궬.
맊둉궳뙱뽿뻹몺쀊궕덇붥뫝궋긖긂긙귺깋긮귺궼 2먪643돪긫깒깑궳, 긏긂긃[긣궕 990돪긫깒깑, 귺깋긳긄~깏긞깉깛긪긳궕 970돪긫깒깑궬. 뭷뱦럀뽿뜎궴뙻궯궲귖긇^[깑궻뙱뽿뻹몺쀊궼 150돪긫깒깑, 뚙궬궚궼 50돪긫깒깑궢궔궶귞궶궋. 뜎띧긄긨깑긎[@(IEA)궕뢯궢궫 2006봏뱗맊둉럀뽿뜎룈댧궳 9댧궸뤵궕궯궫, 깋긡깛귺긽깏긇궻띍묈럀뽿뜎긹긨긛긄깋궻뙱뽿뻹몺쀊궼 800돪긫깒깑궬.
뻢(뮝멞)궻뙱뽿뻹몺쀊궕뻢(뮝멞)궕뵯궢궫띍묈릢믦뭠궳궇귡 735돪긫깒깑궸럧궯궫귞, 뻢(뮝멞)궼긹긨긛긄깋궸덙궖똯궋궳맊둉 10댧궻럀뽿뜎궸궶귡궳궢귛궎.
2006봏뱗맊둉럀뽿뜎룈댧궳 13댧궸뤵궕궯궫긳깋긙깑궻댿`뙸떟귩귝궘뙥궲귖, 뻢(뮝멞)궻뽿밹둎뵯궕궋궘귞묈궖궋륃맖빾돸귩딳궞궥궼궦궶궻궔귩뙥뱰귩궰궚귡궞궴궕궳궖귡. 2007봏 11뙉 9볷긳깋긙깑궼렔뜎쀌둇궳뙱뽿뺎뫔럮(oil reservoir)귩뙥궰궚궫궴뵯궢궫궕, 릢믦뻹몺쀊궼 300돪긫깒깑궬.
뻢(뮝멞)궻뙱뽿뺎뫔럮궴붶귊궲뵾빁댧궻뻹몺쀊궢궔궶귞궶궋뙱뽿뺎뫔럮귩{궢뢯궢궫궢, 궩귢귖뻢(뮝멞)궸궇귡궞궴궻귝궎궶묈뿤묲뙱뽿뺎뫔럮궳궼궶궘[둇뙱뽿뺎뫔럮궬궔귞둎뵯뷂뾭궕귖궯궴궫궘궠귪볺궯궲뛱궘궼궦궶궻궸, 긳깋긙깑궼깋긡깛귺긽깏긇궳긹긨긛긄깋궸덙궖뫏궖볫붥뽞궳먐뽿뾃뢯뜎@(OPEC)궸돿볺궢귝궎궴럙궎. 뽿밹둎뵯궕뜎띧밒댧몜귩뭫궖빾궑궲궋귡궞궴귩빁궔귡.
1998봏 10뙉뽿밹둎뵯귩뼯뙥궲긫깛긐긳긞긏긎깑궸뤵궕궯궫밃뢂뎘뙸묆긐깑[긵뼹_됵뮮궼, 뻢뫀궕 1998봏 5뙉궔귞궓궰귏귒~뭤궳뙱뽿귩맯럀궢럑귕궫궴궋궎륃뺪궕빁궔궯궲궋궫궼궦궬. 궓궰귏귒~뭤궸듫궥귡륃뺪궼 “긪깛긎깈깒”궕 1999봏 1뙉 7볷궸뺪벞궢궫럷궕궇귡.
뻢뫀궕궓궰귏귒~뭤궳뙱뽿귩맯럀궢럑귕궫뜝궻 1998봏 5뙉 7볷, 뭺맭볦벞릱랹럖궸먊귩롦궯궫묈랹먐뽿돸둾뭖뭤궳벫빶궶뛱럷궕둎궔귢궫. 밃뢂뎘뙸묆긐깑[긵뼹_됵뮮궴긟긃긼깛긐긕깛럀떾럱뙶븫뮮뒸(뱰렄)귩듵귕궫 600]릐궕랷돿궢궫뭷궸뙸묆먐뽿돸둾묉2뽿둋뭖뭤뢹뛊렜귩뛱궯궫궻궬.
뙸묆먐뽿돸둾궼뎶럁 100뼔긣깛뫬맕귩롦귟뫓궑궫뭞(듰뜎) 띍묈먐뽿돸둾떾롊궳븖귂뤵궕궯궫. (빒돸볷뺪 1998봏 5뙉 8볷) 궩궻뜝뭞(듰뜎) 띍묈먐뽿돸둾떾롊귩뙕먠궢궫밃뢂뎘궸뻢(뮝멞) 뽿밹둎뵯궸랷돿궥귡궞궴궼뢣뾴궶됛묋궸뻲궵됡궗땸궯궫궼궦궬.
1998봏 1뙉 7볷[귽깑]깛귽깛`긅깛긐깏깈깛긪긳긲긃(몟쁀)궕뚺둎궢궫뙸뤾롃^궸뢯귡뻢뫀궻뙱뽿럫릫멏궼, 릱뮰멏궬궚~뭤궳둇믨뽿밹궕둎뵯궠귢궲궋귡궞궴귩뙥궧궲궘귢귡. 뙱뽿뻹몺쀊귩붶귊귡궴, 돷궳뤬귞궔궸_궦귡궓궰귏귒~뭤궻뭤뤵뙱뽿뺎뫔럮귝귟릱뮰멏궬궚~뭤궸궇귡둇믨뙱뽿뺎뫔럮궕궦궯궴묈궖궋. 릱뮰멏궬궚~뭤궸궇귡둇믨뙱뽿뺎뫔럮궸듫궥귡륃뺪귩몟뜃궥귢궽돷궻귝궎궶렳띧궕뙸귦귢귡.
2004봏 2뙉뭷뜎뜎뼮@궼읺둇~뭤귩 “둇뾪뛇쀋뗦됪”궳럚믦궢궫. 궩귢궔귞궋궘귞똮궫궶궋 2004봏 10뙉뭷뜎둇뾪먐뽿몟뚺롊(CNOOC)궼긡깛긙깛돧뜃읺둇~뭤궳륷궢궋둇믨뙱뽿뺎뫔럮귩뙥궰궚궫. 궩귢궔귞 3봏뵾궕땸귡뜞볷궻, 뭷뜎둇뾪먐뽿몟뚺롊궼읺둇쁯댿`궳덇볷궸 130뼔긫깒깑궦궰뙱뽿귩맯럀궢궲궋귡.
읺둇쁯댿`귩뙥궰궚궫뭷뜎둇뾪먐뽿몟뚺롊궼둇믨뙱뽿몏(oil bed)궸궢궫궕궯궲읺둇쁯볺뚿궳궫궋궲궋(뮝멞)뵾뱡궻뺴궸긳긞긏긲@깛긐궢궲~뭤궳궦궯궴뙱뽿뭈뜽귩릋뛱궢궲뛱궘뭷릩궸땺묈궶뙱뽿뺎뫔럮귩{궢뢯궥궻궸맟뚻궢궫. 궴궞귣궳떶궘귊궖궞궴궸궩궻뙱뽿뺎뫔럮궼뱦떈 124벞궻뱦둇덃, 뙻궋뫶궑귢궽뻢(뮝멞)궻볦뎋`궳맻궻뺴궸뽵 100km 뿣귢궫뻢(뮝멞) 쀌둇궳궇귡릱뮰멏궬궚~뭤궸궇궯궫.
맻둇궼떣궘궲먶궋둇궬. 빟뗉륲봹궼 44m궳띍믟륲봹궼 103m궳, 뱦맻띍뮮떁뿣(믅귟)궕뽵 700km궶궻궳, 뻢(뮝멞)궴뭷뜎궕맻둇궳 200둇뿢봱뫜밒똮띙릣덃(EEZ)귩궓뚚궋궸덙궚궽궩궻떕뽞궕궓뚚궋궸뢣궶귡귝궎궸궶궯궲봱뫜밒똮띙릣덃귩귏궬믦귕귡궞궴궕궳궖궶궋. 궢궫궕궯궲뻢(뮝멞)궻릱뮰멏궬궚~뭤궴뭷뜎궻긳긞긏긲@깛긐궢궲릟궋궫궔귞궼먝궢궲궋귡궢, 뭷뜎궻둇믨뙱뽿몏궴뻢(뮝멞)궻둇믨뙱뽿몏궼둇믨뱘뭷궳궓뚚궋궸똰궕귢궲궋귡.
2005봏 10뙉뭷뜎둇뾪먐뽿몟뚺롊궼 660돪긫깒깑궻뙱뽿돽둰궰궚궲궋귡땺묈궶뙱뽿뺎뫔럮귩뙥궰궚궫궴뵯궢궫. 뭷뜎맠{뱰떿궻볙븫뺪뜍룕궸귝귡궴, “]긛깛긐뿼뜎궕 30봏궻듩럊궎궞궴궕궳궖귡” 궓귂궫궬궢궘뫝궘궻뙱뽿돽둰궰궚궲궋귡뱦귺긙귺띍묈뙱뽿뺎뫔럮궬. 궩궻뙱뽿뺎뫔럮궻뫔띪궼뭷뜎궕 “2004봏뼎귖궎 90%궸뗟궋둴뤪귩벦궫댥뿀 2005봏 1봏궻듩뫝둷밒궶뮧뜽귩똉귟뺅궑궢궲뿀궫뙅됈돷궯궫뙅_”궳궇귡궻궬. (렄럷긙긿[긥깑 2006봏 1뙉 5볷)
뭷뜎륷됗믅륪뺪벞궸귝귢궽, 2005봏 12뙉 24볷뻢(뮝멞)궻깓긤`긅깑븲몟뿚궴뭷뜎뜎뼮@긄긨깑긎[뭆뱰`긅깛긐긻귽귽긃깛븲몟뿚궕 “둇뤵궳궻뙱뽿떎벏둎뵯궸듫궥귡떐믦”궸룓뼹궢궫궴뙻궎. 궩궻떐믦볙뾢궼뙻_궸뭢귞귢궶궔궯궫궕, ]긛깛긐뿼뜎궕뱦귺긙귺띍묈둇믨뽿밹귩떎벏궳둎뵯궢럑귕궫궞궴궼뼻귞궔궬.
]긛깛긐뿼뜎궕떎벏궳둎뵯궢럑귕궫둇믨뽿밹궕궵궻뛺뗦궸뫌궢궫궞궴궔궼뙻_궸뭢귞귢궶궔궯궫. 뢣뾴궶궞궴궼, 뻢(뮝멞)궕릱뮰멏궬궚궻뛎궋뛺뗦멣덃귩뭷뜎궴떎벏궳둎뵯궥귡궻궳궼궶궘, 뭷뜎쀌둇궸먝궢궫먝떕둇덃궻뛺뗦귩떎벏궳둎뵯궥귡궴궋궎_궬.
궞궻귝궎궸뭷뜎맠{궴뭷뜎뙻_궼긳긞긏긲@깛긐궢궲~뭤궳뙱뽿뺎뫔럮귩뙥궰궚궫궴맊궻뭷궸뭢귞궧궫궕, 렳궼뻢(뮝멞)궼귖궎 1970봏묆궸릱뮰멏궬궚~뭤궳뙱뽿뺎뫔럮귩뙥궰궚궫. 궩궻렳띧궼돷궻귝궎궬.
뻢(뮝멞)궕뱦돚띍묈럀뽿뜎궳궇귡깑[}긦귺궳뙱뽿럫릫딖귩뾃볺궢궫뫞뾸궼 1970봏궬. 뻢뫀궼~긖귽깑귩벲렔밒궸둎뵯궥귡렄궩궎궬궯궫궞궴궴벏궣궘, 깑[}긦귺맕뙱뽿럫릫딖귩빁됶궢궲땤먣똚궢궲렔뫬땆뢱궳뙱뽿뭈뜽멏 “뽿맜뜂”귩띿궯궫.
1975봏궸 “뽿맜뜂”궼궓궰귏귒~뭤궳볦맻뺴귉뽵 10km 뿣귢궫묉303뜂뛺뗦귩듵귕궫랳궰뛺뗦궳^깛긐~긞 2먪500m귏궳궶궕봌돷궕궯궲뙱뽿귩{궢뢯궢궫궢덇볷 70긫깒깑궦궰럫뙮맯럀궸맟뚻궢궫럷궕궇귡. 뿰돥맟빁궕룺궶궋렲궻귝궋뙱뽿궬궯궫.
뙱뽿뭈뜽궸맟뚻궢궫뻢뫀궼룶뿀렔뜎랹뙱뽿귩맱맶궢궫긊깏깛궳븉뫉궥귡렔벍롎귩렔뫬땆뢱궳둎뵯궢궫궕, 궩귢궕 1980봏묆뭷붦궸뢯궫뤸뾭롎럫띿뷼궬. 궩궻럫띿뷼궼긤귽긟맶뤸뾭롎긹깛긟 200궴둖`궕럸궲궋귡궺. (볷뾧긂깑 1998봏 11뙉 12볷)
1998봏 5뙉귽긎깏긚궻먐뽿딃떾땷궢궲귽깛^|긥긘깈긥깑(Soco International)궼뻢(뮝멞)궴댿`뭈뜽_뽵귩뙅귪궳뻢(뮝멞)궕뺎뾎궢궫뙱뽿럫릫딖맜귩둂쀇궥귡궫귕궸땆뢱귩럛뎴궢궲븫뷼귩떉땵궢궫. 2003봏 12뙉 31볷뻢뫀궼 1998봏 9뙉궸먠뭫궢궫뙱뽿뛊떾몟떿귩뙱뽿뛊떾맜궸뤈둰궢궶궕귞댿`둎뵯럷떾귩{둰돸궞귪궸궭궼궬궯궫.
궴궞귣궳뻢뫀궻둇믨뙱뽿몏궼릱뮰멏궬궚~뭤궸궬궚궇귡궻궳궼궶궘벏뮧멏궬궚~뭤궸귖궇귡. 릱뮰멏궬궚릟궋궫궔귞궼뻢(뮝멞)궴뭷뜎궕떎벏궳둎뵯궢럑귕궫궢, 벏뮧멏궬궚릟궋궫궔귞궼뻢(뮝멞)궴깓긘귺궕떎벏궳둎뵯궥귡됀맜궕궇귡.
2000봏 7뙉 19볷깓긘귺쁀뻄긵`깛묈뱷쀌궕빟뤿귩뻂뽦궢궲뗠맫볷몟룕딯궴띖묖, 뵯궢궫]깓긕깛긐긤깛긐깛긆깛궸궼 “묈딮뽎떐룙똶됪궻띿맟럷떾귩먑뗂돸궥귡궴궞귣뫮궢궲맠{궻듩궻뻜댲, 똮띙땩귂됆둾땆뢱떐룙댬덒됵뮝멞뫀궴깓긘깂긟긞긏댬덒뮮궫궭궸댬봀궢궫”궴뙻궋궶궕귞럚뽞궢궫렦뙝빁뽰궻뭷뙱뽿빁뽰귩듵귏궧궫.
2. 럀뽿뜎궻뼯귩렳뙸궢궫긚긞긏`긅깛깇]깛
궩궻듩귏궴귖궸뼻궔궠귢궶궘궲볦뫀뙻_궳귌궴귪궵뭾뽞궠귢귡궞궴궕궳궖궶궔궯궫궕, 뻢(뮝멞)궼렔뫬궳뙱뽿귩맯럀궥귡뼹렳떎궸럀뽿뜎궬. 빟}궶럀뽿뜎궳궼궶궘, 뱦귺긙귺띍묈궻뙱뽿돽둰봽뤾궠귢궲궋귡럀뽿뜎궬.
릱뮰멏궬궚~뭤궴벏뮧멏궬궚~뭤궸궰궚궲궋귡뵜묈궶뙱뽿귩{둰밒궸둎뵯궥귡뤾뜃, 뻢(뮝멞)궼뱦귺긙귺띍묈궻럀뽿뜎궳뱋뤾궥귡궳궢귛궎. 뻢(뮝멞)궼궓궰귏귒~뭤궳댿`귩둎뵯궥귡궞궴궳럀뽿뜎궻뼯귩렳뙸궢궫. 궓궰귏귒~뭤궸궇귡댿`궻댧뭫귩귖궎궭귛궯궴맫둴궸궰궚궽, 빟댝볦벞긚긞긏`긅깛긐깛궬.
뭤}귩뙥귢궽, 빟뤿맻뻢뺴귉빟뙱똍궕먝궢궲궋궲, 빟뙱똍뻢궸긚긞긏`긅깛긐깛궕궇귡. 긚긞긏`긅깛긐깛맻둇뎵듶뭤뫱궸볦뾪궴궋궎뭤뼹궻뽞뿧궰궻궸, 궞궻빒궳긚긞긏`긅깛깇]깛궬궴뚁귆뭤뤵댿`궼귏궠궸궩궻볦뾪덇뫱궸궇귡. 볦뫀뙻_궳궼긚긞긏`긅깛긐깛궴긣긞긏`깈깛똕귩뜫벏궢궫귟, 긚긞긏`긅깛깇]깛귩뭤뤵댿`궳궼궶궘긚긞긏`긅깛긐깛돧뜃궸궇귡둇믨뽿밹궳뜫벏궢궫귟궥귡.
1990봏묆궸뻢뫀귩뛱궖뚴궯궲똮띙떐쀍럷떾궸롨귩뢯궢궫띪빫벏뺼럷떾됄긎`@깛긐궕 2005봏궸긂깑궳뢯붎궢궫{궸띦궧귞귢궲궋귡덇뻼궻롃^궼긚긞긏`긅깛깇]깛궳됑벍궠귢귡뾎륃뾯볹딖(oil well pumping unit)귩롦궯궫귝궎궸뙥궑귡. 덋궕긵깑긘깛긐긘깛긐궥귡귝궎궸덄궯궫뛎궋밹궻뛀궞궎뫀궸궇귡뾎륃뾯볹딖귩랡뎓궢궫뙸뤾롃^궬.
궩궻롃^궸뢯궫뾎륃뾯볹딖궼뫮뎟뷨됆렖룕(Encyclopedia Britanica) 귽깛^[긨긞긣붎궸띦궧귞귢궫, 귏귡궳묈궖궶귽긥긕궻귝궎궸뙥궑귡뾎륃뾯볹딖궴럸궫`궬. 궩궻뙸뤾롃^궼긚긞긏`긅깛깇]깛궻뫔띪귩룊귕궲둖븫궸뭢귞궧궲궘귢궫롃^럱뿿궳궇귡궳궢귛궎.
볦뫀뙻_궸귝귢궽, 1999봏귩딈궳긚긞긏`긅깛깇]깛궳궼봏듩 220뼔긫깒깑(뽵 30뼔긣깛)궻뙱뽿귩맯럀궢궫궴뙻궎. (렄럷긙긿[긥깑 2006봏 1뙉 5볷) 긚긞긏`긅깛깇]깛궳 1999봏궸맯럀궢궫봏듩 220뼔긫깒깑궻뙱뽿궼, 뱰렄 “뗪볩궻뛱똓”궳먐뽿귩먢뽵궢궲럊귦궶궚귢궽궶귞궶궔궯궫뻢뫀궳뤑뷂궢궫봏듩먐뽿뤑뷂쀊궻뵾빁댧귩먫귕귡뾯궬궯궫.
볦뫀뙻_궸귝귢궽, 긚긞긏`긅깛긐깛궳뱦뻢뺴귉룺궢뿇궭궫긣긞긏`깈깛똕궳귖뽿밹둎뵯귩럑귕궫궴뙻궎. (뮝멞볷뺪 2001봏 5뙉 28볷) 궞귢궼뻢뫀궕 2000봏묆궸볺귟궶궕귞긚긞긏`긅깛긐깛궴긣긞긏`깈깛똕귩듵귔궓궰귏귒~뭤궇궭궞궭궳뭤뤵댿`귩둎뵯궢궲궋귡궞궴귩뙻궯궲궘귢귡.
궞궞궳뻢(뮝멞)궻뙱뽿뢁볺쀊빾돸릢댷귩뼻귞궔궸궢궲궘귢귡뭞(듰뜎) 뱷똶뮕궻럱뿿귩귝궘뙥귡뷠뾴궕궇귡. 뻢뫀궻뙱뽿뢁볺쀊궼 1980봏궸 1먪539뼔3먪긫깒깑궬궯궫궢, 1990봏궸 1먪847뼔2먪긫깒깑궬궯궫. 궩궎궥귡궎궭궸 1990봏묆뭷붦댥뚣 “뗪볩궻뛱똓” 렄딖궸뙱뽿뢁볺쀊궕땳뙵돷궬궯궫.
뙱뽿뢁볺쀊궼 1997봏궸 370뼔9먪긫깒깑, 1998봏궸 369뼔4먪긫깒깑, 1999봏궸 232뼔5먪긫깒깑귩딯^궢궶궕귞럍뤵띍믟릣궸뿇궭궲궔귞, 똮띙됷븳딖궸뿧궭볺궯궫 2000봏묆궔귞귏궫몵궑럑귕궫. 궴궞귣궳 2000봏묆궻뙱뽿뢁볺쀊궼 2001봏 424뼔4먪긫깒깑, 2005봏 408뼔6먪긫깒깑, 2006봏 384뼔1먪긫깒깑궬궯궫. (쁀뜃긦깄[긚 2008봏 1뙉 13볷) 궞궻귝궎궶빾돸릢댷궼 2001봏댥뚣뙱뽿뢁볺쀊궕뻽봏뙵궯궲궋귡궞궴귩뙻궯궲궘귢귡.
뻢뫀궕똮띙됷븳딖귩똮궯궲뛊떾맯럀쀊귩륧궽궢궲궋귡궻궳먐뽿뤑뷂쀊귖뻽봏몵궑귡궻궕맫륂궶궻궸, 2001봏댥뚣뙱뽿뢁볺쀊궼뻽봏뙵궯궲궋귡. 2006봏귩딈궳뻢뫀궻뛊떾돸릣궸몜돒궥귡뙱뽿뢁볺쀊궼 1990봏묆궻빟뗉뢁볺쀊궳궇귡 1먪800뼔긫깒깑댧궸궶귞궶궚귢궽궶귞궶궋궻궸, 븉럙땉궶궞궴궸 2006봏궻뙱뽿뢁볺쀊궼귦궦궔 384뼔긫깒깑궢궔궶귞궶궋.
궩궻듩뻢뫀궕릣쀍뵯밺룋궴먐뭑됌쀍뵯밺룋귩궫궘궠귪뙕먠궢궲긄긨깑긎[뤑뷂궳먐뽿붶뢣귩뙵귞궢궫궴뙻궯궲귖, 뙱뽿뢁볺쀊궴뙱뽿롿뾴쀊궻궓귂궫궬궢궋쀢궫궘궼먣뼻궸궶귞궶궋. 2006봏궸뫜궻뜎궳봼롷궚궫뙱뽿 384뼔긫깒깑귩렃궯궲궔귞궼뻢뫀궕뱸믨똮띙귩럛궑귡궞궴궕궳궖궶궋궔귞궬.
384뼔긫깒깑궢궔궶귞궶궋뙱뽿귩봼롷궚궲궔귞귖똮띙귩벍궔궥 “붼뙇”궼, 렔뜎랹뙱뽿궻맯럀쀊궕묈궖궘몵궑궫궞궴궳{궥궞궴궕궳궖귡. 긚긞긏`긅깛깇]깛궳봏듩 220뼔긫깒깑궻뙱뽿귩맯럀궢럑귕궫렄궔귞 9봏귖땸귡뜞볷, 뻢뫀궻뙱뽿맯럀쀊궼댥멟귝귟묈궖궘몵궑궫궞궴궕뼻귞궔궬.
떶궘귊궖궶궞궴궼, 뻢(뮝멞)궕뫜궻뜎궸먐뽿귩뾃뢯귏궳궢궲궋귡궴궋궎럷렳궬. 2001봏뙸띪, 뻢(뮝멞)궼뭷뜎, 볷{, ^귽, 긲깋깛긚궸봏듩 1먪뼔긤깑댥뤵궻먐뽿귩뾃뢯궢궫. (뮝멞볷뺪 2002봏 1뙉 26볷)
뻢뫀궻뙱뽿맯럀쀊궕몵궑궲뽿쀞럷륃궕묈궖궘뛆궖궸궶궯궫궴궋궎럷렳궼 2008봏 1뙉궸렳{궢궫뮝멞릐뼬똓~딦똏쀻궳귖궎궔궕궎궞궴궕궳궖귡. 볦뫀궻똒룷륣믅궼 2008봏 1뙉뭷{궸렳{궢궫뮝멞릐뼬똓뗴똓~딦똏쀻궳덇볷궸 170]됷귘뢯똼궥귡궶궵 1995봏댥뚣 13봏귆귟궸먰벉@덇볷뢯똼됷릶궕럍뤵띍뛼릣귩딯^궢궫궴럚밇궢궫. (쁀뜃긦깄[긚 2008봏 2뙉 21볷)
귖듰빫똓맠뺚맠{궼뜎띧뙱뽿돽둰궕벇궢궫궻궸뮝멞릐뼬똓@뛟롊뭖궻@벍똏쀻궻몵궑궫귦궚궕똓븫묂궻뽿쀞럷륃궕뛆궖궸궶궯궫궔귞궬궴빁먏궞귪궸궭궼궬궯궫.(쁀뜃긦깄[긚 2008봏 2뙉 10볷)
붯궴댾궎귝궎궸, 듰뜎똓궼뜎띧뙱뽿돽둰궕긫깒깑뱰귟 80긤깑궳뤵궕귡궞궴궸뷈궑궲 2007봏 1뙉궸 4뭝둏뽿쀞뱷맕똶됪귩뙕궲궫궢, 똓븫묂똏쀻귩뱷뜃궢궲뗴똓뷅뛱똏쀻렄듩귩뭝둏밒궸뢫귕궲뿀궫궕, 뜎뻞뤙뱰떿롌궸]궑궽뜎띧뙱뽿돽둰궕긫깒깑뱰귟 80긤깑귩뎭궥궴똓덀봀뼮릩뛱궼븉됀륉뫴궸궶귡궴궋궎궻궬. (듰뜎볷뺪 2007봏 11뙉 9볷)
3. 묿궕댿`둎뵯럷떾귩띏궋궬궻궔?
1998봏 10뙉 30볷뽭 10렄 25빁, 뗠맫볷몟룕딯궼댢궕뿧궭뜛귕궫빟뤿궻뷨됞뙱룊묈룷귩{궢궫. 궩궻룋궸궼밃뢂뎘뼹_됵뮮궴뭸듩궕궴궵귏궯궲궋궫. 뗠맫볷몟룕딯궼 45빁듩밃뢂뎘뼹_됵뮮궴뭸듩귩먝뙥궞귪궸궭궼궬궯궫. 볦뫀뙻_궼 “쁝딠궇궋궇궋궢궫빑댪딠궻뭷궳” 쁞궕뛱궖뚴궯궫궴`궑궫. 먝뙥먊궳뛱궖뚴궯궫뫮쁞볙뾢궻뭷궻돷궻귝궎궶룕궖볺귢렄궕릐뽞귩덙궘.
밃됵뮮 - “뻢뮝멞궸궼먐뽿궕뢯귡귪궳궥궯궲?”
뗠댬덒뮮 - “뢯귏궥.”
밃됵뮮 - “뻢뮝멞뽿귩볦듰궸궨궿몭궯궲궘궬궠궋. 긬귽긵깋귽깛궬궚맻둇듶귩믅궣궲볦듰궸뿀귢궽궩귢궕뱷덇궻벞궳궥.”
뗠댬덒뮮 - “궩궎궳궥. 뫜궻궢궲궥귡궞궴궇귟귏궥궔. 뙸묆궢궲궥귢궽쀇궋궳궥궺. 궩궎궥귡귝궎궸럚렑궢귏궥.”
뽭 11렄 10빁뗠맫볷몟룕딯궼뷨됞뙱룊묈룷귩땸귟궶궕귞 “궋궰귏궫궋귞궯궢귗귡궔. 벞궕쀴궚궫궔귞궫귂궫귂뿀궲궘궬궠궋”궴궇궋궠궰궻뙻뾲귩긕깛긨긞긕, 밃뢂뎘뼹_됵뮮궼 “뽿궠궑몭궯궲궘궬궠궯궫귞궋궰궳귖뿀귏궥. 궓뚚궋궸궓롨룙궚궸궶귡궞궴궕궳궖귡귝궎궸뱖쀍궢궫귞궴럙궋귏궥”궴뙻궯궫. (뮝멞볷뺪 1998봏 11뙉 3볷)
1997봏 11뙉뗠뾝딅@궻뮳똼뭙귩뱰궫궯궫볦뫀똮띙궴 1994봏댥뚣 “뗪볩궻뛱똓”궳뜟볩귩똮뙮궢궫뻢뫀똮띙궕뼬뫎떎벏붖뎗궻벞궳궰궔궰궔궴뿧궭볺귡볦뻢(볦뻢) 떎벏뽿밹둎뵯럷떾궼, 1998봏 10뙉 30볷뽭궓궩궋럨둶궸궩귪궶궸뒾똽밒궶룊뺖귒귩궼궶궢궲궋궫.
귖궢뷨됞뙱룊묈룷궻뽵엸궕궩궻귏귏렳뛱궠귢궫귞, 궩귢궔귞 10봏궕땸귡뜞볷궻뱦귺긙귺띍묈댿`궳궥궘궋뤵궛귡뙱뽿궼볦뫀똮띙궴뻢뫀똮띙궸쀍떗궋맟뮮벍쀍귩떉땵궢궶궕귞뱷덇똮띙딈붦귩뾭댰궢궫궻빁궔귞궶궋.
궢궔궢볦뻢(볦뻢) 떎벏뽿밹둎뵯럷떾궕뒾똽밒궶룊뺖귒귩궼궶궢궫귏궠궸궩궻볷, 댰둖궸귖긂깑궳궼궩궻뺖귒귩띏궟궎궴궥귡븕믅궳궼궶궋딠뿬궕뿬귢궲궋궫. 1998봏 10뙉 30볷뚞뚣, 궬궔귞뗠맫볷몟룕딯궕밃뢂뎘뼹_됵뮮뭸듩귩먝뙥궢궶궕귞볦뻢(볦뻢) 떎벏뽿밹둎뵯럷떾귩떐땉궥귡귦궦궔돺렄듩궻멟, 빫뜎뭷돍륃뺪떿(CIA) 떿뮮긙깈[긙긡긦긞(George J. Tenet)궕븲떿뮮귩듵귕궫뭸듩뚙릐궴덇룒궸먃뒧묇궻뽩귩둎궋궲뿧궭볺궯궫.
긌갋긢긙깄깛묈뱷쀌궴붼뼤됵뭟귩릋뛱궥귡궫귕궬. (긪깛긎깈깒 1998봏 10뙉 30볷) 귺긽깏긇뭷돍륃뺪떿떿뮮궕븲떿뮮귏궳묈벏궴뫜궻뜎귩릕궺귡궞궴궼뷄륂궸럧}궳뢣묈궶럷댡궕궢뿧궲귞귢궫렄궥귡붼뼤뛱댴궶궻궳뙻_궸쁈뢯궢궶궋.
궴궞귣궳궇궋궸궘궸귖 “긪깛긎깈깒”궻롃^딯롌궕뤸뾭롎궔귞~귟귡긡긦긞궻럓귩뗵멢궸랡뎓궥귡궧궋궳붯궻붼뼤뛱댴궕뙸귦귢궲궢귏궯궫. 뱛뛓뻊뮎궢궫귺긽깏긇뭷돍륃뺪떿뾴덒궫궭궼 “긪깛긎깈깒”궸긡긦긞귩롦궯궫긲귻깑귩봯딙궢궶궠궋궴뾴땫궢궲z벍귩궢궫.
긌갋긢긙깄깛궴긡긦긞궻먃뒧묇붼뼤됵뭟궳_땉궠귢궫뫝궘궻뙗댡궻뭷궳궼볦뻢(볦뻢) 떎벏뽿밹둎뵯럷떾궸듫궥귡뙗댡귖빓궋궲궋궫궼궦궬. 긡긦긞궼뻢뫀궻뽿밹둎뵯궸랷돿궢귝궎궴궥귡밃뢂뎘귩윘~궥귡귝궎궸긌갋긢긙깄깛묈뱷쀌궸뾴땫궢궫궞궴궴뙥궑귡.
궞귢궼뵗멢궫귡릢믦궳궼궶궘, 긌갋긢긙깄깛궴긡긦긞궻먃뒧묇붼뼤됵뭟궕궇귡궻렄궔귞랳볷뚣궸먃뒧묇귩릕궺궫밃뢂뎘쁀뭷귩먝뙥궢궫먊궳긌갋긢긙깄깛묈뱷쀌궕롦궯궫뫴뱗, 궩궢궲궩궻뮳뚣궸볦뫀맠{맠{궕뻢뫀댿`둎뵯뽦묋궸뫮궢궲릪궯궫뺴릌귩귝궘뙥귢궽빁궔귡.
긌갋긢긙깄깛궴긡긦긞궕먃뒧묇궳붼뼤됵뭟귩렃궯궫궞궴귩멣멢빁궔귡궞궴궕궳궖궶궔궯궫밃뢂뎘궴뭸듩궼 1998봏 10뙉 31볷빟뤿귩뵯궯궲긂깑궸딞귡뱑뭷궸붋뽩밲궸럧궯궲뚞뚣 4렄궸딯롌됵뙥귩둎궋궫. 궩궻먊궳밃뢂뎘궼뽿밹둎뵯궻뼯귩뽞궸`궋궲뒾똽궸봆귢궫맳궳궞귪궶궸뙻궯궫.
”빟뤿궕뽿_~[궸뤵궕궯궲띆궯궲궋귡. 럡궼뽿귩볦듰궸몭궯궲궘귢궴뙻궯궫궢, 룶똓궼궩궻귝궎궸뼺쀟궻돷궋궚궶궋궴뙻궯궫. 뻢뮝멞궸궵귪궶궸뽿궕궫궘궠귪뢯귡궔뭢귢궶궋. 뻢뮝멞뽿귩렃궭궞귔궫귕궻긬귽긵깋귽깛돹먣띿떾귩궥궙럑귕귡궞궴궸뜃땉궢궫.”
궩궻먊궸봿먊궢궫긌갋깇깛긎깄뙸묆긐깑[긵뫮뻢럷떾뭖뮮(뱰렄)궼 “뻢뮝멞궻뮧뜽궳궼뻹몺쀊궕귝귌궵뫝궋귝궎궬. 럡궫궭궕뽿밹둎뵯귩맫렜믯댡궢궲뻹몺쀊궶궵귩귏궫뮧뜽궢궲뙥궫뚣긬귽긵깋귽깛뙕먠궸롦귟|궔귡궞궴”궴븊궚돿궑궫. (듰뜎볷뺪 1998봏 11뙉 2볷)
뻢뫀뽿밹둎뵯궸듫궥귡밃뢂뎘궻딯롌됵뙥뵯뙻궕밺봥궸뤸궯궲볦뫀멣덃궸`귦궯궫렄, 궩궻쁍뺪궼먐뽿븑뜎귩뛀궚궫맊듩궻딖뫲궴딍]귩띊궥궻궸뻃궔궬궯궫.
궢궔궢 1998봏 11뙉 2볷궩궎궋궎딖뫲궴딍]궼띏궋궳궢귏궯궫. 궩궻볷먃뒧묇먝뙥렭궳궼긌갋긢긙깄깛묈뱷쀌궕밃뢂뎘뙸묆긐깑[긵뼹_됵뮮뭸듩귩먝뙥궞귪궸궭궼궬궯궫. 릕륂궳궼궶궋빑댪딠궕뷯궎뭷궸, 붯귞궻듩궳롦귟뚴귦궢궫뫮쁞궼궞궻귝궎궬.
뗠묈뱷쀌 - “뚥뗪쁉궠귏궳궢궫. 뫝궘궻럷귩궢궫궴빓궖귏궢궫.”
밃됵뮮 - “빟뤿궳뽿궕뢯귡궻궸긬귽긵귩쁀뙅궢궲먐뽿귩떉땵궥귡궴뻢뫀궕뽵뫆궢귏궢궫.”
뗠묈뱷쀌 - “뽿됀맜궕궇귡귪궳궥궔?”
밃뼯뙖 (뙸묆됧랹긐깑[긵됵뮮) - “됀맜궼귝궘빁궔귞궶궋궕귺긙귺뫞빟뾪빟쁝댬덒됵뫀궕둎뵯랷돿귩뾴땫궢궫궢, 뗠맫볷몟룕딯궕뽿궕맯럀궠귢귢궽볦뫀궸귏궦떉땵궥귡궞궴귩뽵뫆궢귏궢궫. 밃뼹_됵뮮궕볦듰륷빓궸뚺둎궢궲귖쀇궋궔궴뽦궯궫귞쀇궋궴뙻궋귏궢궫.”
뗠묈뱷쀌 - “귺긽깏긇뭈뜽됵롊궫궭궕뭈뜽귩궢궲궋귏궥궔?”
뿘귽긏` (뙸묆뤪뙏됵뮮) - “귺긡긯깈깛긐긲@긂귻먖봀롌궫궭궼뽿궕뢯귡궴둴륪궢귏궢궫. 뭷뜎읺둇쁯궳뽿궕궫궘궠귪뢯귡궻궸뭤몏몾궕빟뤿귏궳똰궕귢궲몜뱰쀊궕봽뤾궠귢궫궞궴궳둴륪궥귡궴쁞궢귏궢궫. 뗠뜎뻞댬덒뮮귖귺긽깏긇궳뭈뜽믯땉궕뫝궋궴뙻궯궫궢, 롃^귩뙥궫귞뽿궕궇궯궫궴뙻궋귏궢궫.”
뗠묈뱷쀌 - “궩궎궶궞궴궼룶뿀쁞궥럷궸궢궲귏궦뛱궯궲뿀궫쁞귩궢궲뙥궲궘궬궠궋.”
밃뼯뙖 - “뗠맫볷몟룕딯궼뗠뎙볦띍뛼릐뼬됵땉륂봀댬덒뮮궸됵궯궫궔귞궥귊궲궻귖궻궕귝궘궳궖궫궻럙궯궫궕, 귺긙귺뫞빟뾪빟쁝뤵궳}깛긥_깑궴궋궎뾴맾궕궇궯궫궢, 밃뼹_됵뮮궕봏띘귖롦궯궲뫬궻뮧럔궕닽궋궔귞뤅뫲룋궸뿧궭딋궯궫궴뙻궋궶궕귞롥궸뽿궻쁞귩궢귏궢궫.”
밃뢂뎘쁀뭷궔귞볦뻢(볦뻢) 떎벏뽿밹둎뵯럷떾궻벞궕둎궔귢궫궴궋궎뺪뜍귩롷궚궫긌갋긢긙깄깛묈뱷쀌궼궩궻럷떾궕맟럷궸궶귡귝궎궸쀣귏궢궲궘귢귡궴맫륂궶궻궸, 빾궸묈뱷쀌궻뵿돒궼궇귏귟궸귖쀢귘귘궔궬궯궫.
”맊둉볷뺪” 1998봏 11뙉 4볷븊궚뺪벞궸귝귢궽, 긌갋긢긙깄깛묈뱷쀌궔귞 “뭾댰귩롷궚궫” 밃뢂뎘궼륲궕궋궫귪궳먝뙥렄듩 35빁듩럑뢎돺귖뙻귦궶궔궯궫궢, 붯궻뫃럔궴벏렄궸뙸묆됧랹긐깑[긵됵뮮궳궇귡밃뼯뙖궕먣뼻궢궫궴뙻궎.
귖궯궴떶궘귊궖궶궞궴궼, 긌갋긢긙깄깛묈뱷쀌궻쀢귘귘궔궶뵿돒궕볦뻢(볦뻢) 떎벏뽿밹둎뵯럷떾궸뫮궥귡멽~뺴릌궳뚂귏궯궫궴궋궎럷렳궬. 뱰렄뱷덇뤙뮮뒸궼뵿뻢뮝멞맜뛀귩렃궯궫뛐릑벩궬궯궫. 뛐릑벩궼밃뢂뎘궕볫붥뽞궳땷궻똒귢귩뗭궯궲긫깛긐긳긞긏긎깑궸뤵궕궯궫 1998봏 10뙉 29볷딯롌궫궭궸 “뻢뮝멞먐뽿둎뵯뽦묋궼뙸묆궔귞빓궘궞궴궕궳궖궶궔궯궫쁞궬.
뻢뮝멞궸먐뽿궕봽뤾궠귢궲궋귡궴뙻궯궲귖룮떾맜궕궶궋궞궴궴뭢귞귢궫”궴뙻궋궶궕귞땻붬댰럘귩뙸귦궢궫. 궩궎궥귡궎궭궸 11뙉 2볷귉뿀궲뛐릑벩궼딯롌궫궭궻뽦궋궸뺅럷궢궶궕귞 “뙸묆궕 (뱷덇뤙궴) 궥귊궲궻귖궻귩몜뭟궢궫”궴뙻뾲귩빾궑궫. 볦뫀뙻_궼 “맠{궕뙸묆궻뜃댰귩귘귔귩벦궦믁봃궥귡덐뤭귩뷯궯궫”궴럚밇궢궫. (맊둉볷뺪 1998봏 11뙉 3볷)
밃뢂뎘쁀뭷궕뻂뻢궥귡뮳멟궸뱷덇뤙궕귘귔귩벦궦믁봃궢궲궘귢궫뙸묆긐깑[긵궻뻢뫀뙱뽿둎뵯랷돿뽦묋궼, 긌갋긢긙깄깛궴긡긦긞궕먃뒧묇궳붼뼤됵뭟귩렃궯궫뮳뚣긌갋긢긙깄깛묈뱷쀌궻뮳먝럚렑궸귝궯궲궕깓}긞긏긭깈긞_. 긌갋긢긙깄깛묈뱷쀌궕볦뻢(볦뻢) 떎벏뙱뽿둎뵯럷떾귩띏궙멽~뺴릌귩럚렑궢궫궴궋궎럷렳궼 1998봏 11뙉 4볷먃뒧묇궳릋뛱궠귢궫뜎뼮됵땉궳둴봃궠귢궫.
궩궻됵땉궳긌갋긢긙깄깛묈뱷쀌궼 “(뻢뮝멞궳) 먐뽿궕뢯귡궻궔뢯궶궋궻궔둴궔궳귖궶궘궲뢯궲귖똮띙맜궕궇귡궔귖뭢귢궶궋. 뻢뮝멞귖먐뽿궕븉뫉궶궻궸럡궫궭궸떉땵궥귡궞궴궕궳궖귡궻궔^뽦궬. 볙뾢궕궥궗귡귌궵뮣귞귏궢궲뭢귞귢궲궋귡. 랅볷뭾댰귩^궑궫”궴뙻궯궫.
볦뫀뙻_궼 1998봏 11뙉 3볷묈뱷쀌궻럚렑귩롷궚궫뱷덇뤙궕 “밃뢂뎘뙸묆뼹_됵뮮궕뙻땩궢궫댿`둎뵯럷떾궼렳뙸됀맜궕룷궠궘궲뤂봃궢궲궘귢궶궋뺴릌”귩뙂귕궫궞궴귩뺪벞궢궫. (뭷돍볷뺪 1998봏 11뙉 4볷) 뱷덇뤙뮮뒸궳궼궶궘묈뱷쀌궕뮳먝뢯궲댿`둎뵯랷돿귩띏궋궬궴궋궎_귩뭾뽞궥귡뷠뾴궕궇귡.
긌갋긢긙깄깛묈뱷쀌궻멽~뺴릌궸궕깓}긞긏긭깈댿`둎뵯럷떾궸뢯귡궞궴궕궳궖궶궘궶귡궴, 뙸묆긐깑[긵궼뗠|랹듡뚹럷떾궬궚릢릋궥귡궢궔궶궔궯궫. 뤸땞 826릐귩뤸궧궫뗠뛾뜂궕쀰럍뤵룊귕궲뻂뻢뢯`궻멏궻딡밓귩뼿귞궢궲뱦둇`궳몧밬`궸뵯궯궫볷궼 1998봏 11뙉 18볷궬궯궫.
뙱뽿둎뵯럷떾궸랷돿궥귡귝궎궸딂궯궫밃뢂뎘뙸묆긐깑[긵뼹_됵뮮궼 2001봏 3뙉 21볷뵬쁛띘귩쓪귡궞궴궸귪궬궢, 뙸묆됧랹긐깑[긵됵뮮밃뼯뙖궼뫮뻢몭뗠럷뙊귩렩쓃궸믁먘궢궲댊뵕떗뱪귩뛼귕궫뙚@궴뙻_궻뢜뭷뛘맖귩뫯궑귡궞궴궕궳궖궶궘궲 2003봏 8뙉 4볷뷅귂궞귒렔랤궳맯귩뢎궑궫.
긚긞긏`긅깛깇]깛궼궩궻볫릐궕맊귩땸궯궲, 볦뫀맠{뱰떿궕뻢뫀뽿밹둎뵯궸듫궥귡륃뺪뚺둎귩뗕~궥귡뺴릌귩뮮뫏궘궸귝궯궲뙻_궻듫륲궳룞갲궸돀궘궶궯궲뛱궯궫.
4. 댿`둎뵯뙥뜛귒궕귏궬븉벁뼻궶귦궚
긌갋긢긙깄깛묈뱷쀌궕볦뻢(볦뻢) 떎벏뽿밹둎뵯럷떾귩윘~궢궫렄궔귞궋궰궻귏궸궔뗣볷궕똮궯궫. 궩궻듩궸 6.15 떎벏먬뙻궕띖묖궠귢궫궢, 긩갋긭깈깛맠뙛궕뱋뤾궥귡륃맖빾돸궕궇궯궫.
9봏멟, 뗠맫볷몟룕딯궕밃뢂뎘뙸묆긐깑[긵뼹_됵뮮궴뭸듩귩먝뙥궢궲댿`둎뵯럷떾귩떐땉궢궫뷨됞뙱룊묈룷궳뗠맫볷몟룕딯궴긩갋긭깈깛묈뱷쀌궕뫮띆궢궫. 2007봏 10뙉 3볷궻럅럷궬궯궫. 궩궻볷뚞뚣 2렄 45빁궔귞둎럑궠귢궫띍뛼딅}됵뭟궳뗠맫볷몟룕딯궴긩갋긭깈깛묈뱷쀌궼댿`둎뵯뽦묋귩롦귟뤵궛궫.
뗠댬덒뮮 - “볦뫀뭤덃볙궳궼궵귪궶궸댿`궴긊긚귩둎뵯궢궲궋귏궥궔? 뭈뜽땆뢱궸귖듫륲궕궇귟귏궥.”
긩묈뱷쀌 - “벏궣궳궥. 뻢뫀럡궻뽿밹둎뵯궸뫮궢궲듫륲귩렃궯궲궋귏궥. 룕듗궬궚댿`궴_깛`긅깛뭤돷럱뙶둎뵯귖떎궸궳궖귡궳궢귛궎.”
뗠댬덒뮮 - “둎뤻뛊뭖귖귏궬궥귊궲빁궔궯궫궶궯궫궕뻢뭤귩궥귊궲먫귕귡럷궼궇귟귏궥궔.”
볫궰궻롵]궻됵뭟볙뾢궼둖븫궸뚺둎궠귢궶궔궯궫궻궳뗰뫬밒궸귦궔귞궶궋궕, 볦뫀뙻_궕뺪벞궢궫뤵궻됵뭟볙뾢궼궩궻먊궸봿먊궢궫볦뫀맠{뒸뿖궻뚿귩믅궣궲묈궖궘궶귡귝궎궸뢫뽵궠귢궫`뫴궳`귦궯궫궻궬. 볦뫀뙻_궕륲귖궭뭒궘뺪벞궢궫뤵궻됵뭟볙뾢궼뗠맫볷몟룕딯궴긩갋긭깈깛묈뱷쀌궕띍뛼딅}됵뭟궳댿`둎뵯뽦묋귩_궣궫궞궴귩뭢귞궧궲궘귢귡뢣뾴궶럱뿿궬.
뗠맫볷몟룕딯궼댿`귩뭈뜽궢궲둎뵯궥귡볦뫀궻럱{궴땆뢱궕궵궻릣궶궻궔귩긩갋긭깈깛묈뱷쀌궸빓궋궫궕, 긩갋긭깈깛묈뱷쀌궼궩궻뽦궋궸뺅럷궢궶궋궳 “룕듗궬궚댿`”귩럚밇궢궶궕귞뻢뫀궻뽿밹둎뵯궸듫륲귩렃궯궲궋귡궴뙻궯궫. 댿`귩뭈뜽궢궲둎뵯궥귡럱{궴땆뢱궸듫궥귡됵뭟럱뿿귩귏궬뷈궢궲뿀귡궞궴궕궳궖궶궘궲궩궻귝궎궸뙻궑궫궔귖뭢귢궶궋.
붯궕 “룕듗궬궚댿`”궴뙻궯궫궞궴궼릱뮰멏궬궚댿`귩댰뼞궥귡. 긩갋긭깈깛묈뱷쀌궕듫륲귩뙥궧궫_깛`긅깛궻뭤돷럱뙶궴뙻궎(궻궼)_깛`긅깛궸궇귡맊둉띍묈뻹몺쀊귩뚓귡}긐긨긖귽긣귩댰뼞궥귡궻궸, 궞궻빒궳궼댿`둎뵯뽦묋궬궚_궦귡.
긩갋긭깈깛묈뱷쀌궕릱뮰멏궬궚댿`궴_깛`긅깛}긐긨긖귽긣뛺랹귩벏렄궸둎뵯궥귡궞궴궕궳궖귡궴궋궎듫륲귩뙥궧궫렄, 뗠맫볷몟룕딯궼뙿맜뛊떾뭖뭤뙕먠럷떾궔귞귏궴귖궸릋뮲궠궧귝궎궴궋궎믯댡궳뺅럷궻묆귦귟귩궢궫.
뤵궻됵뭟볙뾢궳빁궔귡궞궴궼, 뗠맫볷몟룕딯궴긩갋긭깈깛묈뱷쀌궕릱뮰멏궬궚댿`둎뵯뽦묋궸듫륲귩렃궯궲궋귡궴궋궎_궬. 먃뒧묇궼뗠맫볷몟룕딯궴긩갋긭깈깛묈뱷쀌궕볦뻢(볦뻢) 떎벏댿`둎뵯궸듫궢궲떐땉궢궫됵뭟볙뾢귩뚺둎궥귡궻귩땻붬궢궫. (뙉뒮뭷돍 2007봏 12뙉뜂)
2007봏 10뙉 4볷뚞멟 8렄 50빁긩갋긭깈깛묈뱷쀌궼릱뮰멏궬궚릣빟멄뛀궞궎궸궇귡땺묈궶뙱뽿뺎뫔럮귏궳둇듶벞쁇궳믅궣귡`럖볦뎋귩릕궺궫궢, 궩궻룋궳빟쁝렔벍롌볦뎋뛊뤾궴맻둇}뽩귩럨@궞귪궸궭궼궬궯궫. 궩궢궲뚞뚣 1렄궸뷨됞뙱룊묈룷궳 “볦뻢(볦뻢)듫똚뵯밯궴빟쁝붖뎗궻궫귕궻먬뙻”궸룓뼹궞귪궸궭궼궬궯궫.
렄듩귩궠궔궻귍귡궴, 긩갋긭깈깛묈뱷쀌궕빟뤿궸뵯궰궻궸먩뿧궯궲볦뫀맠{뛼댧뱰떿롌궼 “맠{궼맻둇듶볦뎋궻멟궻룕듗궬궚궶궵궳뻢뮝멞궴덇룒궸댿`귩둎뵯궥귡똶됪귩볦뻢롵]됵뭟궳_땉궥귡궫귕궸뻢뫀궴떐땉궥귡뺴댡귩뙚뱼궢궲궋귡”궴뙻궯궫궢,
”먃뒧묇궼듰뜎먐뽿뚺롊궕딈멳럱뿿귩믯떉궢궲럀떾럱뙶븫궕띿맟궢궫땉묋귩뱘묇궳묉2렅볦뻢롵]됵뭟땉묋궳궇귡 “뻢댿`떎벏둎뵯”뺱궘뾭댰궢궲_땉댡뙊궳믯댡궢궫.” (뙉뒮뭷돍 2007봏 12뙉뜂)
궢궔궢 9봏멟궸긌갋긢긙깄깛맠{궕궩궎궬궯궫귝궎궸, 긩갋긭깈깛맠{귖볦뻢(볦뻢) 떎벏댿`둎뵯궸묈궖궶듫륲귩뭫궖궶궕귞귖궋궡댿`둎뵯럷떾귩릢릋궥귡궞궴궼궳궖궶궔궯궫. 궩궻귦궚궼, 귺긽깏긇궕뫮뻢똮띙맕띥[뭫귩닾궯궲궋귡궫궋궲궋, 댿`둎뵯럷떾궕븉됀궠귩긩갋긭깈깛맠{궻뱰떿롌궫궭궕귝궘빁궔궯궲궋귡궔귞궬.
뜞볦뫀궻맠{뱰떿궴듫쁀딃떾궫궭궸궼뻢뫀궻댿`둎뵯럷떾궸듫궥귡륃뺪궕~먑궠귢궲궋귡. 궢궔궢볦뫀맠{궼뻢뫀궻댿`둎뵯뽦묋궸듫궥귡럱뿿귩댌궎맠{뒸뿻궴뼬듩먭뽩됄궫궭궸듫쁀륃뺪귩뚺둎궥귡궞궴궕궳궖궶궋귝궎궸뗕궣궲궋귡.
뻢뫀궻댿`둎뵯뽦묋궸듫궥귡륃뺪궕뙻_}뫬귩믅궣궲뭢귞귢귡궞궴궕궳궖궶궋귝궎궸롏뭚궢궲궋귡궻궬. (렄럷긙긿[긥깑 2006봏 1뙉 5볷듫쁀딯럷랷뤖) 궞귢궼귺긽깏긇궻똮띙맕띥[뭫궸룈돒궥귡볦뫀맠{뱰떿궕댿`둎뵯럷떾귩}됳궳볦뻢(볦뻢)똮띙떐쀍귩뙂믦밒궸릋밯궠궧궲뱷덇똮띙딈붦귩뭱뤻궥귡됀맜귩렔귞롏뭚궢궲궋귡궞궴귩뙻궯궲궘귢귡.
뙻궎귏궳귖궶궘, 뻢(뮝멞)궼귺긽깏긇궕똮띙맕띥[뭫귩궦궯궴댸렃궥귡듩댿`귩둎뵯궥귡궞궴궕궳궖궶궘궲뵜묈궶똮띙밒뫗렪귩뷀궯궲궋귡. 긚긞긏`긅깛깇]깛궳뙱뽿귩맯럀궢럑귕궫뜝뻢(뮝멞) 똮띙묆뭖궼긆깋깛_긶귽긐귩뻂뽦궢궫. 1998봏 11뙉 23볷궻럅럷궬궯궫.
긶귽긐뻂뽦궼긆깋깛_먐뽿딃떾궴귽긎깏긚먐뽿딃떾궕뜃띿궢궫뫝뜎먒딃떾궴궢궲맊둉 6묈먐뽿딃떾궻뭷궿궴궰궻깓깉깑긤긞긟귻긚긃깑(Royal Dutch Shell) 긶귽긐{롊귩릕궺궲뻢(뮝멞)궻댿`귩둎뵯궥귡궫귕궻뱤럱뽦묋귩떐땉궥귡궫귕궻궞궴궬궯궫궕(뭷돍볷뺪 1998봏 11뙉 24볷),
뻢(뮝멞) 똮띙묆뭖궼귺긽깏긇궻똮띙맕띥[뭫궸궕깓}긞긏긭깈롨귆귞궸딞궯궫. 뻢(뮝멞)귩렩쓃궶똮띙맕띥[뭫궳뚄뿧, 댊랤궢귝궎궴궥귡귺긽깏긇궼릱뮰멏궬궚댿`궳뙱뽿돽둰쀫귢뿇궭럑귏귟렔빁궫궭궻똮띙맕띥[뭫궕뼰쀍돸궠귢귡궞궴귩]귏궶궔궯궫궻궬.
땸귡렄딖뻢(뮝멞)궳뙱뽿뭈뜽뒋벍귩궢궫둖뜎딃떾궫궭궼긚긂긃[긢깛궻^긂깑긚긄긨깑긎[(Taurus Energy), 긆[긚긣깋깏귺궻뷈궑븊궚긻긣깓[깏귺(Beach Petroleum), 귽긎깏긚궻땷궢궲귽깛^|긥긘깈긥깑(Soco International)궬. 귝궘 “긚[긬[긽[긙긿[(Supermajor)”궴궋궎긦긞긏긨[궴뚁궽귢귡맊둉 6묈먐뽿딃떾궳궼궶궘
뭷듩땳먐뽿딃떾궫궭궕, 궩귢귖뻢(뮝멞)궻뙱뽿둎뵯럷떾궳궼궶궘뙱뽿뭈뜽뒋벍궸룺궢궻듩듫^궢궫귦궚궼, 귺긽깏긇궻똮띙맕띥[뭫궕뻢(뮝멞)궻댿`둎뵯럷떾궸뫮궥귡둖뜎딃떾궻뱤럱귩뗕궣궲궋귡궔귞궬. 1997봏궸귺긽깏긇궻긄긨깑긎[둎뵯됵롊긚^깛긣깛긐깑[긵(Stanton Group)댥뻢(뮝멞) 댿`둎뵯럷떾궸뱤럱궢귝궎궴럙궯궫궕똮띙맕띥[뭫궸궔궔궯궲뭷뭚궢궫궞궴귖궇귡.
뙱뽿럫릫뛇덇궰귩궘궙귡궻궸 700뼔긤깑궔귞 1먪뼔긤깑궕볺궯궲뛱궘. 뙱뽿귩궥궘궋뤵궛귡땺묈궶둇뤵몾븿(oil rig)귩뙕먠궢귝궎궴궥귢궽 1돪-2돪긤깑궕볺궯궲뛱궯궲, 볦뎋궔귞긂깑귏궳 200km 뮮궠궻몭뽿듖귩먠뭫궢귝궎궴궥귢궽띍룷 1먪돪긂긅깛댥뤵궻뙕먠뷂궕볺궯궲뛱궘. 궞궻귝궎궸뵜묈궶럱뗠궕볺궯궲뛱궘댿`둎뵯럷떾귩릢릋궢귝궎궴궥귢궽, 궶궸귝귟귖귺긽깏긇궕뻢(뮝멞)궸돿궑궲뿀귡똮띙맕띥[뭫귩뎘땦궸뭷~궢궶궚귢궽궶귞궶궋.
궴궞귣궳궩귢믴궕궯궭귟궢궲궋귡귝궎궸뙥궑궫똮띙맕띥[뭫궼뜞뺯귢귡뮎궢귩뙥궧궲궋귡. 뷄둱돸궕릋밯딵벞궸뤵궕궯궫궔귞궬. 뷄둱돸 2뭝둏궸뿧궭볺귡궴, 귺긽깏긇궼뻢(뮝멞)궸뫮궥귡 “긡깓럛뎴뜎” 럚믦귩됶룣궢궶궚귢궽궶귞궶궋궻궸, “긡깓럛뎴뜎” 럚믦됶룣궼똮띙맕띥[뭫궕뭷~궠귢귡궞궴귩댰뼞궥귡. 뷄둱돸궕렳뙸궢궲뛱궘륃맖빾돸귩뙥먑궯궲뙥귢궽, “긡깓럛뎴뜎” 럚믦됶룣궼렄듩뽦묋궳뙥궑귡.
귖궢귺긽깏긇궕뻢(뮝멞)궸뫮궥귡똮띙맕띥[뭫귩뭷~궥귢궽, 뱦귺긙귺띍묈궻댿`귩둎뵯궥귡럷떾궼{둰밒궸릢릋궠귢귡궞궴궕궳궖귡궔? 똮띙맕띥[뭫궻뎘땦뭷~궼뼻뵏궸귖뻢뫀궻댿`둎뵯럷떾귩릢릋궥귡뷠뾴륆뙊궳궼궇귡궕[빁엸뙊궳궼궶궋.
볦뻢(볦뻢)궕댿`둎뵯럷떾귩{둰밒궸릢릋궢귝궎궴궥귢궽, “뼬뫎똮띙궻뗉뛲밒뵯밯궴떎벏궻붖뎗궻궫귕궸똮띙떐쀍럷떾귩뚺뿕뚺뎑궴뾎뼰몜믅궻뙱뫁궳먑뗂뒋맜돸궢궲렃뫏밒궸둮묈, 뵯밯궠궧궲뛱궘궞궴궸” 뜃땉궢궫 10.4 먬뙻귩귏궣귕궸뿗뛱궢궶궚귢궽궶귞궶궋.
궢궔궢륷궫궸뱋뤾궢궫뿘뼻뵊맠뙛궼 10.4 먬뙻귩궩궯귎귩뛀궖궶궕귞 “뷄둱둎뺳 3000 몒”궸궴귞귦귢궥궗궲궋귡. “뷄둱둎뺳 3000 몒”궼 6.15 떎벏먬뙻궴 10.4 먬뙻궸봹뭫궠귢귡뫮뻢맠랉궬. 궞귪궶뼩뿆궳럙궑궽, 뻢뫀궕 6.15 떎벏먬뙻궴 10.4 먬뙻귩궩궯귎귩뛀궘뿘뼻뵊맠뙛궴댿`둎뵯럷떾귩떎벏궳릢릋궥귡됀맜궼뙥궑궶궋.
궫궴궑귺긽깏긇궻똮띙맕띥[뭫궕뭷~궠귢귡궴뙻궯궲귖, 뿘뼻뵊맠뙛궕 6.15 떎벏먬뙻궴 10.4 먬뙻귩뿗뛱궥귡멟뛀궖궶뫴뱗귩뙥궧궶궋뙽귟, 댿`둎뵯럷떾궻뙥뜛귒궼븉벁뼻궬귣궎.
5. 뱷덇궠귢궫뜎궼먐뽿븑뜎궬
땸귡 20맊딬궸귺긽깏긇궼먐뽿럱뙶귩먩뛱둳벦, 뤆닾궥귡궞궴궳맊둉똮띙귩럛봹궢럑귕궫. 믧뜎롥`먐뽿럱{궫궭궳궇귡긄긏깛긾긮깑(Exxon Mobil), 쁯듶(Gulf), 긡긌긖긓(Texaco), 긚긃긳깋깛(Chevron), 깓깉깑긤긞긟귻긚긃깑(Royal Dutch Shell), 긮긯(BP)궕 1920봏묆뼎궔귞멣맊둉먐뽿럱뙶귩럷렳뤵럛봹궢궲뿀궲궋귡.
맊둉밒붝댪궳먐뽿궻둎뵯, 맱뽿, 붛봽궼 6묈먐뽿딃떾궕귌궴귪궵벲먫궢궫귝궎궸궢궫. 붯귞궻벲먫궴봢뙛궸뮛먰궥귡딃떾됄궼귽^깏귺뜎뎑긄긨깑긎[됵롊몟띥궬궯궫긄깛깏긓}긡귽(Engico Mattei, 1906-1962)궻귝궎궸^뽦궻뷅뛱@뵚뵯럷뚉궳뼺귩렪궯궲, 붯귞궻벲먫궴봢뙛궸뮛먰궥귡맠뙛궼긲긜귽깛맠뙛궻귝궎궸븧쀍륬뛘궳]븹궥귡.
먐뽿궼럱{롥`럖뤾똮띙궻맟뮮벍쀍궴벏렄궸, 믧뜎롥`벲먫럱{궕궢궯궔귟닾귟궢귕궫덇붥뢣뾴궶룮뷼궴궋궎_궳, 뫜궻뭤돷럱뙶궴럅빁궚궠귢귡뷄륂궸벫빶궶벍쀍럱뙶궬. 먐뽿럱뙶귩롨궸볺귢귡궫귕궻븮궶궚귪궔궕맊둉궇궭궞궭궳둎궘귦궚궕궩궞궸궇귡.
궩귢궶귞뭞(듰뜎)궻먐뽿롿땵륉떟궼궵궎궬궔? 긄긨깑긎[똮띙뙟땰@궻뺪뜍룕궸귝귡궴, 2007봏뭞(듰뜎)궻긄긨깑긎[몟롿뾴궳먐뽿궻먫귕귡붶뢣궼 45%궳궇귟, 2007봏봏듩먐뽿뤑뷂쀊궼 7돪8먪930뼔긫깒깑궬. (쁀뜃긦깄[긚 2007봏 12뙉 16볷)
듫먆뮕뺪뜍룕궸귝귡궴, 2007봏봏듩뙱뽿뢁볺뒂궼 603돪2먪400뼔긤깑궬. (쁀뜃긦깄[긚 2008봏 2뙉 2볷) 2006봏귩딈궳뭞(듰뜎)궻 1릐뱰귟먐뽿뤑뷂쀊궼맊둉 5댧궳궇귟, 뷄럀뽿뜎궻뭷궳맊둉 2댧궳궇귟, 귺긙귺궳궼 1댧궬. (깗깑긚긣깏긞]긩깑 2008봏 1뙉 3볷)
궴궞귣궳쀎궻쁀뜃궕뢯궢궫뺪뜍룕궸귝귡궴, 뭞(듰뜎)궻먐뽿먇롢럚릶(Oil Vulnerability Index)궼긲귻깏긯깛궸덙궖뫏궖맊둉 2댧궬. 먐뽿뤑뷂쀊궼맊둉 5댧궬궕, 먐뽿먇롢럚릶궕맊둉 2댧궴궋궎럷렳궼, 묉3렅먐뽿봥벍궕딳궖귡뤾뜃뭞(듰뜎) 똮띙궕뺯귢귡뭭뼺밒궶딅뙬궕若궯궲궋귡궞궴귩댰뼞궥귡.
뜎띧뙱뽿돽둰궕럍뤵룊귕궲긫깒깑뱰귟 100긤깑귩뎭궥뛼뗴뛱릋귩덙궖뫏궖궶궕귞귺긽깏긇궻뗠뾝럖뤾궕됡뤺륪뾭봨]궸쓪귢귡궴, 먐뽿먇롢맜궴뗠뾝먇롢맜궸뫉궕뵛귞귢궫뭞(듰뜎) 똮띙궼뫂뜌궳뛼븿돽궴믟맟뮮궻뜃빘딅@궳궇귡긚긡긞긏긵깑깒귽긘깈깛(stagflation)궻떚|궸뺕귞귦귢럑귕궫.
벫궸뜎띧뽿돽뤵뤈궼뭞(듰뜎)궻룑뼬똮띙귩돓궠궑븊궚귡븿돽븴뱳궻띍묈뾴덓궸궶궯궫. 듰뜎뗢뛱뺪뜍룕궸귝귡궴, 뭞(듰뜎)궻멣뫬롿뚿븿궕뤵뤈뿦 1.7%궔귞 60% 댥뤵귩먫귕귡띍묈뤵뤈뾴덓궼뜎띧뽿돽뤵뤈궬. (쁀뜃긦깄[긚 2007봏 11뙉 14볷)
뭞(듰뜎)궻똮띙됄뛼븿돽궴믟맟뮮궻뜃빘딅@궔귞묮궢귝궎궴궥귢궽, 묈^됋귩봽귡뱆쁉귩궥귡궻궳궼궶궘볦뻢(볦뻢) 떎벏뙱뽿둎뵯귩릢릋궢궶궚귢궽궶귞궶궋. 볦뻢(볦뻢)귩뺧뒊궥귡궫궋궲궋(뮝멞)뵾뱡멣뫬붝댪궳딳궖귡 21맊딬똮띙븳떩궻t뼻궼귖궎긚긞긏`긅깛깇]깛궳뼻귡궔궯궫. 뻢뫀궻{둰밒궶뽿밹둎뵯궼궫궋궲궋(뮝멞)뵾뱡륃맖귩빾궑귡궧귟귅뺊궸궶귡궳궢귛궎.
뻢(뮝멞)궕뱦귺긙귺띍묈궻뙱뽿뺎뫔럮귩궦궋귆귪멟궸뙥궰궚궲, 1998봏 5뙉궔귞긚긞긏`긅깛깇]깛궳뙱뽿귩맯럀궢궲뿀궲궋궶궕귞귖붯궸듫궥귡륃뺪귩둖븫궸뚺둎궢궶궋귦궚궼, 궩궻먐뽿럱뙶궕뱷덇궠귢궫뜎궻렔뿧똮띙귩뷅뽸밒궸뵯밯궠궧귡귏궞궴궸묈럷궶먰뿪럱뙶궬궔귞궬.
뻢뫀궳둎뵯궠귢귡뱦귺긙귺띍묈댿`궼, 렔롥밒빟쁝뱷덇귩렳뙸궢궫륷궢궋뜎궳맯궖궲뛱궘궫궋궲궋(뮝멞)뼬뫎궕 21맊딬뱷덇똮띙뵯밯궻궫귕궸뺎뫔궢궲궓궋궫묈럷궶뼟뿀럱뙶궬. }[긙궶궘궲궞궻뭤궸뱷덇맠{궕뿧궲귞귢귢궽, 됦궕뜎궼뫜궻뜎궕멇귔귌궵뻃궔궶먐뽿븑뜎궸궶귡궳궢귛궎.
랷뤖궳귝궘뙥귢궽, 긻깑긘귺궬궚뎵듶궸궋귡 6뙿럀뽿뜎궼먐뽿귩뾃뢯궢궲뻽뢙 50돪긤깑궦궰먑궋궳궋귡궢, 2007봏덇봏궻듩먐뽿뾃뢯뜎@(OPEC)궕먐뽿뾃뢯궳먑궋궬뢁뎧궼룺궶궘궴귖 6먪880돪긤깑귖궶귡. (쁀뜃긦깄[긚 2007봏 11뙉 29볷)
귺긽깏긇궻뫮뻢똮띙맕띥[뭫궕뎘땦궸뭷~궠귢궫댥뚣룶뿀묉3렅띍뛼딅}됵뭟궕둎궔귢귡볷, 뙱뽿귩떎벏둎뵯궢궲뜎궻뱷덇똮띙귩딳궞궩궎궴볦뻢(볦뻢) 롵]궕뜃땉궥귡렄, 궇궻렄룊귕궲먐뽿븑뜎귩뛀궚궫궫궋궲궋(뮝멞)뼬뫎궻먛렳궶룋]궼궔궶궎궳궢귛궎.
서프라이즈 :북한 석유 매장량 동아시아 최대?
(확실히 북한은 자원이 많습니다. 무려 석탄매장량이 한국의 63~64배이닌깐요)
숙천유전에서 밝아오는 석유부국의 여명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동아시아 최대의 원유저장지
2.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숙천유전
3. 누가 유전개발사업을 가로막았는가?
4. 유전개발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까닭
5. 통일된 나라는 석유부국이다
1. 동아시아 최대의 원유저장지
1998년 10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방북길에 오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기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고 있었다.
기자 - "김정일 총비서를 언제 만나 무슨 얘기를 할 예정인가?"
정 회장 -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를 의논할 생각이다. 특히 북한연안에서 석유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석유를 남북이 협력하여 개발해 모두 풍요롭고 유복한 시대를 맞기 바란다."
당시 여든 세 살이었던 노자본의 머리 속에서는 유전개발의 꿈이 맴돌고 있었다. 정주영이 머리 속에 그렸던 유전개발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가 북측의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까닭은, 한 해 전인 1997년 10월 북(조선)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조선유전 공식설명회"를 통하여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 설명회에는 현대그룹은 물론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엘쥐(LG)그룹도 관계자를 파견한 바 있었다.
북측이 그 설명회에서 공개한 것은 1996년 여름에 작성한 유전개발에 관한 영문보고서이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현재 1만3천 평방km에 이르는 서조선만 분지에 원유시추공 13개를 뚫었고, 2천 평방km에 이르는 안주 분지에는 원유시추공 세 개를 뚫었으며, 3천500 평방km에 이르는 동조선만 분지에는 원유시추공 두 개를 뚫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북측이 원유매장량을 최소 588억2천400만 배럴에서 최대 735억3천만 배럴로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1997년 1월 2일) 1997년 9월 캐나다 캔텍(Kantech)사는 서조선만 분지에 400억-50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북(조선)에 관해서 편파적 보도에 익숙한 남측언론들은 북측의 원유매장량을 12억 배럴이니 50억 배럴이니 하면서 터무니없이 축소하여 보도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의 원유매장량이 50억 배럴이고, 중국이 자랑하는 발해만 유전의 매장량이 150억 배럴인데, 북측의 원유매장량이 최소 500억 배럴 이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 석유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6개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릿연합,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인데, 그 나라들의 원유매장량을 보면 이렇다.
세계에서 원유매장량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2천643억 배럴이고, 쿠웨이트가 990억 배럴, 아랍에미릿연합이 970억 배럴이다. 중동 산유국이라 해도 카타르의 원유매장량은 150억 배럴, 오만은 50억 배럴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2006년도 세계 산유국 순위에서 9위에 오른, 라틴아메리카의 최대 산유국 베네주엘라의 원유매장량은 800억 배럴이다.
북(조선)의 원유매장량이 북(조선)이 발표한 최대 추정치인 735억 배럴에 이른다면, 북(조선)은 베네주엘라에 이어서 세계 10위의 산유국이 될 것이다.
2006년도 세계 산유국 순위에서 13위에 오른 브라질의 유전현황을 살펴보아도, 북(조선)의 유전개발이 얼마나 큰 정세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2007년 11월 9일 브라질은 자국 영해에서 원유저장지(oil reservoir)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추정 매장량은 300억 배럴이다.
북(조선)의 원유저장지와 비교해서 절반 정도의 매장량밖에 되지 않는 원유저장지를 찾아냈고, 그것도 북(조선)에 있는 것과 같은 대륙붕 원유저장지가 아니라 심해 원유저장지인지라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터인데도,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베네주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하려고 한다. 유전개발이 국제적 위상을 바꿔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10월 유전개발을 꿈꾸며 방북길에 오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북측이 1998년 5월부터 안주 분지에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안주 분지에 관한 정보는 "한겨레"가 1999년 1월 7일에 보도한 바 있다.
북측이 안주 분지에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던 무렵인 1998년 5월 7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자리잡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최홍건 산업자원부 장관(당시)을 비롯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 제2유화단지 준공식을 거행한 것이다.
현대석유화학은 연산 100만 톤 체제를 갖춘 남(한국) 최대 석유화학업체로 부상하였다. (문화일보 1998년 5월 8일) 그 무렵 남(한국) 최대 석유화학업체를 건설한 정주영에게 북(조선)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1998년 1월 7일 재일한국인총련합회(총련)가 공개한 현장사진에 나오는 북측의 원유시추선은, 서조선만 분지에서 해저유전이 개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유매장량을 비교하면, 아래에서 자세히 논할 안주 분지의 지상 원유저장지보다 서조선만 분지에 있는 해저 원유저장지가 훨씬 더 크다. 서조선만 분지에 있는 해저 원유저장지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실상이 드러난다.
2004년 2월 중국 국무원은 발해 분지를 "해양공능구획"으로 지정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10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텐진 앞바다 발해 분지에서 새로운 해저 원유저장지를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오늘,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발해만 유전에서 하루에 130만 배럴씩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발해만 유전을 발견한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해저 원유층(oil bed)을 따라서 발해만 입구에서 한(조선)반도 쪽으로 북황해 분지에서 계속 원유탐사를 진행해 나가던 중 마침내 거대한 원유저장지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유저장지는 동경 124도의 동쪽 해역, 다시 말해서 북(조선)의 남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북(조선) 영해인 서조선만 분지에 있었다.
서해는 좁고 얕은 바다이다. 평균수심은 44m이고 최저수심은 103m이며, 동서 최장거리가 약 700km이므로, 북(조선)과 중국이 서해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서로 그으면 그 경계선이 서로 겹치게 되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조선)의 서조선만 분지와 중국의 북황해 분지는 잇닿아있으며, 중국의 해저원유층과 북(조선)의 해저원유층은 바다밑 땅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2005년 10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66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있는 거대한 원유저장지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당국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조중 두 나라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원유가 묻혀있는 동아시아 최대 원유저장지이다. 그 원유저장지의 존재는 중국이 "2004년 말 이미 90%에 가까운 확증을 얻은 이래 2005년 1년 동안 다각적인 조사를 거듭해온 결과 내린 결론"인 것이다. (시사저널 2006년 1월 5일)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005년 12월 24일 북(조선)의 로두철 부총리와 중국 국무원 에너지담당 쩡페이옌 부총리가 "해상에서의 원유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 협정내용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중 두 나라가 동아시아 최대 해저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조중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해저유전이 어느 광구에 속한 것인지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북(조선)이 서조선만의 드넓은 광구 전역을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영해에 잇닿은 접경해역의 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중국 언론은 북황해 분지에서 원유저장지를 발견하였다고 세상에 알렸지만, 사실 북(조선)은 이미 1970년대에 서조선만 분지에서 원유저장지를 발견하였다. 그 실상은 아래와 같다.
북(조선)이 동유럽 최대 산유국인 루마니아에서 원유시추기를 수입한 해는 1970년이다. 북측은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때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제 원유시추기를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자체 기술로 원유탐사선 "유성호"를 만들었다.
1975년에 "유성호"는 안주 분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제303호 광구를 비롯한 세 개 광구에서 땅밑 2천500m까지 파 내려가 원유를 찾아냈고 하루 70배럴씩 시험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유황성분이 적은 질 좋은 원유였다.
원유탐사에 성공한 북측은 장차 자국산 원유를 정제한 휘발유로 달릴 자동차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승용차 시제품이다. 그 시제품은 독일제 승용차 벤츠 200과 외형이 비슷하게 생겼다. (일요서울 1998년 11월 12일)
1998년 5월 영국의 석유기업 소코 인터내셔널(Soco International)은 북(조선)과 유전탐사계약을 맺고 북(조선)이 보유한 원유시추기 성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부품을 공급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북측은 1998년 9월에 설치하였던 원유공업총국을 원유공업성으로 승격하면서 유전개발사업을 본격화하였다.
그런데 북측의 해저 원유층은 서조선만 분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조선만 분지에도 있다. 서조선만 분지는 북(조선)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동조선만 분지는 북(조선)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2000년 7월 19일 러시아연방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채택, 발표한 조러공동선언에는 "대규모 협조계획의 작성사업을 적극화할 데 대하여 정부 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조선측과 로씨야측 위원장들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지목한 일곱 개 분야 가운데 원유분야를 포함시켰다.
2.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숙천유전
그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남측언론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북(조선)은 자체로 원유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산유국이다. 평범한 산유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최대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는 산유국이다.
서조선만 분지와 동조선만 분지에 묻혀있는 막대한 원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북(조선)은 동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북(조선)은 안주 분지에서 유전을 개발함으로써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였다. 안주 분지에 있는 유전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짚으면, 평안남도 숙천군이다.
지도를 보면, 평양 서북쪽으로 평원군이 인접해 있고, 평원군 북쪽에 숙천군이 있다. 숙천군 서해연안지대에 남양이라는 지명이 눈에 띄는데, 이 글에서 숙천유전이라고 부르는 지상유전은 바로 그 남양 일대에 있다. 남측언론에서는 숙천군과 덕천군을 혼동하기도 하고, 숙천유전을 지상유전이 아니라 숙천군 앞바다에 있는 해저유전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1990년대에 북측을 오가며 경제협력사업에 손을 댔던 재미동포 사업가 김찬구가 2005년에 서울에서 출판한 책에 실려있는 한 장의 사진은 숙천유전에서 가동되는 유정양유기(oil well pumping unit)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벼가 푸르싱싱하게 자란 넓은 논 건너편에 있는 유정양유기를 촬영한 현장사진이다.
그 사진에 나온 유정양유기는 대영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ica) 인터넷판에 실린, 마치 커다란 메뚜기처럼 생긴 유정양유기와 닮은꼴이다. 그 현장사진은 숙천유전의 존재를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준 사진자료일 것이다.
남측언론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숙천유전에서는 연간 220만 배럴(약 3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시사저널 2006년 1월 5일) 숙천유전에서 1999년에 생산한 연간 220만 배럴의 원유는,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석유를 아껴 써야 하였던 북측에서 소비한 연간 석유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양이었다.
남측언론에 따르면, 숙천군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덕천군에서도 유전개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2001년 5월 28일) 이것은 북측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숙천군과 덕천군을 포함하는 안주 분지 곳곳에서 지상유전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북(조선)의 원유수입량 변화추이를 밝혀주는 남(한국)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측의 원유수입량은 1980년에 1천539만3천 배럴이었고, 1990년에 1천847만2천 배럴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원유수입량이 급감하였다.
원유수입량은 1997년에 370만9천 배럴, 1998년에 369만4천 배럴, 1999년에 232만5천 배럴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경제회복기에 들어선 2000년대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의 원유수입량은 2001년 424만4천 배럴, 2005년 408만6천 배럴, 2006년 384만1천 배럴이었다. (연합뉴스 2008년 1월 13일) 이러한 변화추이는 2001년 이후 원유수입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측이 경제회복기를 지나 공업생산량을 늘이고 있으므로 석유소비량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2001년 이후 원유수입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북측의 공업화수준에 상응하는 원유수입량은 1990년대의 평균수입량인 1천800만 배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2006년의 원유수입량은 고작 384만 배럴밖에 되지 않는다.
그 동안 북측이 수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에너지소비에서 석유비중을 줄였다고 해도, 원유수입량과 원유수요량의 엄청난 차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2006년에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원유 384만 배럴을 가지고서는 북측이 도저히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384만 배럴밖에 되지 않는 원유를 사들이고서도 경제를 움직이는 "비결"은, 자국산 원유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숙천유전에서 연간 2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9년이나 지난 오늘, 북측의 원유생산량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음이 분명하다.
놀라운 것은, 북(조선)이 다른 나라에 석유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1년 현재, 북(조선)은 중국, 일본, 태국, 프랑스에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석유를 수출하였다. (조선일보 2002년 1월 26일)
북측의 원유생산량이 늘어나 유류사정이 크게 좋아졌다는 사실은 2008년 1월에 실시한 한국인민군 동계훈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남측의 군소식통은 2008년 1월 중순에 실시한 한국인민군 공군 동계훈련에서 하루에 170여 회나 출격하는 등 1995년 이후 13년만에 전투기 일일 출격횟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연합뉴스 2008년 2월 21일)
또한 한미 군정보당국은 국제유가가 폭등하였는데도 한국인민군 기갑사단의 기동훈련이 늘어난 까닭이 군부대의 유류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연합뉴스 2008년 2월 10일)
그와 다르게, 한국군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오를 것에 대비해 2007년 1월에 4단계 유류통제계획을 세웠고, 군부대 훈련을 통합하고 공군 비행훈련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왔는데,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 군의 임무수행은 불가능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2007년 11월 9일)
3. 누가 유전개발사업을 가로막았는가?
1998년 10월 30일 밤 10시 25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둠이 내린 평양의 백화원초대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정주영 명예회장과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5분 동안 정주영 명예회장과 일행을 접견하였다. 남측언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고 전하였다. 접견자리에서 오간 대화내용 가운데 아래와 같은 대목이 눈길을 끈다.
정 회장 - "북한에는 석유가 난다지요?"
김 위원장 - "납니다."
정 회장 - "북한 기름을 남한에 꼭 보내주십시오. 파이프라인만 서해안을 통해 남한으로 오면 그것이 통일의 길입니다."
김 위원장 - "그렇습니다. 다른데 하고 할 것 있습니까. 현대하고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밤 11시 10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백화원초대소를 떠나면서 "언제 또 오실 것인지. 길이 터졌으니 자주 오십시오"라고 인사말을 건넸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기름만 보내주신다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고 말하였다. (조선일보 1998년 11월 3일)
1997년 11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남측경제와 1994년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움을 겪은 북측경제가 민족공동번영의 길로 성큼 들어설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사업은, 1998년 10월 30일 밤늦은 시각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첫 걸음을 떼고 있었다.
만일 백화원초대소의 약조가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동아시아 최대 유전에서 퍼올리는 원유는 남측 경제와 북측 경제에 힘찬 성장동력을 공급하면서 통일경제기반을 마련하였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사업이 감격스러운 첫 걸음을 떼었던 바로 그 날, 뜻밖에도 서울에서는 그 걸음을 가로막으려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1998년 10월 30일 오후,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을 접견하면서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사업을 협의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조지 테닛(George J. Tenet)이 부국장을 비롯한 일행 다섯 명과 함께 청와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대중 대통령과 비밀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한겨레 1998년 10월 30일)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부국장까지 대동하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제기되었을 때 벌이는 비밀행각이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겨레"의 사진기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테닛의 모습을 우연히 촬영하는 바람에 그의 비밀행각이 드러나고 말았다. 당황망조한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들은 "한겨레"에게 테닛을 찍은 필름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소동을 벌였다.
김대중과 테닛의 청와대 비밀회담에서 논의된 여러 현안들 가운데는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사업에 관한 현안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테닛은 북측의 유전개발에 참여하려는 정주영을 저지하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김대중과 테닛의 청와대 비밀회담이 있은 때로부터 사흘 뒤에 청와대를 찾아간 정주영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한 태도, 그리고 그 직후에 남측정부당국이 북측 유전개발문제에 대해서 취한 방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김대중과 테닛이 청와대에서 비밀회담을 가졌음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주영과 일행은 1998년 10월 31일 평양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판문점에 이르러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유전개발의 꿈을 눈에 그리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평양이 기름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나는 기름을 남한에 보내달라고 했고, 장군은 그렇게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어떻게 기름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가설작업을 곧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 자리에 배석한 김윤규 현대그룹 대북사업단장(당시)은 "북한 조사로는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유전개발을 정식 제안하고 매장량 등을 다시 조사해 본 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1998년 11월 2일)
북측 유전개발에 관한 정주영의 기자회견 발언이 전파를 타고 남측 전역에 전해졌을 때, 그 낭보는 석유부국을 향한 세간의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기에 넉넉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 2일 그러한 기대와 희망은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날 청와대 접견실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을 접견하였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이렇다.
김 대통령 -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 회장 - "평양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파이프를 연결해 석유를 공급하겠다고 북측이 약속했습니다."
김 대통령 - "기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몽헌 (현대아산그룹 회장) - "가능성은 잘 모르지만 아태평화위원회측이 개발참여를 요구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름이 생산되면 남쪽에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 명예회장께서 남한신문에 공개해도 좋으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김 대통령 - "미국 탐사회사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 "아태평화위 책임자들은 기름이 나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중국 발해만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지층구조가 평양까지 연결돼 상당량이 매장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국방위원장도 미국에서 탐사제의가 많다고 했고, 사진을 보니 기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 - "그런 것은 장차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다녀온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정몽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으니 모든 게 잘됐거니 생각했는데, 아태평화위에서 만나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 명예회장께서 연세도 드시고 몸이 불편하시니 초대소에 들렀다고 하면서 주로 기름 얘기를 했습니다."
정주영 일행으로부터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사업의 길이 열렸다는 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대통령의 반응은 너무도 싸늘하였다.
"세계일보" 1998년 11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정주영은 마음이 상하여 접견시간 35분 동안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이자 현대아산그룹 회장인 정몽헌이 설명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싸늘한 반응이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저지방침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통일부장관은 반북성향을 지닌 강인덕이었다. 강인덕은 정주영이 두 번째로 소떼를 몰고 방북길에 올랐던 1998년 10월 29일 기자들에게 "북한 석유개발 문제는 현대로부터 듣지 못한 얘기다.
북한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도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다가 11월 2일에 와서 강인덕은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면서 "현대가 (통일부와) 모든 것을 상의했다"고 말을 바꿨다. 남측 언론은 "정부가 현대의 합의를 마지못해 추인하는 인상을 풍겼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일보 1998년 11월 3일)
정주영 일행이 방북하기 직전에 통일부가 마지못해 추인해 준 현대그룹의 북측 원유개발 참여문제는, 김대중과 테닛이 청와대에서 비밀회담을 가진 직후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지시에 의해서 가로막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북남) 공동원유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저지방침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1998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확인되었다.
그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서) 석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하지도 않으며 나오더라도 경제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도 석유가 부족한데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서 알려져 있다. 어제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다.
남측 언론은 1998년 11월 3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통일부가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언급한 유전개발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승인해주지 않을 방침"을 정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1998년 11월 4일)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전개발참여를 가로막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저지방침에 가로막혀 유전개발사업에 나설 수 없게 되자, 현대그룹은 금강산관광사업만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승객 826명을 태운 금강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방북출항의 뱃고동을 울리며 동해항에서 장전항으로 떠난 날은 1998년 11월 18일이었다.
원유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랐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001년 3월 21일 여든 여섯 살을 일기로 별세하였고, 현대아산그룹 회장 정몽헌은 대북송금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압박강도를 높인 검찰과 언론의 집중공세를 견디지 못하여 2003년 8월 4일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숙천유전은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남측 정부당국이 북측 유전개발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방침을 지속함에 따라 언론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져갔다.
4. 유전개발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까닭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사업을 저지하였던 때로부터 어느덧 아홉 해가 흘렀다. 그 사이에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노무현정권이 등장하는 정세변화가 있었다.
9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일행을 접견하고 유전개발사업을 협의하였던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마주 앉았다. 2007년 10월 3일의 일이었다. 그날 오후 2시 45분부터 속개된 최고위급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유전개발문제를 거론하였다.
김 위원장 - "남측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유전과 가스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탐사기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 - "마찬가지입니다. 북측 내 유전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한만 유전과 단천 지하자원 개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 - "개성공단도 아직 다 안 됐는데 북쪽 땅을 다 차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수뇌의 회담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남측언론이 보도한 위의 회담내용은 그 자리에 배석한 남측 정부관리의 입을 통해서 크게 축약된 형태로 전해진 것이다. 남측 언론이 짤막하게 보도한 위의 회담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위급회담에서 유전개발문제를 논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물음에 답하지 않고 "서한만 유전"을 지적하면서 북측의 유전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자본과 기술에 관한 회담자료를 미처 준비해오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였을 수도 있다.
그가 "서한만 유전"이라고 말한 것은 서조선만 유전을 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단천의 지하자원이란 단천에 있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를 뜻하는데, 이 글에서는 유전개발문제만 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조선만 유전과 단천 마그네사이트광산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관심을 보였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업단지 건설사업부터 제대로 진척시키자는 제안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위의 회담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서조선만 유전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에 관하여 협의한 회담내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하였다. (월간중앙 2007년 12월 호)
2007년 10월 4일 오전 8시 50분 노무현 대통령은 서조선만 수평선 너머에 있은 거대한 원유저장지까지 바닷길로 통하는 항구도시 남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평화자동자 남포공장과 서해갑문을 시찰하였다. 그리고 오후 1시에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였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남측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서해안 남포 앞의 서한만 등에서 북한과 함께 유전을 개발하는 계획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청와대는 한국석유공사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의제를 토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인 "북 유전 공동개발"안을 마련해 논의안건으로 제안했다." (월간중앙 2007년 12월 호)
그러나 9년 전에 김대중 정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북남) 공동유전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두면서도 정작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그 까닭은, 미국이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쥐고 있는 한, 유전개발사업이 불가능함을 노무현 정부의 당국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남측의 정부당국과 관련기업들에는 북측의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남측정부는 북측의 유전개발문제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정부관료와 민간전문가들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북측의 유전개발문제에 관한 정보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시사저널 2006년 1월 5일 관련기사 참조) 이것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순응하는 남측 정부당국이 유전개발사업을 매개로 남북(북남)경제협력을 결정적으로 진전시키고 통일경제기반을 축성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북(조선)은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숙천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무렵 북(조선) 경제대표단은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였다. 1998년 11월 23일의 일이었다.
헤이그 방문은 네덜란드 석유기업과 영국 석유기업이 합작한 다국적기업으로서 세계 6대 석유기업 가운데 하나인 로열덧취쉘(Royal Dutch Shell) 헤이그 본사를 찾아가 북(조선)의 유전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중앙일보 1998년 11월 24일),
북(조선) 경제대표단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돌아갔다. 북(조선)을 집요한 경제제재조치로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은 서조선만 유전에서 원유가 쏟아져 나와 자기들의 경제제재조치가 무력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시기 북(조선)에서 원유탐사활동을 벌인 외국기업들은 스웨덴의 타우르스 에너지(Taurus Energy), 호주의 비치 페트롤리엄(Beach Petroleum), 영국의 소코 인터내셔널(Soco International)이다. 흔히 "수퍼메이저(Supermajor)"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세계 6대 석유기업이 아니라
중간급 석유기업들이, 그것도 북(조선)의 원유개발사업이 아니라 원유탐사활동에 잠시동안 관여하였던 까닭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북(조선)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에 미국의 에너지개발회사 스탠튼그룹(Stanton Group)이 북(조선)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제재조치에 걸려 중단한 적도 있다.
원유시추공 한 개를 뚫는데 7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가 들어간다. 원유를 퍼올리는 거대한 해상구조물(oil rig)을 건설하려면 1억-2억 달러가 들어가고, 남포에서 서울까지 200km 길이의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건설비가 들어간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조선)에게 가해오는 경제제재조치를 영구히 중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처럼 탄탄하게 보였던 경제제재조치는 지금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핵화가 진전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비핵화 2단계에 들어서면,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경제제재조치가 중지되는 것을 뜻한다. 비핵화가 실현되어 가는 정세변화를 가늠해보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중지하면, 동아시아 최대의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경제제재조치의 영구중지는 명백하게도 북측의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남북(북남)이 유전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10.4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10.4 선언을 외면하면서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집착하고 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배치되는 대북정책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북측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과 유전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중지된다 해도, 이명박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유전개발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할 것이다.
5. 통일된 나라는 석유부국이다
지난 20세기에 미국은 석유자원을 선점, 장악함으로써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석유자본들인 엑슨모빌(Exxon Mobil), 걸프(Gulf), 텍사코(Texaco), 쉐브런(Chevron), 로열덧취쉘(Royal Dutch Shell), 비피(BP)가 1920년대 말부터 전세계 석유자원을 사실상 지배해오고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석유의 개발, 정유, 판매는 6대 석유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그들의 독점과 패권에 도전하는 기업가는 이탈리아 국영에너지회사 총재였던 엔리꼬 마떼이(Engico Mattei, 1906-1962)처럼 의문의 비행기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들의 독점과 패권에 도전하는 정권은 후세인 정권처럼 무력침공으로 전복된다.
석유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움켜쥔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하자원과 구분되는 매우 특별한 동력자원이다. 석유자원을 손에 넣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남(한국)의 석유수급상황은 어떠할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남(한국)의 에너지 총수요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며, 2007년 연간 석유소비량은 7억8천930만 배럴이다. (연합뉴스 2007년 12월 16일)
관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연간 원유수입액은 603억2천400만 달러이다. (연합뉴스 2008년 2월 2일) 2006년을 기준으로 남(한국)의 1인당 석유소비량은 세계 5위이며, 비산유국 가운데서 세계 2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월스트릿저널 2008년 1월 3일)
그런데 녹색연합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국)의 석유취약지수(Oil Vulnerability Index)는 필리핀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석유소비량은 세계 5위인데, 석유취약지수가 세계 2위라는 사실은, 제3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는 경우 남(한국) 경제가 무너질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뜻한다.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과잉신용 파탄으로 흔들리자, 석유취약성과 금융취약성에 발이 묶인 남(한국) 경제는 즉각적으로 고물가와 저성장의 합병위기인 스택플레이션(stagflation)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제유가상승은 남(한국)의 서민경제를 짓누르는 물가폭등의 최대요인으로 되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국)의 전체수입물가 상승률 1.7%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상승요인은 국제유가상승이다. (연합뉴스 2007년 11월 14일)
남(한국)의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의 합병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대운하를 파는 헛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남북(북남) 공동원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북남)을 포괄하는 한(조선)반도 전체 범위에서 일어날 21세기 경제부흥의 여명은 이미 숙천유전에서 밝았다. 북측의 본격적인 유전개발은 한(조선)반도 정세를 바꾸는 대사변이 될 것이다.
북(조선)이 동아시아 최대의 원유저장지를 오래 전에 발견하고, 1998년 5월부터 숙천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해오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까닭은, 그 석유자원이 통일된 나라의 자립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참으로 소중한 전략자원이기 때문이다.
북측에서 개발될 동아시아 최대 유전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한(조선)민족이 21세기 통일경제발전을 위해 저장해둔 소중한 미래자원이다. 머지 않아 이 땅에 통일정부가 세워지면,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석유부국이 될 것이다.
참고로 살펴보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6개 산유국은 석유를 수출하여 매주 50억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자그마치 6천880억 달러나 된다. (연합뉴스 2007년 11월 29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영구히 중지된 이후 장차 제3차 최고위급회담이 열리는 날, 원유를 공동개발하여 나라의 통일경제를 일으키자고 남북(북남) 수뇌가 합의할 때, 그때 비로소 석유부국을 향한 한(조선)민족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